-

-
산 사람은 살지 - 교유서가 소설
김종광 지음 / 교유서가 / 2021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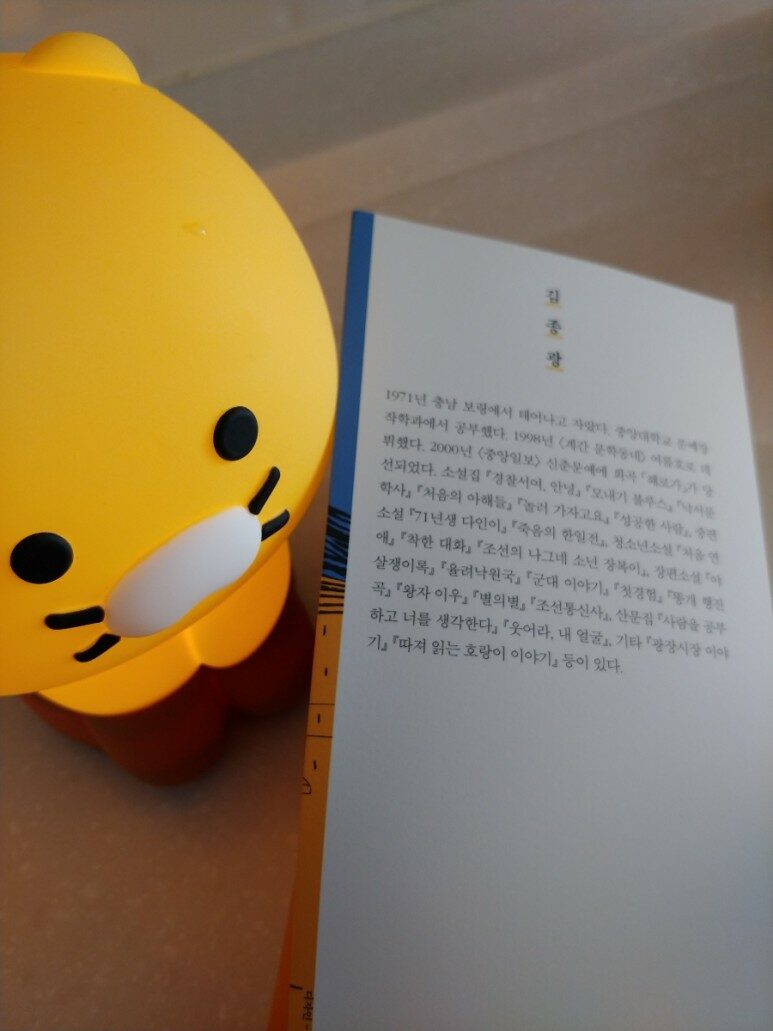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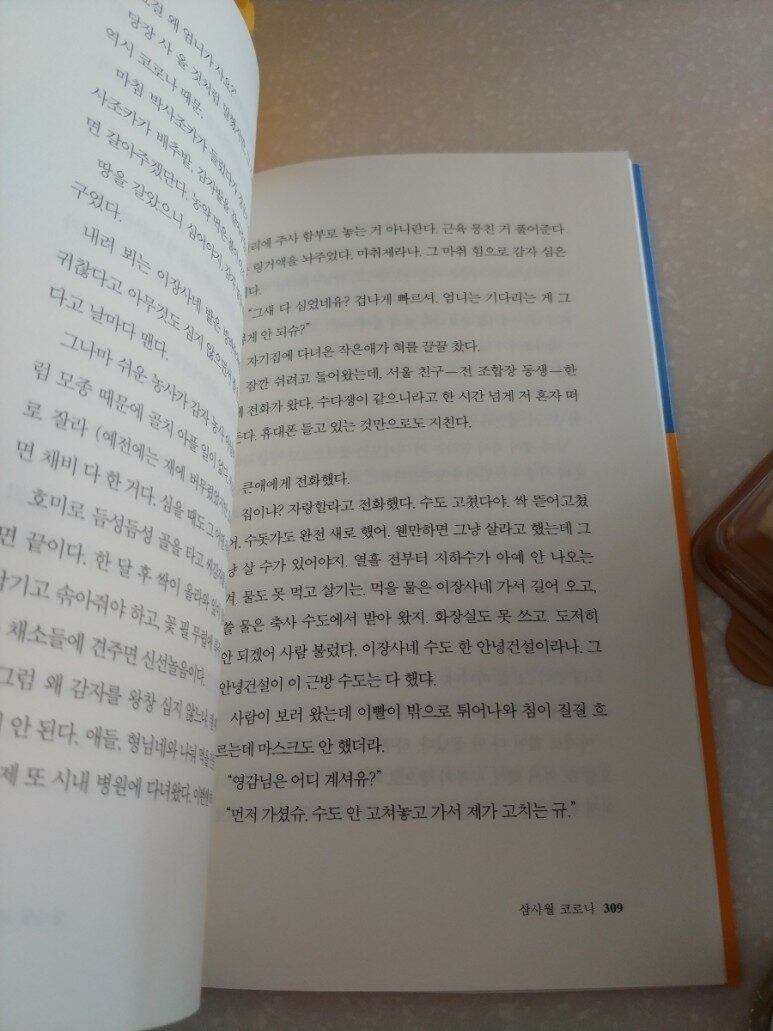
김종광의 소설집 『산 사람은 살지』의 주인공 기분이 쓰는 일기대로 쓰자면 어제는 이러했다.
2022.1.31
조남주의 소설집 『서영동 이야기』를 읽고 리뷰를 썼다. 냉장고에 있던 오징어와 쥐포를 꺼내서 구워 먹었다. 입이 텁텁해 양치를 하고 있는데 거대 춘식이 인형을 들고 벗이 찾아왔다.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창피했단다. 자꾸 쳐다봐서. 택시를 탔단다. 요금은 만 원 조금 넘게 나왔다고. 차마 인형을 들고 버스를 탈 수는 없었단다. 잘했다고 말해줬다. 커피 한 잔 먹고 쇼핑몰에 갔다. 코로나가 심해져 안 가려고 했는데 잠깐만 갔다 오자 했다. 설이라고 벗이 20만 원을 줬다. 그 돈으로 염치없이 옷을 샀다. 이제 돈도 벌고 하니까 살 거 사면서 살라고 하네. 걸어서 식당에 갔다. 길을 잘못 골라 도로변 갓길을 걸었다. 차가 무서우니 한 줄로 걷자고 했다. 불고기 3인분과 후식 냉면, 음료수 두 병을 시켜서 먹었다. 빵과 아이스크림을 샀다. 돈 버는 건 어려운데 쓰는 건 쉽다. 쇼핑몰에서 그 많은 옷을 보는데 엄마 생각이 났다. 비싼 옷 사 놓고 입지도 않고 떠난 엄마. 어디에 도착해 있을까.
학교 다닐 때 김종광의 단편으로 수업했다. 내가 선정해서 복사를 해 갔나 교수가 추천해서 공부를 했나. 기억이 가물거린다. 읽기에 수월하고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능청스러운 충청도 사투리가 소설 곳곳에 있어서 킥킥거리면서 읽었다. 서점 굿즈 받으려고 금액 맞추려고 신간 목록을 훑던 도중 『산 사람은 살지』라는 제목으로 김종광의 신간이 나온 걸 발견했다. 순전히 제목 때문에 샀다. 이 정도의 제목을 쓴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무엇이?
누가 읽어도 쉽고 납득이 되는 언어로 책의 제목을 짓는다는 건 내공이 쌓였다는 뜻이다. 일부러 있어 보이는 척 어색한 제목의 책들. 이제는 제목만 봐도 안다. 몇 십 년 책 읽다 보면 사이즈가 나온다. 이 인간이 어떤 상태로 글을 쓰고 있나. 김종광의 소설을 오랜만에 읽었다. 읽기를 잘했다. 역시 제목을 보는 내 안목은 틀리지 않지. 『산 사람은 살지』는 그런 책이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뿌듯함을 안겨주는 책. 세상이 바이러스로 뒤덮이든 말든 산 사람은 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대단하고 멋지다고 말해준다.
스물두 살에 광산에서 일하는 남자에게 시집온 기분이 쓴 일기와 뒤섞여 소설은 흘러간다. 몸이 시원찮아서 병원 다니고 그 와중에도 자식 키우고 농사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기분이었다. 젊은 날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흘러갔다. 처녀 때 쓴 일기는 있었는데 남편이 볼까 봐 불태웠다. 글자라는 걸 쓰고 싶어도 쓸 새가 없었다. 딸애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좀 썼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 신세타령의 글이라서 아궁이 속에 던져 버렸다.
2010년에 실컷 쓰기 시작했다. 기분의 일기는 남편이 아파서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쓰인다. 자식들이 용돈 준 이야기, 병원 다니고 절에 가서 치성 드리는 이야기, 집이 오래돼 공사하면서 겪은 이야기, 친척과 조카들이 찾아온 이야기. 온갖 썰들이 『산 사람은 살지』에 펼쳐진다. 남편한테 생활비 타면서 겪은 서러움, 옷 한 번 마음대로 사서 입어보지 못한 슬픔, 하루에 얼마 썼는데 너무 많이 썼다는 후회. 죽은 자들이 꿈에 나와 기분에게 털어놓는 살아생전의 아픔.
김종광은 기분의 시간을 농사철로 나누어 농촌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농촌 소설의 대가답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이는 농촌의 시간을 알지 못한다. 농사짓는 이의 품과 고됨을 모른 채 마트에서 집어 든 채소를 보면서 비싸네 어쩌네 이러고 있다. 딱밤 맞기 좋게 말이다. 『산 사람은 살지』를 읽으면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못하겠다. 고추 농사짓는데 기분의 다리와 허리가 아작이 난다. 일하고 있는 자식들이 시간 내서 와주지 않으면 시도도 못한다. 남편은 광산에 다니면서도 농사일을 했다. 노인회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
항암 치료받던 남편을 두고 경로당 청소를 하러 간 기분이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죽어버렸다. 임종도 지키지 못한 기분은 내내 마음이 아팠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픈 사람들 두고 청소하러 갔을까. 기분은 그런 마음도 일기에 쓴다. 젊은 시절에는 몸 아파 가족에게 폐만 끼치는 자신이 미워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 그때 죽지 않아서 기분은 자식이 구해다 준 줄로 마스크를 겨우 쓰고 병원에 다니고 목욕도 다닌다. 기분의 일기에는 오늘 얼마를 썼고 자식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소상하게 적혀 있다.
그걸 읽으면 참. 가슴이 뻐근하다. 비 오는 날 돈 아낀다고 버스도 안 타고 집까지 걸어온 누군가가 떠오른다. 자기 죽으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알뜰하게 돈을 모아둔 남편. 농협을 믿지 못해 창고에 돈뭉치를 숨겨둔 남편. 기분은 아파도 살아 있으니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한다. 예전에는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책 내는 그런 꿈을 꿨다. 염세적으로 변한 게 아닌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었다. 남한테 악한 소리 안 하고 안 듣고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사는 게 만고 땡.
산 사람은 사는 데 어떻게 살지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게 『산 사람은 살지』의 주제다. 종결어미를 주제의식으로 쓰려다가 참는다. 주제나 주제의식이나 똑같은 말인데. 남의 잘난 척은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꼭 있어 보이고 싶은 척에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한다. 이 또한 『산 사람은 살지』를 읽고 고쳐야겠다고 다짐한 바다. 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시끄러웠다. 그 와중에도 책을 읽어보겠다고 『산 사람은 살지』를 집어 들었다. 웬걸. 어지럽던 마음이 기분의 일기와 하루를 보면서 사라졌다.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