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노사이드와 세계 최강국의 핵심 권력자들이 자행하는 악. 소설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이 둘은 ‘짐승의 길’이다. 그리고 아마도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용병 조너선 예거와 10만 명의 어린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온 열의를 다하는 고가 겐토와 정훈의 길은 인간의 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스’로 대표되는 초인류의 길도 펼쳐진다.
소설에서 제노사이드는 아프리카에서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여론의 관심 밖’인 종족 말살 사건들, 미행정부에 의한 초인류 말살 작전, 그에 응전하는 초인류의 인류에 대한 말살 가능성 암시. 이 모두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고 얘기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 중에서 선진국의 자원 갈취와 얽힌 아프리카에서의 제노사이드 뿐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에서 이와 더불어 현실과 연결고리를 갖은 채 비판하는 또 다른 것은 (아들 부시 행정부를 대놓고 카피한)미국 정부가 자행한 짓들인데, 하지만 이 분노는 때가 너무 늦었다. 아프리카에서의 제노사이드는 진행형인 반면, 이미 물러난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지금으로서는 울림이 크지 않다.
소설이 담고 있는 것이 참 많다. 하지만 또 아주 많은 것이 없다.
제노사이드는 제네시스(창세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주제였지만, 그 주제에 울림을 부여할 철학은 빈곤했다. 짐승, 인간, 초인류의 길에서 초인류가 짐승인 인간을 제어한다는 생각은 평범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하다. 신을 처음으로 창조한 인간(아마도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겠지)도, 스스로 절대권력을 행사한 제왕과 독재자들도 처음엔 모두 그 논리였을 것. 뭐든 더 강한 것, 더 올바른 것이 존재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살피거나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제노사이드라는 큰 주제와 걸맞지 않는 저자의 이런 안이한 대처(철학)는 등장인물들의 입체성을 현격히 떨어뜨렸고, 스토리의 결말을 쪼그라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누스’는 왜 하필 폐포 상피세포 경화증이라는 불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기프트(컴퓨터 프로그램)를 주었을까? 고가 겐토를 도와주는 일본과 미국의 조력자는 누구인가? ‘누스’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 또는 누구인가? 어떤 결말을 보여줄까? 등등의 수수께끼를 마주치게 된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너무 쉽게 풀린다. 작가 스스로가 독자가 알아채지 못할까 봐 안달이 난 사람처럼 너무 눈에 띄게 쉽게 정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복선이란 것이 알듯 모를 듯 표현되어야 제맛인데, 김샜다.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는 평범해서 지루했다. 그나마 기름도 다 떨어져가는 민간 제트기가 어떻게 F-22 Raptor를 따돌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흥미로웠다.
세 번째는, 새로움이 적다. 소설에서 다루는 정보 중 눈에 띄는 것들은 인류의 진화방향(또는 종말 시나리오), 신약 개발 과정, 미국의 정보기관 관련 정보, 미국의 각종 신무기 정보 등이다. 나는 무기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와. 내가 이렇게 무기에 대해 많이 아는지 몰랐다.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무기를 다 알고 그 성능까지도 꽤 알고 있었다는 점. 즉 소설에서 다루는 무기 정보가 전혀 새롭지 않았다. 국제관계 뉴스는 꽤나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알게 모르게 그때 습득했던 듯 하다. 마찬가지로 정보기관 관련 정보도, 종말 시나리오도 전혀 새롭지 않다. 신약 개발 과정만이 흥미로웠지만 ‘기프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신약 개발 과정은 거의 생략된 채였다. 전에 내가 일본 SF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무엇 하나 새롭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놀랄 지경.
아프리카 소년병이 지옥(제노사이드의 한 가운데)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총격 장면. 앞날이 뻔한 제약 연구원과 역시 앞날이 뻔한 용병과 미국의 수재 연구원과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과 아프리카에서 제노사이드된 사람들과 강대국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 준 것. 이 두 가지는 매우 무겁고, 의미 깊다.
그렇지만 독자를 지독한 갈등에 빠뜨릴만한 팽팽한 철학적 대립, 흥미를 배가시키고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미스터리와 서스펜스, SF라면 으레 기대하는 최첨단의 새로운 지식(또는 진기함). 이런 것들, 많이 아쉽다.

이성복의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은 외국시의 일부를 시제처럼 올려놓고, 그에 대한 시인의 자유로운 감상(?)을 시로 읊은 시집이었다. 올려놓은 외국시와는 거의 상관없는 듯, 그러면서도 그 핵심은 뭔가 깊이 관여된 듯.. 모호하면서도 아름다웠던 이성복의 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이광호의 『사랑의 미래』는 한국시의 일부를 좌측 페이지에 실어 놓고, 우측에 소설 같기도 에세이 같기도 한 사랑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었다. 비평가여서 그런지 날카롭고 과장된 낱말들이 줄을 이었던 게 생각난다.
권혁웅은 한쪽에 한 편의 한국시 전체를, 그리고 그 시에 대한 해설 & 감상을 직접 시로 적어 나가고 있었다. 언뜻 읽으면 무슨 얘기인 줄 몰랐던 시를 그의 설명 시(詩)를 읽으니 확연히 알겠다. 『몬스터 멜랑콜리아』에서도 느꼈지만 설명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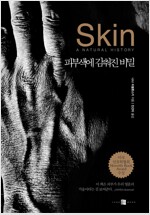
인간의 피부는 세 가지 면에서 독특하다고 한다. 털이 없고 땀을 흘린다는 점, 검정색에서 흰색까지 자연적으로 매우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장식에도 사용된다는 점. 그 중 특히 털과 땀의 이야기는 놀랍다. 뜨거운 외부 환경, 커지는 뇌 크기(뇌가 커짐에 따라 에너지도 더 많이 소요)에 적응하기 위해 체온 조절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던 인간이 선택한 진화의 역사가 매우 흥미진진하다. 털을 없애고 땀(걸쭉하고 진득한 땀이 아닌 거의 물에 가까운, 에크린 땀샘으로부터 생성된)을 많이 흘리게 된 사연(?)을 알게 되니 정말 진화생물학자들은 영화나 드라마 없이도 살겠구나 싶다. 이렇게 드라마틱하니… 자외선과 멜라닌과 비타민 D 합성의 관계도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

하나의 문장. 그 문장을 문 열듯 힘껏 젖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나, 세상에는 그 자리에 못이 박혀 꼼짝도 안 하는 문장, 독자의 눈을 붙들고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 손을 굳어 버리게 만드는 문장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산양들의 왕과 산양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대결은 깊었고 아득했다.
소설로부터 기대하는 건 통찰력, 아득함, 새로움. 이 셋이 가장 크다 여긴다. 『나비의 무게』. 에리 데 루카의 이 소설은, ‘허공 위에 남겨진 바느질자국’이다. 아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