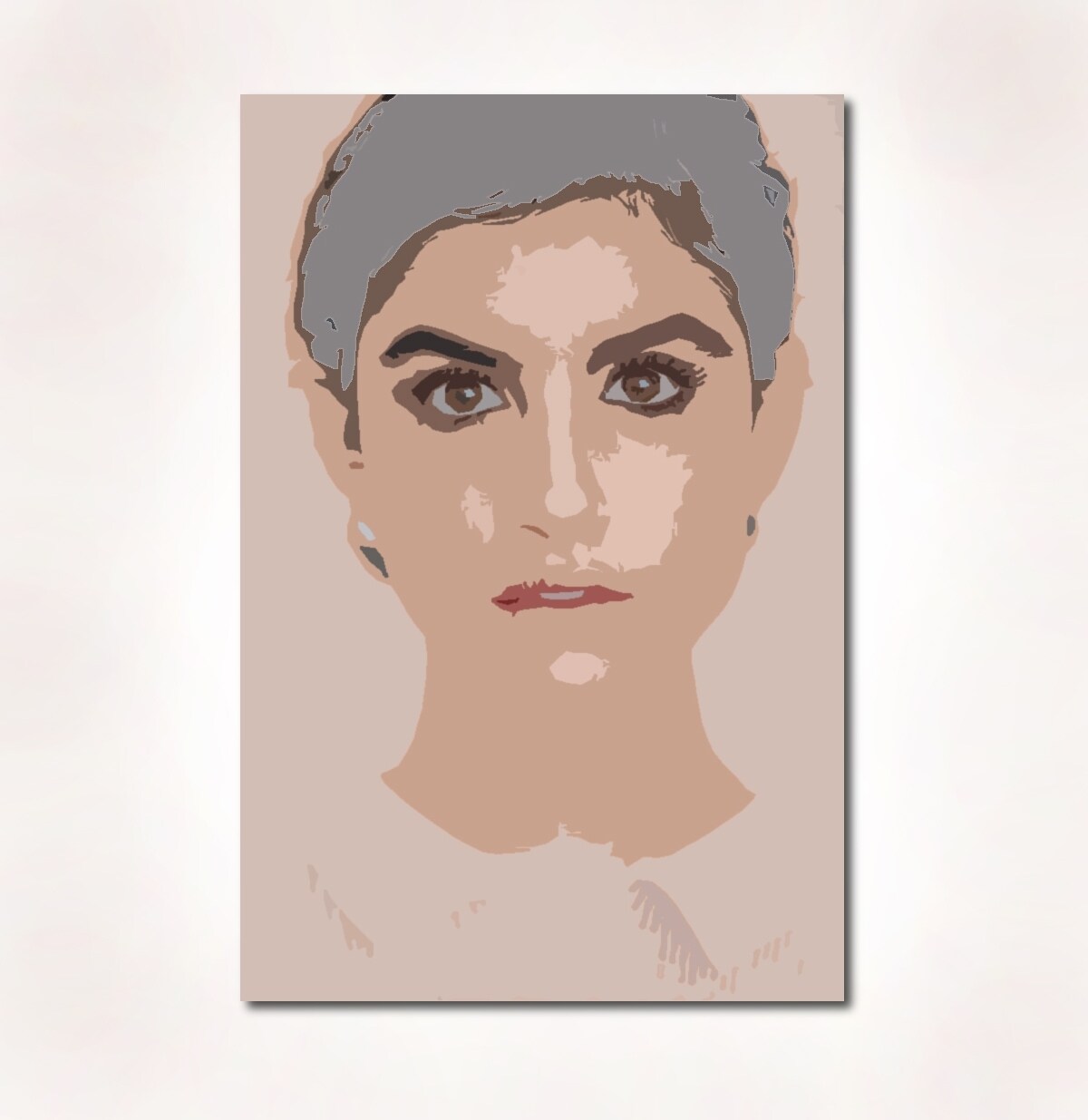
빛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빛의 익숙함이 낯설어서 싫습니다. 사실 빛은 자인해서 빛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빛은 늘 눈을 아프게 하고 시리게 합니다. 낯익은 서늘함의 그늘 속으로 빛을 피해 몸을 움직여보아도 빛은 꼬박꼬박 영역을 넓혀가며 나를 따라옵니다. 등으로 빛줄기 한 가닥이 내릴 때면 종이 끝이 말려 올라가면서 타들어가는 통증을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늘로, 구석으로 슬금슬금 도망을 가 보지만 레이저 같은 빛은 따라와 나를 파괴합니다. 빛에 닿으면, 저 바짝 마르고 반짝이는 빛에 닿는다면 등에서 살아가고 있는 추억이 타버릴 것 같습니다. 집이 타는 것도, 산이 타는 것도 무섭지만 추억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건, 그저 검은 벽을 마주하고 그을음의 냄새를 맡으며 살아간다는 건, 마음의 모든 부분이 저미는 일입니다. 저에게 빛은 잔인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사라진 날 덴마크적인 바다에 나왔습니다. 바다는 한 껏 성난 뿔소처럼 흰 포말을 일 미터 이상 만들어서 포효했습니다. 6월의 끝물이라 그런지 7월의 혹독한 더위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보기와는 달리 몹시 차갑습니다. 바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잔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파제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세상에 만연하지 않은 ‘절대’가 팽팽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게'라든가 ‘절대로 잊지 않을게’ 같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절대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와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 서서 바람을 맞습니다. 바람이라는 물질도 지구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공기라든가 빛과 비슷한 물질이지만 다릅니다. 바람은 그렇습니다. 바람도 때론 잔인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집니다. 얼굴을 약간 들고 손바닥을 펴 바람을 느껴봅니다. 유월에 부는 바람은 심각한 기시감을 몰고 옵니다.
지난 시간으로의 회귀.
기억이 몰고 온 지난날의 풍광.
꿈같은 장면의 반복.
돌아가고픈 미역 냄새가 나던 새벽의 바닷가.
기억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건 분명 기억이 만들어낸 '얄읏한 공' 같은 것입니다. 감시자의 눈 같은, 어딘가 삐뚤어진. 기억은 왜곡되고 비틀어진, 조금 더하거나 보태서 추억 속의 풍경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지난날의 기억 속에서 저는 늘 외롭게 서 있습니다. 한없이 고독합니다. 고독의 끝에서 더 이상 절망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독하고 또 고독합니다. 거기서 빛을 봅니다. 빛이 눈을 찌르고 등에 내려앉습니다.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합니다. 잔인합니다. 희망이 보인다면 그 희망은 절대적이어서 더 잔인합니다. 희망이라는 건 우리는 늘 배신합니다. 희망은 저를 타락으로 이끕니다. 몸을 지배하는 허기처럼 희망은 배신으로 가슴을 새까맣게 태웁니다. 빛이 거기를 또 태웁니다. 바람이 태운 재를 몰고 갑니다. 잔인하고 또 잔인합니다.
희망이 타락으로 이끄는 순간 허기마저 포말이 되어 뜨겁게 타올라 하얗게 무화됩니다. 타락적인 희망을 바람처럼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