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트리밍 이후의 세계 - 콘텐츠 폭식의 시대 어떻게 승자가 될 것인가
데이드 헤이스.돈 흐미엘레프스키 지음, 이정민 옮김 / 알키 / 2023년 12월
평점 :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의 선두 주자인 넷플릭스는 대체 언제 TV라는 “정규” 사업에 뛰어들어 스포츠 생중계나 뉴스를 송출할 것인지 월스트리트와 언론의 오랜 추궁에 시달렸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는 넷플릭스에서 이런 방송을 스트리밍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일단 시청자들은 우리를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 인식합니다. 물론 당신이 말하는 볼거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끝내주게 재미있는 건 아니죠.” - ‘서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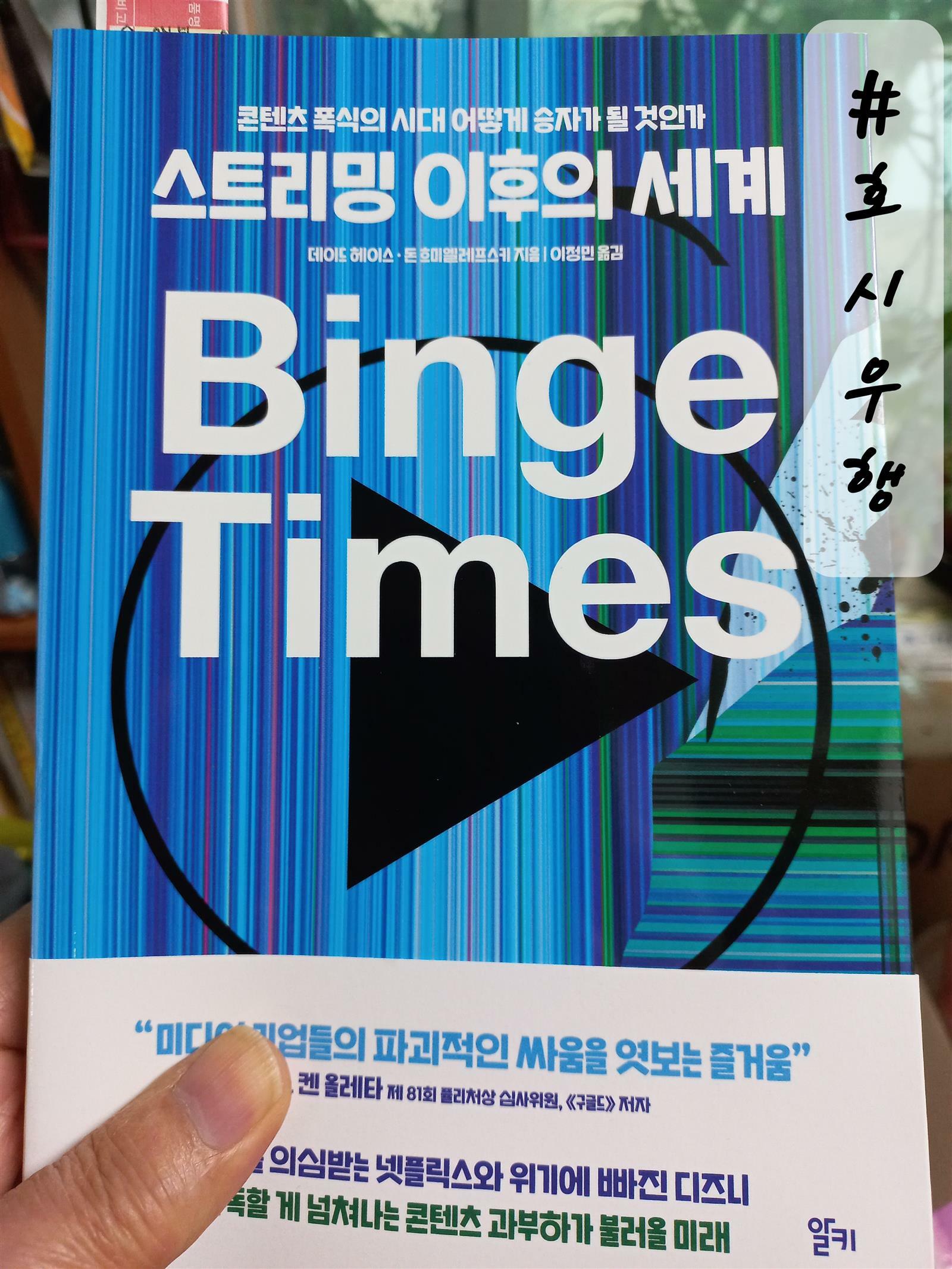
(사진, 책표지)
<엔터테인먼트위클리>의 선임기자를 역임했던 데이드 헤이스, 20여 년간 엔터테인먼트와 빅테크 분야를 취재해 왔던 돈 흐미엘레프스키 이 두 사람이 책의 공저자이다. 책은 새로운 기준이 된 넷플릭스, 전쟁의 서막, 쇼타임, 리더의 반격, 대중과의 만남, 회복을 찾아 등 순으로 총 6부에 걸쳐 앞서가는 넷플릭스와 이를 추격하는 후발업체들 간에 펼쳐지는 미디어 기업들의 끝나지 않는 한바탕의 싸움을 소개한다.
새로운 기준이 된 넷플릭스
핵심 사업을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면서 넷플릭스의 추천방식 역시 진화했다. DVD 때는 고겍 평가에 기반해 추론했다면 스트리밍으로 넘어와서는 고객들이 어떤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찾아 맛보고 또 몰아보기를 하는지 실시간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우편 주문 시스템으로 빛을 못 보던 당시 영입한 인재들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혁신할 기술적 역량을 선사했다. 헤이스팅스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초기 투자자이자 이사회 일원인 리처드 바턴은 2000년 초 헤이스팅스와 저녁 식사 중 넷플릭스의 DVD 대여 모델에 우려를 제기했던 일화를 기억했다.
“저는 ‘DVD라는 형태의 매체는 이제 사라질 게 분명해요. 시간문제란 게 명백해요. 결국 당신 회사도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끝장나고 말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헤이스팅스는 ‘나는 이걸 우편 DVD-플릭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넷플릭스라고 했죠.’라고 말했다. 그렇다. 그는 아주 멀리 볼 줄 알고, 상당히 큰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능력의 소유자였다.
넷플릭스는 이후 1년간 DVD 우편 배송 사업을 본 딴 서비스 구축에 매달렸다. 구독자들이 온라인에서 영화를 주문한 뒤 야간 동안 파일을 다운받아 가정 내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유튜브의 부상으로 소비자들이 당장 영상을 볼 수 있는 스트리밍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보류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넷플릭스가 2017년 1월 출시한 서비스 왓치나우는 엉성하기 그지없었다. 인터넷 성능을 함계가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화질이 좋을 리 없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시청이 가능했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 사업을 중간에 훔쳐갈 수도 있었다.

(사진, 넷플리스의 깃발 130개국에 나부낀다)
AOL 타임워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AOL 의장 겸 CEO를 지낸 조너선 밀러는 여러 인수안을 제안했던 때를 회상했다. 만약 이 중 상당수가 승인되었다면 회사는 물론이고 미디어와 기술 산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튜브가 등장한 2005년 말, 그는 샌프란시스코 포시즌스 호텔 바에서 유튜브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채드 헐리를 만났다. 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이 하키스틱 패턴으로 성장한다는 설명을 듣고서 곧장 적절한 금액대를 약 5억 5,000만 달러(7,150억 원)로 설정하고 행동에 돌입, 2006년 1월 타임워너 이사회에 유튜브 매입을 제안했지만 “꺼지라”는 말만 들었다. 당시 유튜브는 불법 동영상의 온상이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이 매입을 성사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었기에 몇 달 후 다시 한 번 이사회에 제안서를 가져갔다.
“그때는 모두가 유튜브를 고소할 생각뿐이었어요. 나는 고소하지 말고 매입하자. 우리가 거기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하면 승산이 있다고 호소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안 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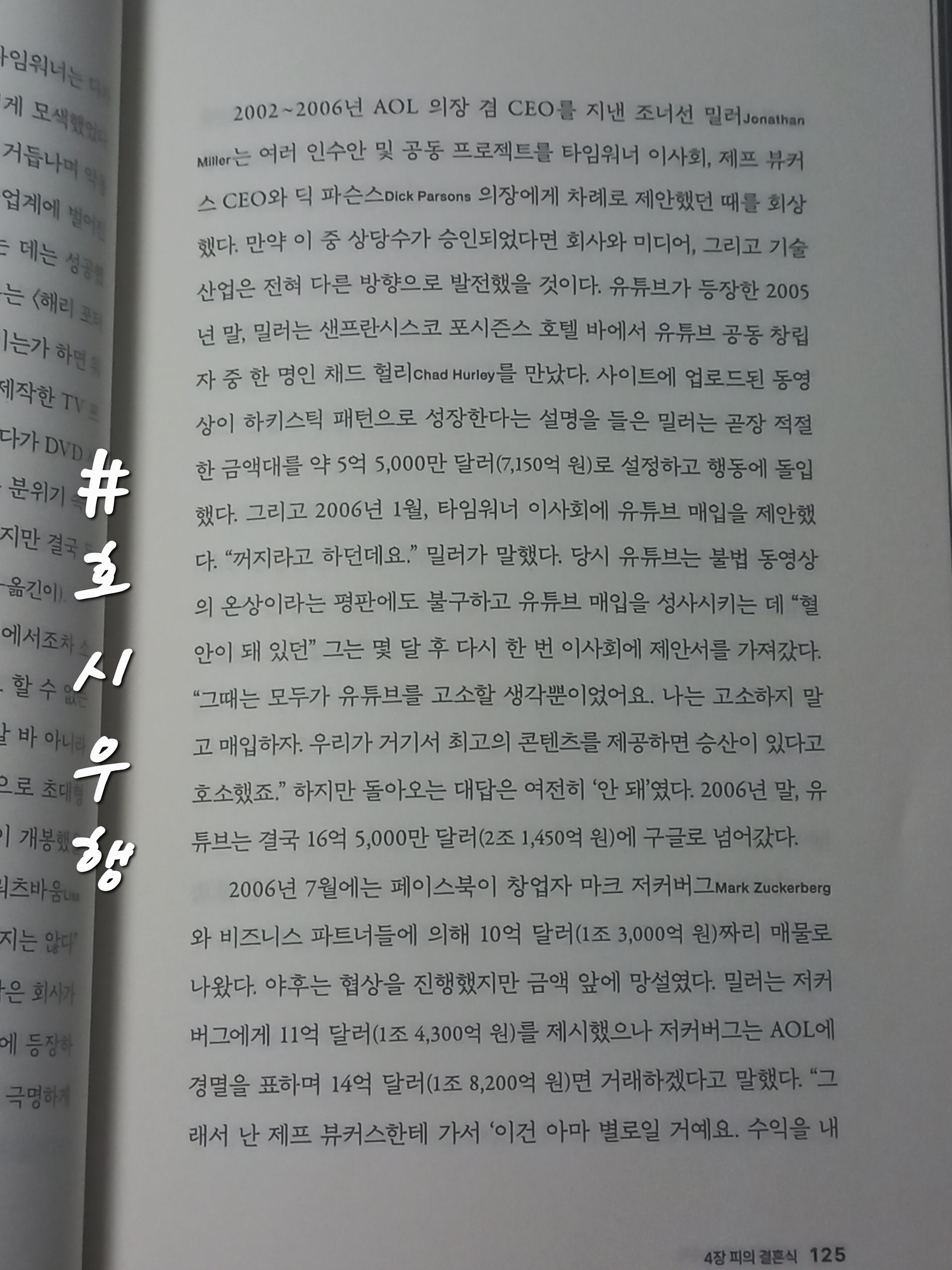
(사진, 유튜브 인수 비화)
월트디즈니컴퍼니
월트디즈니컴퍼니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연대기에 따르면 디즈니가 기술 역량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은 스트리밍이 아직 등장조차 하지 않은 100여 년 전부터였다. 2005년 디즈니 CEO 밥 아이거는 애플과 두 건의 계약 체결을 통해 과감한 혁신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는 ABC TV 프로그램을 구입, 아이팟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선도기업 픽사를 인수하게 된 것이었다.
2005년 5월, 당시 디즈니-ABC텔레비전그룹의 사장 앤 스위니가 월요일 아침 스태프 회의에서 <위기의 주부들> 최종회를 무려 3천만 명이 시청했다는 희소식을 전하려 했다. 이에 앞서 ABC의 기술책임자 빈스 로버츠가 먼저 발언권을 얻어 5층 회의실의 DVD 플레이어에 조용히 디스크를 삽입한 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이 드라마의 출연진 에바 롱고리아, 테리 해처, 펠리시티 허프먼이 나타났다.
“내가 ‘빈스, 저건 최종회잖아요’라고 말하자 그가 이렇게 답했죠. ‘네, 방송이 나가고 15분 만에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었어요.’”
몇 년 후 스위니가 회상했다. “산통 다 깨졌죠…. 시청자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통수 맞았어요. 훨씬 많은 사람이 우리 작품을 봤지만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렇다고 광고주들에게 ‘이봐요, 사실우리에겐 1,000만 명의 시청자가 더 있어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한 입 거리 퀵바이트(퀴비)
드림웍스 전 CEO 제프리 캐천버그의 원대한 이상은 앨런앤드컴퍼니 선밸리 콘퍼런스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다. 이 여름 정기 회의엔 수많은 기술 및 미디어 계약에 관여하는 투자 은행이 주최함에 따라 많은 유력 인사들이 참가해 은밀하게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캐천버그는 스스로 “뉴TV”라고 명명한 휴대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자신의 비전을 내보였다. 요지는 헐리우드 스타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7~10분 분량으로 휴대폰에서 감상하는 것이었다. 품질 기준을 높여 구독료가 아깝지 않는 숏폼 동영상을 고급화하려 했다.
3년여 후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캐천버그는 한창 치열한 경주가 벌어지는 스트리밍 업계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이름은 “빠른quick”과 “한입bites”을 합성한 “퀴비”로서, 애피타이저처럼 금세 먹어치울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했다. 퀴비를 이끌 수장으로 CEO 메그 휘트먼을 직접 영입했다. 캐천버그는 디즈니 스튜디오 의장, 휘트먼은 하버드 MBA 출신으로 디즈니 전략 기획 그룹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할리우드 소식통과 퀴비에 가가운 사람들에 따르면 휘트먼은 죄뇌 중심 분석가인 반면 캐천버그는 우뇌 중심 스토리텔러였기에 플랫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으며, 한 할리우드 변호사는 일부 유명 임원들이 캐천버그의 워커홀릭 성향에 반발해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사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프로페셔널한 업무 관계가 스트레스로 파열을 일으켰다고 폭로했다. 휘트먼은 캐천버그가 자신을 무시하는데다 CEO는 커녕 부하 직원처럼 대하는 독재자라고 묘사했다. 기사에는 심지어 그녀가 그만두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적혀 있었다. 문화 충돌은 퀴비 초기부터 명백했다. 한 임원은 할리우드 문화에 익숙한 캐천버그가 사무실과 비서 등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가식 없고 소박한 실리콘밸리 감성의 휘트먼에게 반감을 일으켰다고 회상했다. 아무튼 ‘퀴비’가 미디어 산업에서 넷플릭스 콘텐츠의 대항마가 되기엔 아직 여러모로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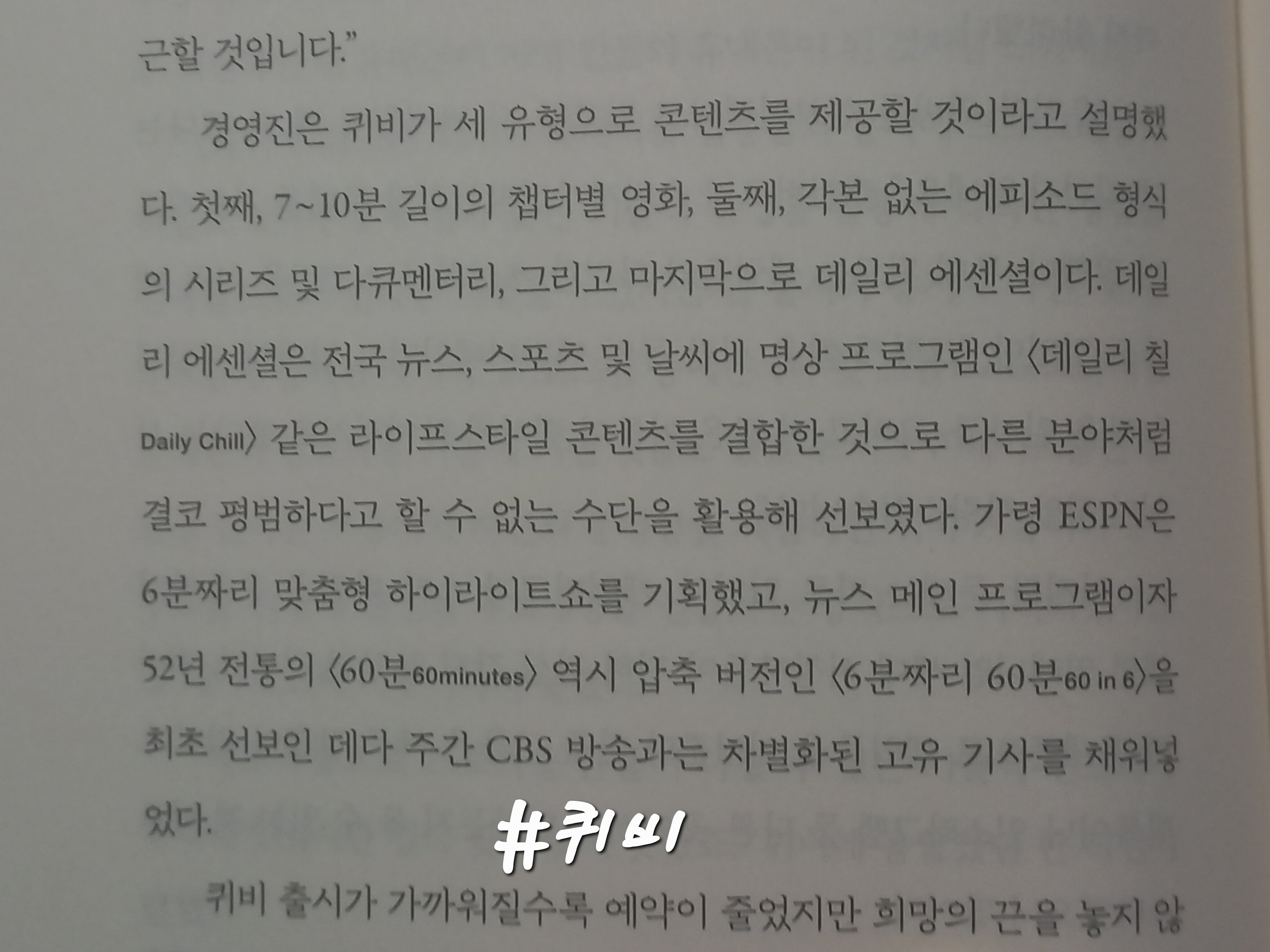
(사진, 퀴비)
애플TV플러스
애플의 제품 프레젠테이션은 브로드웨이 연극의 구조와 달리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흘러간다. 오프닝은 언제나 애플 제품과 이 제품들의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를 환기하는 따듯한 감성의 짧은 동영상이 장식한다.
애플TV플러스의 콘텐츠는 과연 충분할까? 서비스가 제공하는 작품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일각에선 과연 구독자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햇다. ㅁ몇 편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함께 공개되긴 하겠지만 맛있는 걸 먹으며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이들은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지 않았을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애플의 막대한 내부자금 보유를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배우 커뮤니티에는 애플이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관여하며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대본 지적도 남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나친 간섭이 일부 출연자들을 내모는 한이 있어도 세련되고 고도로 선별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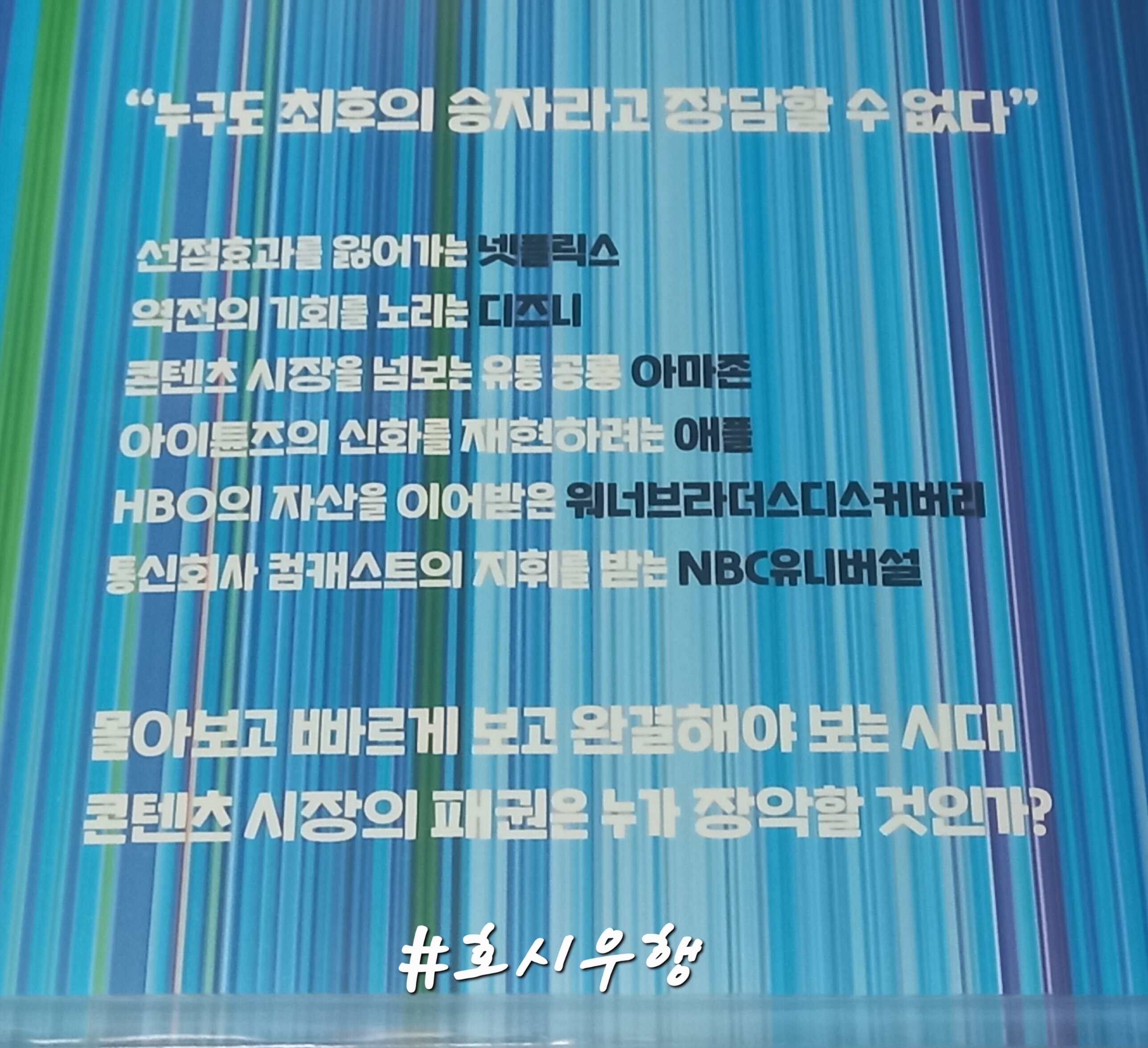
(사진, 뒷표지)
넷플릭스의 적수는 누구일까?
적어도 미국에서 넷플릭스에 적수가 될 만한 기업은 디즈니뿐이었다. 디즈니플러스는 출시 2년 만에 50개가 넘는 국가로 서비스를 확장, 가입자를 1억 2천만 명 이상 확보했다. 이에 애널리스트는 2024년에 넷플릭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사용자당 평균 수익은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말이다. <오징어 게임>, <브리저튼>처럼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킬만한 프로그램들이 디즈니에서 탄생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스트리밍 #방송 #미디어산업 #경제경영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