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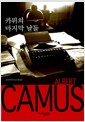
-
카뮈의 마지막 날들
조제 렌지니 지음, 문소영 옮김 / 뮤진트리 / 2010년 4월
평점 :



[리뷰]카뮈의 마지막 날들
[카뮈의 마지막 날들]은 카뮈 사후 50주기를 맞아 카뮈가 죽기 전 이틀 동안의 여정을 재구성한 소설이다. 저자는 카뮈의 작품과 가족, 친구, 동료들의 증언과 방대한 양의 자료 등을 토대로 인간 카뮈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은 카뮈의 죽음의 여정을 그리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와 계급을 위한 문학, 모두를 위한 문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알제리의 가난하고 초라한 프랑스인의 화려하지만 고독한, 그리고 당당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그리하여 완벽한 여정을 보여준다.
어머니, 혹은 알제리와 프랑스
카뮈는 1960년 1월3일 루르마랭의 자택을 나와 파리로 향한다. 알제리 독립운동에 따른 알제리-프랑스 사이의 폭력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 속에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한 카뮈는 대중의 몰이해와 파리 부르주아 지식층의 시기와 질투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폭력과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상주의에 대한 거부를 자기 철학으로 삼은 카뮈에게는 고통의 시기였다.
알제리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알제의 좁고 낡은 아파트에 홀로 기거하고 있다. 귀머거리에 말도 잘 못하는 카뮈의 어머니가 그녀의 어머니에 맞서 ‘카뮈는 학교에 가야해요’라고 외치던 장면은 가슴 뭉클하다.
그녀는 자식이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로 성공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구태여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단지 상을 탔다는 것에 감동했을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기자들을 부담스러워했을 뿐이다. 프랑스로 건너와 성공한 아들 곁에서 노년을 보낼 것을 끝내 마다했던 어머니였다. 알제리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폭력의 종식을 위한 카뮈의 노력은 대중의 몰이해와 파리 지식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다.
카뮈에게 알제리와 프랑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다. 그는 알제리 독립을 지지했어야 했음에도 침묵을 택한다. 혹자는 그의 침묵이 알제리에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안전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보다는 귀머거리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그 침묵,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한 자들이 위협적인 현실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침묵이 아니었을까?
그는 프랑스인이지만 그를 키워낸 곳은 알제리였다. 그는 프랑스의 식민정책과 탄압에 대해서도 거부했으며 알제리 독립 후 이집트주도의 신 아랍제국주의와 구소련의 반서방주의 사이에 놓이게 될 불안한 알제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내면서 알제리와 프랑스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백기완 선생처럼 ‘제국주의자의 오만방자함‘이라 할 수도 있으나, 정의와 자유의 이념으로 희생되는 수많은 약자들이 언제나 그의 관심사였던 것은 이 소설 속의 어머니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소설의 핵심 키워드는 어머니, 알제리, 프랑스 이 세 개의 단어로 압축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당시의 카뮈를 감싸고 있었던 단어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를 대하는 파리 지식층의 “왕따”에 상처받은 한 남자의 연약한 그림자가 있다. 최고학력자를 위한 철학을 한다는 사르트르를 비롯한 대부분의 파리 부르주아 지식층은 카뮈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았다. 그가 알제리의 가난한 가정부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하여 자신들 세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카뮈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었다. 자신의 존재자체가 가난이었고 그로부터 삶을 배웠으므로.
노벨상 수상 이후 더욱 거세진 비난에 카뮈는 흔들리고 있었다. 작가로서 다시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스스로 해가면서 그는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그가 한 번도 본적이 없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최초의 인간”을 붙들고 있었다. 바깥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는 알제리와 어머니에게 달려간다. 가난했지만 생으로 충만했던 그 기억들 속으로.
이렇듯 그를 둘러싼 묵직한 안개 속을 뚫고 그의 자동차는 파리를 향한다. 속도에 대한 기피,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만큼 부조리한 것은 없다고 평소 말했던 카뮈는 결국 그 스스로 부조리를 입증하고 만다.
권력과 정치, 위선과 타협에 대한 철저한 거부와 저항, 신과 이성 그리고 이상적 사회에 대한 불신은 그를 진정한 자유인이자 현실주의자로 자리 매김한다. 항상 고독했던 남자, 그러나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과 언제나 연대했던 남자, 카뮈가 1960년 1월4일 플라타너스 그늘아래 미완의 “최초의 인간”과 그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를 남기고 사라져가는 이야기. [카뮈의 마지막 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