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장소에 머물다 간다. 집과 일터는 물론이고 여행지, 혹은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소들, 거리, 카페, 친구 들과 어울리는 어떤 곳, 우연히 발길을 들여놓은 낯선 동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다양하고 많은 장소를 경험한다.
어찌 보면 이들 장소에 대한 기억이 곧 자기 삶의 역사이기도 하다. 반대로 장소들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이 벌어진 기억들로 채워진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거쳐 온 장소들을 지표로 기록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것은 내밀한 일기일 수도 있고 한 시대의 기록일 수도 있다. 여기 프랑스 파리의 장소들을 지표로 자신의 삶과 시대를 기록한 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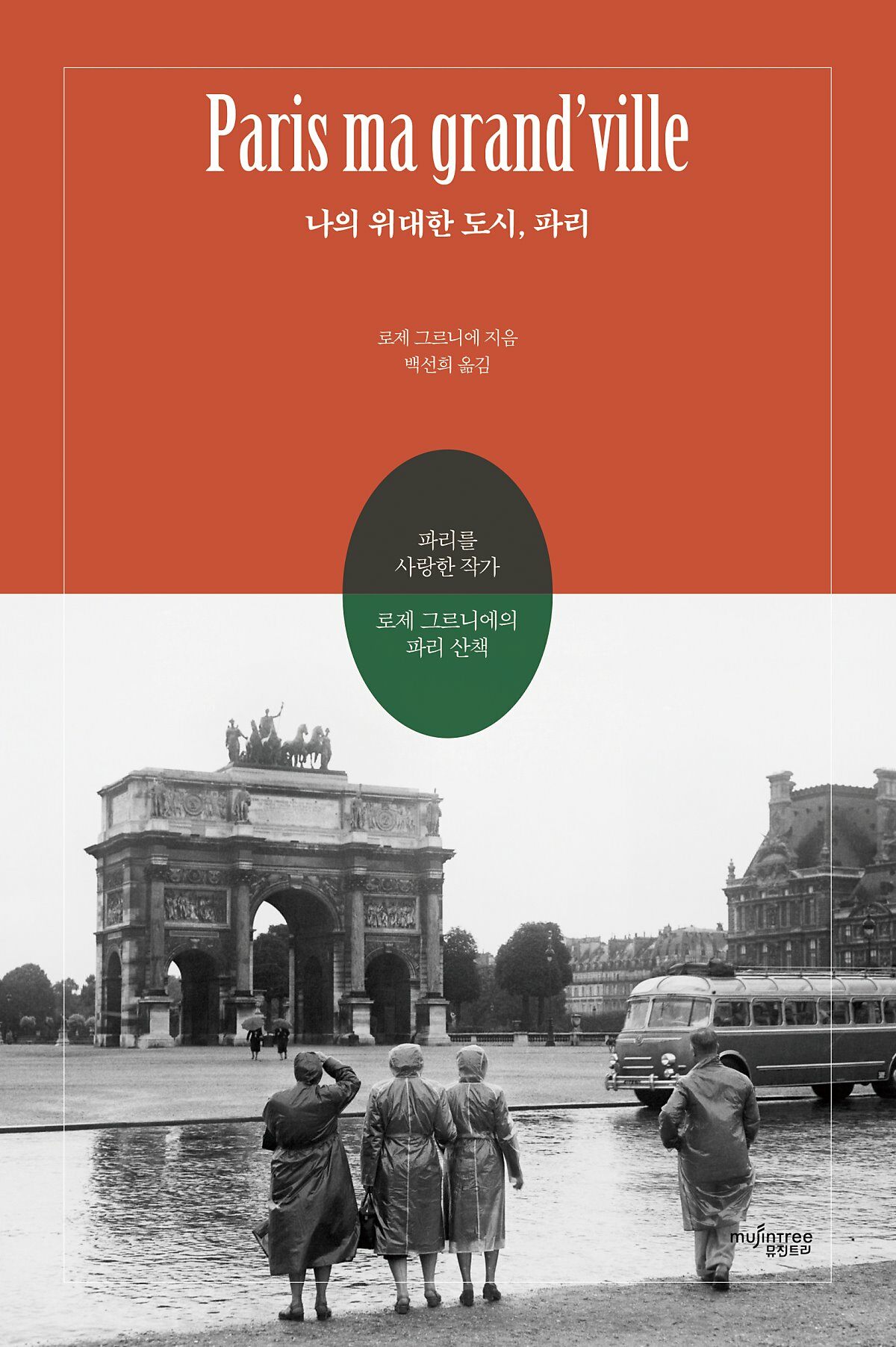
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1919년에 태어나 98년을 살고 2017년 11월 세상을 떠난 로제 그르니에, 기자이자 작가로서 생전에는 '걸어 다니는 현대 프랑스 문학의 역사'라 불릴 만큼 시대의 기록자로 충실했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삶을 파리라는 '위대한 도시'를 중심에 놓고 회고한다. 어린 시절 이후 그가 평생 거쳐갔던 파리의 장소들에 대한 기억은 곧 그의 역사이자 파리의 역사가 된다. 파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파리를 사랑하고 파리에서 생을 마친 한 파리지엥의 삶.
작가 로제 그르니에는 자신과 연관된 100여 곳이 넘는 파리의 거리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회상함으로써, 20세기라는 격변기에 기자로 작가로 편집자로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파리에서 보낸 첫 밤에 대한 기억은 물론이고 파리 해방 전투에 직접 참여하면서 당시 파리 시내를 묘사한 풍경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막연한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존의 현장으로서의 한 도시와 사람들을 보여준다. 도심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에 대한 묘사가 이토록 슬프고, 비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예는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왼쪽 끝) 알베르 카뮈, 오른쪽 끝)로제 그르니에
50여 년 동안 기자이자 편집자, 작가로 일하며 만났던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아련하지만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알베르 카뮈의 죽음을 전하는 순간의 기록은 오랫동안 가슴에 담길 만하다.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작업실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다. 나는 문 가까이에 있는 선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카뮈는 자주 페이지 레이아웃을 검열하고, 마지막 교정쇄를 수정했다. 누군가 결국 내게 말했다.
“카뮈에 대해 기사를 쓰게 되면 우리가 그의 친구였다고 말해주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식자공들과 교정자들이 “책 친구들이 알베르 카뮈에게”라는 제목으로 공동 저작을 펴냈다. 그들은 내게 그 책의 서문을 청하면서 함께할 영광을 누리게 해주었다.
1931년 파리에서 열린 식민지 전시회를 기억하고, 소르본에서 들은 가스통 바슐라르의 강의를 기억하고, 파리 해방 즈음 플레옐에서 본 루이 암스트롱의 반짝이던 트럼펫을 기억하고, 물랭 루주 테라스에 세워진 보리스 비앙의 아담한 집을 기억한다. 그에게 <콩바>지에 들어오라고 권한 알베르 카뮈의 제안을 기억하고, 카페 플로르에서 본 윌리엄 포크너를 기억하고, 앙드레 지드의 집으로 찾아가 그와의 대담을 녹음하던 중 지드가 “발음을 연습해야겠어”라고 한 말을 기억해낸다.

카페 플로르 1949년
파리, 문학의 도시
아버지가 태어난 마자린 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친구이자 동지였던 클로드 루아의 유해가 뿌려진 퐁데자르 길에서 끝맺기까지, 그는 파리의 수많은 거리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망각을 건드린다. 그가 들려주는 추억과 일화는 각각의 장소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잊힌 사람들을 되살려놓는다.
파리는 문학적 자취로 가득한 도시다.
보들레르, 그가 파리에서 살았던 서른 곳 넘는 거주지들을 돌아보자면 기진맥진해질 것이다. 제라르 드 네르발은 딱하게도 오직 한곳에 사로잡혔다. 비에유랑테른 길, 그곳에서 그는 “검고 흰” 어느 겨울밤에 목을 맸다. 그 길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테아트르 드 라 빌’의 프롬프터용 구멍이 아마도 네르발이 목을 맨 창살창 자리였을 것이다. 보들레르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은밀하게,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어두운 거리에서 자기 영혼을 풀어놓았다….
평생을 글과 책과 더불어 살아왔기에, 그의 기억들의 대부분은 문학과 연관되고, 파리는 문학적 자취가 가득한 도시로 그려진다. 카뮈・네르발・빅토르 위고・보들레르・스탕달・로맹 가리・자크 프레베르・보리스 비앙・샤토브리앙・사르트르・프루스트・지드・포크너・헤밍웨이・카렌 블릭센… 등 문학의 거장들이 대거 소환된다.
역사적 사건과 문학적 자취로 가득한 파리를 자신의 몸에 새긴 작가는 이 책의 출간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학과 삶, 그리고 망각에 대해서 기억해 둘 만한 이야기를 전한다.
나는 잊힐 만하지 않은 작가들이 망각되는 빠른 속도에 놀랐다. 루이 기유는 겨우 망각을 면했지만, 다른 이름들은 젊은 세대에게 아무 감흥을 주지 못한다. 이를테면 마르크 베르나르가 그렇고, 클로드 루아조차 요즘 사람들은 읽지 않는다. 30년 전에 타계한 작가들 가운데 로맹 가리와 알베르 카뮈 같은 몇몇 작가는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성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남은 것은 비극적 운명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이 책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얘기한다. 그들의 문학적 자질과 무관하게 그들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망각은 아주 부당한 것이다.
“파리지엥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알았고 사랑했으나 사라져버린 것을 찾는 데 일평생을 보낼 수 있다.”고 표현한 대로, 사랑했던 파리의 거리를 거닐며, 잊힌 사람들・만남・사건을 회상함으로써 우리의 망각을 다시 열어주는 로제 그르니에의 파리 기행. 새삼 그의 기억을 좇아 파리의 골목골목을 다시 걸어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