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철북 ㅣ 동서문화사 월드북 113
귄터 그라스 지음, 최은희 옮김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10년 5월
평점 :



“어제는 내일 있었던 바의 반복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반드시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
- 『텔크테에서의 만남』 中에서
비실비실 웃음이 나오고, 당혹스러울 만큼의 광기와 악의로 섬뜩하기도 하며, 야릇한 관능의 향기에 도취되기도 하지만, 도주(逃走)와 검은 마녀에 대한 강박적 번뇌를 반복하는 난쟁이 ‘오스카’에 이르면 시대에 대한 죄책감과 무기력, 역사의 망각에 대한 미래의 회의라는 거대한 담론의 서술임에 경외(敬畏)의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
소설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있는 오스카 자신의 기원을 술회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경찰에 쫓겨 ‘네 겹의 치마’를 입고 감자를 캐고 있는 여인의 치마 속으로 기어든 남자에 대한 신화적 이야기는 오스카의 어머니인 ‘아그네스’를 낳고, 네 겹 치마 속에서 과감하게도 방사(房事)를 치룬 할아버지 ‘콜야이체크’의 방화범으로서의 이력과 그의 홀연한 사라짐의 전설, 성장을 멈추기 위해 지하창고 계단으로 구르는 세 살 아기 오스카의 발칙한 거부의 행위는 ‘단치히’ 혹은 ‘그다니스크’로 불리는 무대가 지닌 고된 역사 - 폴란드, 독일, 스웨덴 등 영토의 각축전장 - 의 배경을 알린다.
성장을 멈추고 94센티미터 단신의 아이가 되어 테이블 밑, 치마 밑처럼 어른들의 시선에서 제외 된 곳에 자리하여 어떤 방해와 장애도 없이 자기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갖게 되는 것은 실로 작가의 명민함으로 여겨진다. 아마 사실성과 객관성에 대한 보장조치 아니었을까?
실제로 어른들은 오스카의 이렇게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머니와 그녀의 외사촌인 ‘얀 브론스키’가 식탁 밑에서 벌이는 불륜의 행각처럼. 그래서 오스카가 진술하는 것은 그대로 시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거짓 없는 역사의 증언이 된다.
한편, 탯줄이 잘리기도 전부터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오스카에게 생의 기대를 심어주었던 ‘양철북’을 사주겠다던 어머니의 소망이 실현되던 세 살 생일 이후 혐오스럽기만 한 인간들의 행위에 보내는 보복이 시작된다.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 유리를 깨는 악마적 행위를. 여기에도 작가가 부여한 점진적인 의미의 확장을 읽게 되는데 유리를 깨부수는 개개의 장면들이 방어와 공격이라는 전투적 행태에서 정신 질환적인 분노의 발산이라는 행태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실험하는 다분히 유희적이고도 악의적 행태로, 급기야는 인간성의 약탈이라는 권력의 의미로까지 이어진다. 병원 유리를 박살내고, 시립극장의 유리를, 쇼윈도의 유리를, ‘먼지털이단’을 위한 노략질의 수단으로. 이 모든 행위가 무력하고 부정한 사회에 대한 혐오와 반항의 은유임은 물론이다.
이와 달리 북치는 행위는 유리 깨는 행위와 또 다른 상징으로서 병행한다. 무능하고 비굴하며 무력하면서도 자신들의 집단적 광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성의 세대와 사회에 대한 반항이라는 사회변혁 의지를 더하기도 한다. 따라서 추정(推定)상 자신의 아들인 ‘쿠르트’의 세 번째 생일날 북과 북채를 쥐어주려 하다 얻어터지고 북은 찢어져 내동댕이쳐지는 장면은 전후(戰後) 세대에 대한 믿음의 후퇴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실의는 오스카에게 북을 손에서 놓게 하지만, 쿠르트의 어머니이자 오스카의 의붓어머니이며, 한 때 연인이기도 했던 ‘마리아’로부터 “이 아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잖아요.”라는 내침은 어머니 아그네스의 남편이었던 ‘마체라트’의 죽음과 함께 성장하기로 마음먹은 이후 124센티미터의 꼽추 오스카에게 돈벌이로서의 북으로 다시금 의미를 갖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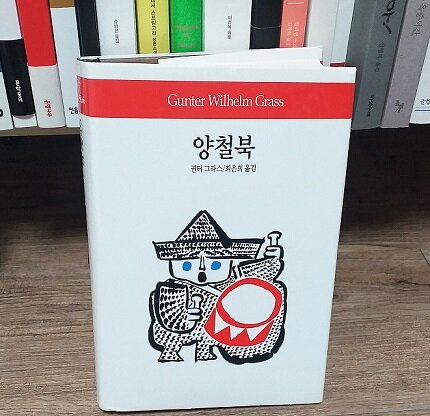
재즈 음악가로서 북을 치는 행위는 전후 독일사회의 자본주의적 흥청거림을 연상케 하는데 오스카는 여기에 또 하나의 우화를 더한다. 술집 ‘양파 켈러’에서 양파를 자르면서 짜내는 지식층의 눈물, 이 기만과 허위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들을 지하의 계단에서 지상으로 끌어내는 음악이 된다. 너희들, 아니 우리들을 돌아봐라. 벌써 잊었는가? 비루하기 그지없는 소시민적 태도가 야기한 불의의 광기와 폭력의 어제를! 이라고.
총 3부로 구성된 이 소설의 대단원이랄 수 있는 3부에 이르면 재즈 음악가로 명예와 황금을 쥔 성인 오스카의 통렬한 죄책감과 삶의 번뇌로 가득 채워진다. 어머니 아그네스, 추정상 아버지인 얀 브론스키, 어머니의 남편이었던 마체라트, 불륜이라는 부도덕성위에 세워진 이들 세 사람의 긴장된 평화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자신이 아닌가라는 죄의식은 자기혐오와 이로부터의 도주라는 행위로 이행된다. 이 도주의 양식 중 하나는 삶의 권태와 고독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놀이로 진행되는데, 자신을 살인자로서 신고하여 고등법원 법정에 피고로 소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서른 번째 생일 날, 이조차 진범이 밝혀지면서 무죄로 석방되기에 이르고, 도주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이 부정하고 청산되어야 할 세계에서 돌아 갈 곳은 어디인가? 아마 그 답변은 이 문장이 아닐까? “나는 지금도 카슈바이의 감자밭에서 피난처를 제공해 줄 우리 할머니 ‘안나 콜야이체크’의 부풀어 오른 네 겹의 치마를 도주 목적지에서 제외 할 수밖에 없다. 하긴 나로서는 막상 도망친다면 할머니의 치마로 숨는 것만이 도주다운 유일한 도주라 할 수 있겠지만.”
무지하고 외곬의 단순함, 게다가 자신들의 부도덕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사회, 이 혐오의 세계임에도 그로서는 유일한 도주처가 네 겹의 치마 밑이라는 것은 번뇌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부정하고 싶은 것, 청산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그것이 자신의 뿌리인 것을.
정체성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었던 곳, 시련의 반복적 역사를 기록한 곳, 자유시(自由市) ‘단치히’를 배경으로 시작하여 ‘뒤셀도르프’로 이어지는 전후(2차 세계대전) 독일의 고된 여정 속에 녹여낸 이 신랄한 꼽추의 시선은 “매우 중요한 여러 첫 인상을 참으로 곰팡내 나는 소시민적 환경에서 모았다”라는 오스카 그의 말처럼, 거대한 역사의 불길이 휘몰아쳤던 한 시대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술하는 문장까지 거창 할 이유가 필요가 없음을 입증한다.
이 소설은 바로 이러한 낮은 위치의 시선이 모여 거창하기만 한 거대 담론의 공허하고 망각적인 이성의 허위를 들춰내는 것이지 않았을까? 어느 외지(外紙)의 평론처럼 '세속적이고, 고약하며, 불경스러운' 서민의 거친 문장이 역사의 민낯, 그 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