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늘, 자주, 매번 이야기하지만,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돌아오면 하나씩 마무리해서 보낼 수 있고, 늘 적절한 업무량과 휴식을 조절할 수 있지만, 한가할 때에는 아주 한가하고, 바쁘면 너무 바쁜것이 내 일상이다. 아마도 이번 10월은 꽤나 바쁘게, 그리고 빨리 지나갈 것이다.
나는 아침잠이 없다. 아침형 인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꼬꼬마때 성당에서 새벽미사 복사를 설 때에도 새벽 4시에 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나, 같은 동네에 살던 녀석들을 하나씩 깨워 성당으로 달려 갔었고, 학교를 다닐 때에도 새벽 6시에는 꼬박꼬박 문제없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주중에 새벽운동을 할 때에는 5시면 일어난다. 아무리 전날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도, 아침 9시가 넘으면 잠자는 시늉도 할 수가 없을만큼 각성이 되어 일어나버리고야 만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이 터오는 새벽, 아니면 아직 어두운 동트기 직전의 새벽에 운동을 가서 시원하게 땀을 흘린 후 쌉쌀한 아침공기를 맡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도 사람인데, 늦잠을 푹 자고 싶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주말이다. 특히 요즘처럼 일이 많고 밤운동을 하는 주간의 토요일 아침에는 좀 늦게까지 이불속에 들어가 있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불가능 그 자체이다. 오늘만해도 그렇다. 모처럼 운동 스케줄에서 토요일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7시 반 정도에 일어나버렸다. 그 사이에 잠을 잔건 아니고,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저 이불속에 들어가 있었을 뿐.
이제 엊그제 내린 가을비와 함께 본격적인 가을날씨가 온 아침은 다소 쌀쌀하게 느껴진다. 해가 뜨면 따뜻해지지만, 분명히 공기의 냄새가 틀리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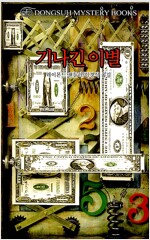
내가 '느와르'라고 알고 있는 쟝르가 사실은 하드보일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했다. 내가 읽은 레이먼드 챈들러의 작품으로는 처음인데, 딱 하드보일드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일인칭으로 전개되는 터프한 탐정 말로의 관점에서 사건을 풀어가는데, 일단 거창한 추리나 빅토리아 시대의 똥기마이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에르큘 포와로의 프랑스어가 섞인 영어도 들리지 않는다. 아니, 한 걸음만 헛발을 디뎌도 누군가 말로를 붙잡아서 꽁꽁 묶어 바닷물에 쳐넣을 것 같은 LA Confidential시대나 그 전의, 미키 코헨의 마피아가 장악하던 시절의 살얼음판길을 걷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말로는 전형적인 아메리카형의 터브가이 탐정이 아닌가 싶다. 결말은 조금 맘에 안 들었지만...
번역은 조금 아쉬웠다. 번역자가 문화적인 의역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Prime Rib을 '질좋은 갈비'로 번역한 것이 애교라면 Photocopy의 번역임이 분명해 보이는 '사진복사'는 무지 그 자체이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번역의 흔적을 느껴 몰입에 상당한 방해가 된 점은 정말 아쉽다. 난 동서미스테리북스가 좋은데.


이 두 작품 사이의 어떤 사건을 하나 빼놓고 읽은 듯한 생각이 든다. 읽는 내내 명탐정 엘러리 퀸을 괴롭히는 최근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무엇인지 궁금했다. 아니면 순서를 바꿔 읽었어야 하는건지도. 연쇄살인을 다룬 '꼬리 아홉 고양이'는 쉽게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좀 억지스럽다는 마지막 반전 때문에 실패. '10일간의 불가사의'도 조금은 아쉬운 반전이 있어 순수하게 추리를 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하나의 필명을 갖고 두 사람이 쓴 작품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왠지 그것이 도드라지더라는 생각을 한다.

이 시리즈에서 등장한 노블이 죽지 않는 유일한 작품이 이번 21번째 작품이다. 험피덤피라는 유럽의 전래동화의 바보/광대 같은 캐릭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 책을 오래 쓰다보면 악하게 설정된 캐릭터 집단에게도 애정을 느낄 수 있겠다는 작가의 말에서 어쩌면 다음 번 작품에서도 노블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 - 비록 작가는 강하게 부정하지만 - 을 했다.
이번에 등장한 노블의 특징은 햇살이 가득한 대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 과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못난이에 능력치가 떨어지는 난쟁이 같은 겉모습 때문에 아무도 그를 노블로 봐주지 않는다.
계속 읽어나가는 시리즈라서 특별히 스토리를 요약할 만한 건 없고, 비슷한 패턴으로 재미있는 활극을 읽었다고 하면 딱 적당하겠다.
토요일 오전, 차 한잔을 마시면서 아침을 맞으련다. 푹 쉬고 다가오는 다음 주부터의 업무폭풍을 맞이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