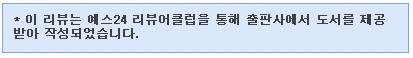-

-
목소리를 보았네
올리버 색스 지음, 김승욱 옮김 / 알마 / 2012년 12월
평점 :



초등학교때 언니를 따라서 수화를 배우러 간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언니가 하는 것은 다 따라하고 싶었던 나이라 언니가 어디를 가든지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거기도 빡빡 우겨서 따라갔던 것 같다. 언니는 수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동안 배우러 다녔었다.
실생활에서는 휠체어 탄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 지금 이곳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는 죽음의 레이스라고 할만큼 위험천만하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휠체어를 움직여 주는 장치를 타고 내려갈 바에는 집밖을 나가지 않는편이 나을 정도다. 어떤 계단은 급경사라서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도 살아가기에는 이땅은 그다지 넉넉지 않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어렸을때 영어를 배우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수화를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태어날때부터 청력을 상실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사고로 인해 청력을 상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수화가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의 수단이기보다는 어릴때부터 놀이처럼 함께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들이 들으면 무지 좋아할 소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수화가 언어로써 아이에게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생후 4개월된 아이가 말은 하지 못해도 수화로 우유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집중력을 길러주어 사고를 깊게 만들고 공간감적인 능력을 크게 향상 시켜준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금방 수화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한다. 그리고 수화의 습득과 더불어 읽기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실력이 크게 향상된다. (158쪽) 수화를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이지만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 버리지만 몸으로 배우는 수화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몸에 익숙한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어디가 불편한 것 그런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클 수 있으면 좋겠다. 재수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그러지 말라는 경우도 없으니까 말이다. 장애란 것이 갑자기 나에게도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복지에 대해서 잘되어 있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좋은지 알았지만 그것도 아닌가 보다. 버스안에서 두분이 빠른 속도로 수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폭풍 수다로 느껴질정도로 두분의 손동작은 빠르게 움직였다.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재미있게 하는지, 나도 그 안에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소리가 끊긴다고 해서 세상과의 단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언어는 활기차다. 감정을 묘사하고 상상력을 발달시킨다. 강렬하고 멋진 감정들을 전달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언어는 없다. (45쪽) 가끔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배로 나올때가 있는데 수화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마음에서 나올것 같은 생각이 든다. 수화로 욕도 하고 거친 말들도 할 수 있지만(귀가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리로 들리는 것과 손으로 말하는 것은 느낌이 다를 것 같다. 그렇다고 손으로 감자나 먹어라거나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면 소리는 없을지라도 기분이 좋을리도 없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책을 통해서 귀가 들리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본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 속에서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꾸는 것을 허락해주면서도 그들을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225쪽) 이 책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확실히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직접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1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