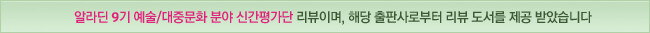[사진 철학의 풍경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사진 철학의 풍경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사진철학의 풍경들
진동선 글.사진 / 문예중앙 / 2011년 7월
평점 :

품절

우리에게 사진이란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사진의 효용은 바로 ‘기억’ 아닐까? 과거의 한 순간들, 그중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의 영원성, 기억의 시각화 아닐까? 바로 쓰나미가 할퀴고 간 자리, 홀로 남겨진 할머니가 앨범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나 역시 어떤 할아버지가 가족 앨범을 찾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려, 나 역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게 있어 사진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사진철학의 풍경들>이란 이 책은 다른 의미, 시각에서 사진의 의미, 존재 가치를 논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매개로 철저하게 ‘철학’적 사유의 장을 열린다. 철학? 여전히 모르겠다. 하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갖고, 그에 대한 해답, 궁극적 삶, 존재 이유를 찾아 고찰하고, 또 들여다보는 그 과정 속, 사진을 통해 충분히 철학적 유희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책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다이안 아버스와 사진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특히, '아름다움에 눈이 멀고, 돋보이는 것들에 탐닉하는 것, 그와 반대로 더럽고 기이하고 추한 것을 외면하는 태도, ...... 극단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258)이란 문장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바로 오늘의 세태에 대한 날카로움처럼 나가왔다. 외모지상주의 같은 극단적, 원초적, 감각적인 자극에만 빠져있는 우리를 반추하게 된다. 또한 "바라본다는 것의 근본 윤리"(255)에 대한 물음이 가히 충격적이었다. 과연 우리는 진실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바라보는 행위, 의식 속에 자극이 아닌 윤리적 시선을 담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고 마주하는 세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각하고, 반성하고 더 나아가 성찰이라는 화두가 나는 잡아끌었다.
사진! 달리 보인다. 내가 인식했던 ‘사진’이란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사진이 기억, 어떤 사건의 진실을 담아내면서도 그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툭툭' 던지고 있었다. 계속되는 질문들은 스스로를 향해, 다시 묻고 또 묻게 된다. 그 시간이 분명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나름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색다른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왠지 이 가을과도 어울리지 않는가!
또한, 철학적 사유의 다양한 소재, 주제가 담겨 있는 이 책은 드문드문 날카롭게 우리를 해부하고 있어, 사진에 담긴 진정성, 그 날카로움과 따뜻함의 의미와 정신에 깜짝 놀라기도 하였다. 단순한 물질 이전에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정신에 대한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사진을 바라보는 마음, 눈빛이 달라질 듯하다. 다만, 책이 담아내고 있는 사유의 깊이와는 달리 마지막 편집이 아쉬움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