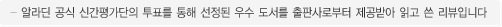[젊은 날의 책읽기]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젊은 날의 책읽기]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젊은 날의 책 읽기 - 그 시절 만난 책 한 권이 내 인생의 시계를 바꿔놓았다
김경민 지음 / 쌤앤파커스 / 2013년 2월
평점 :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책들, 오래 전에 읽었던 책 속의 문장들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책들이 있다. 그런 책들은 어느 곳에선가 만나더라도 그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집어 들고 읽게 되는 책들이 있다.
나에게 그런 책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하면 몇 권의 책을 올려 놓을 수 있을까?
<젊은 날의 책 읽기>는 저자가 평소에 아끼던 책들, 가슴 속에 담아 놓았던 책들에 대한 서평을 모아 놓은 책이다. 그 책을 읽을 당시의 생각들과 줄거리,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상들을 골고루 섞어서 쓴 글들이다.
이렇게 책 속에서 책의 서평을 담아 놓은 책들을 읽게 되면, 내가 읽었던 책들이 소개될 경우에는 내가 그 책을 읽을 당시의 느낌들이 되살아 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느낌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유시민 ㅣ 웅진지식하우스 ㅣ 2009 >, 장정일의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장정일 ㅣ 마티ㅣ 2010>도 이런 부류의 책들인데, 저자들의 식견이 뛰어나고, 독서가로도 잘 알려진 사람들이기에 책을 읽으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이다혜의 <책읽기 좋은 날 / 이다혜 ㅣ 책읽는수요일/ 2012>는 123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읽은 책보다는 읽지 않은 책들이 더 많이 나와서 공감을 느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책을 통해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찾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서평이 담겨 있는 책들은 어떤 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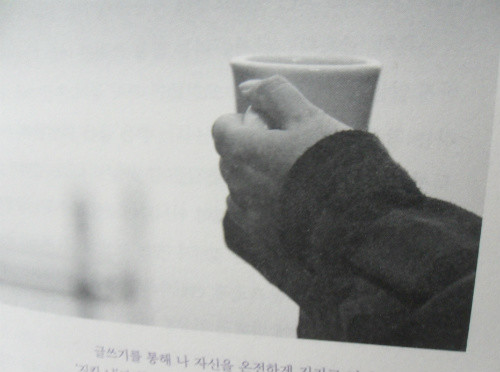
<젊은 날의 책 읽기>에는 저자가 젊은 날에 읽었던, 그에게 어떤 일깨움을 주었던 36권의 책이 담겨 있다. 목차를 보니 중고등학교 때에 읽었던 책들(비주얼이 아닌 스토리)에서 부터 삶에 대한 성찰(스펙이 아닌 통찰)이 필요했던 책들이다.
<호밀밭의 파수꾼>, <제인에어>,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외딴방>, <죽음의 수용소에서>, < 한 말씀만 하소서>,< 나무를 심은 사람>는 중고등학생들의 필독도서 목록에 담겨 있을 듯한 책들이다.
그만큼 책의 내용은 어렵지 않고 그 어떤 부류의 독자들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학창시절의 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다. 국문학과를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그가 가장 열망하는 것이 '글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에게 서른 다섯 살이 기성세대의 기점 같은 것이었듯이, 그녀는 서른 다섯 살이 되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책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살아갈 이유. 즉,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기에 많은 책들에서 인용되는 책이다.

'요네하라 마리'의 책들은 대부분 읽었지만, 미처 못 읽은 책이 소개된다. <대단한 책>이다. '마리'는 일본인으로 일본어와 러시아어 동시 통역사이고, 하루 평균 7권의 책을 읽는 다독가이자 독서가로 잘 알려진 작가인데 유머 감각 역시 뛰어나다. <대단한 책>은 독서일기와 서평이 담겨 있는 책인데, 그녀가 난소암으로 죽기 일주일 전까지 한 주간지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책이라고 한다. <미식견문록>이나 <문화 편력기>,<발명 마니아>를 재미있게 읽었기에, 그 책이 궁금해진다.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았을 것 같은 책으로는 '다니엘 애버렛;의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가 있다.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된 책인데, 아마존의 피다한 마을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던 선교사가 선교를 하지는 못하고 피다한 마을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이야기인데, 문화와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책이다.
'다니엘 글라타우어'의 <새벽 세시, 바람이 부나요?>는 레오가 보낸 이메일이 잘못 보내지게 되어서 레오가 받게 되면서 이메일로 주고 받는 연애이야기인데, 이 책의 속편인 <일곱 번째 파도>라는 책이 있다고 하니, 그 책도 언젠가 한 번 읽어보아야 겠다.
만화가로 잘 알려진 '최규석'의 <지금은 없는 이야기>는 꼭 읽어 보고 싶은 책이다. 그의 만화책인 <울기엔 좀 애매한>을 읽게 된 후에 6월 민주 항쟁을 다룬 < 100℃>를 읽게 되었는데, 만화로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사회문제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이야기>에 관심이 가게 된다.

이렇게 서평이나 독서일기의 형식을 가진 책들은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책들에 대한 생각과 그 책을 읽었던 때에 대한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책 속에서 또다른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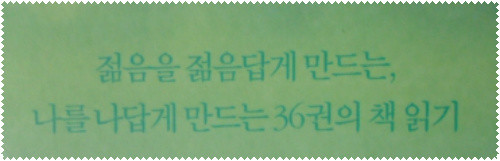
이렇게 읽고 싶은 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지만, 세상에 책은 넘쳐나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래도, 이런 책들은 '읽고 싶은 책 목록'에 담아 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 보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