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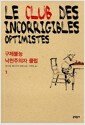
-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 1
장미셸 게나시아 지음, 이세욱 옮김 / 문학동네 / 2015년 4월
평점 :

절판

나는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고전들을 탐독했다. 나는 한 소설가의 책들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작품들을 읽고 있었다. 어느 작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본 결과 그의 인간 됨됨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품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 인간이 작품보다 더 중요했다. 작가의 삶이 영웅적이거나 명예로우면 소설들이 한결 재미있었다. 반면에 사람의 됨됨이가 혐오스럽거나 시시껄렁하면 읽어내기가 어려웠다.
시간을 허비하는 게 싫었던 미셸이 보기에 정말 쓸모 있는 일은 책을 읽는 것밖에 없었다고. 아침에 일어나 불을 켜면 책부터 집어 들었고, 다 읽을 때까지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탓에 어머니는 책에 코를 쳐 박고 있는 그의 모습에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 어머니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저녁 먹으라고 불러도 소용이 없자, 방의 전기를 아예 끊어버리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결국 하는 수 없이 주방에로 내려와 식사를 하면서 책을 읽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역정을 사고 만다. 그는 이를 닦거나 용변을 보면서도 책을 읽고, 걸어가면서도 책을 읽다 종종 지각을 하고, 수업시간에도 종종 책을 넓적다리에 올려놓은 채 독서를 계속한다. 강박에 쫓기듯 책을 탐하는 독서가의 모습이 어느 시절의 내 모습 같아서 뭉클했다. 물론 작품에는 작가의 삶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처럼, 작가를 선택할 때 작품을 봐야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따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는 밤에 몰래 빠져나갔다 어머니에게 흠씬 두들겨 맡지만, 그 와중에도 피에르에게 받은 <화씨 451>이라는 책이 손상되지 않았을까 걱정한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의 스탠드를 켜고 소설을 읽어간다. 그는 브래드버리의 그 책을 읽으며 저항할 줄 알아야 하고,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며 힘의 지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 물론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벌하는 나름의 방식이 고작 가족들에게 침묵으로 보호막을 치는 거였지만.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걸 몸소 실천하려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수염이 헙수룩한 남자가 커튼 뒤로 사라졌다. 천이 해어지고 여기저기 얼룩이 묻은 레인코트 차림의 남자였다. 이런 계절에 저런 차림으로 뭘 하러 들어가는 거지? 몇 주째 비가 내리지 않던 때였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커튼을 젖혔다. 문에 서툰 솜씨로 써놓은 글귀가 보였다. '구제불능 낙천주의자 클럽'.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내 평생 그토록 크게 놀라보기는 처음이었다.
중학생이던 미셸은 그곳 체스 클럽에서 장폴 사르트르와 조제프 케셀을 보며 무엇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든다. 그는 프랑크와 세실에게 자신이 본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만, 세실은 카뮈를 더 좋아했고, 사르트르를 떠받드는 프랑크는 카뮈를 싫어했다. 그들이 카뮈냐, 사르트르냐에 대해 논쟁한 덕분에 미셸은 하루에 케셀과 사르트르와 카뮈를 동시에 알게 된다. 미셸은 다시 클럽에 갔고, 차츰차츰 클럽의 회원들을 알아나간다. 그렇게 그는 테이블 풋볼을 함께 즐기던 친구들을 버리고, 클럽의 최연소 회원이 된다. 이 클럽은 소년과 동유럽과 그리스에서 넘어온 망명자들의 체스 클럽이다. 국적도 다르고 망명 이유도 제각각인 그들 중에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믿지만 해결책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사회주의와 절연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모두 무국적자였고, 누구나 역경에 빠져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책은 미셸이라는 소년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차츰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의 삶을 그리고 있다. 배경이 프랑스의 1959년에서 1964년까지의 시기인 만큼 역사의 큰 사건들과 개인의 삶이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들이 그려져 있다. 외부의 사건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그 와중에 낙천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쯤 생각해 보게 만들어준다.
"아름다운 것은 기억밖에 없어. 나머지는 먼지고 바람이야."
체스 클럽 망명자들의 이야기와 미셸 가족들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들려지는데, 소소하게 펼쳐지는 미셸의 풋사랑, 부모에 대한 반항, 로큰롤, 테이블 풋볼 그리고 책에 대한 엄청난 열망들과 가족과 사랑을 두고, 이념을 버려야 했던 망명자들의 에피소드는 너무도 이야기 거리들이 풍성해 두툼한 책 두 권을 읽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된다. 미셸이 동경하던 피에르가 군데에서 불의의 죽음을 맞고, 복무 중이던 미셸의 형 프랑크는 살인 사건에 휘말려 종적을 감추고, 그 일로 의견 충돌이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국 이혼에 이르고.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미셸은 체크 클럽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어수선한 시대에 휘말려 평범하지 않은 사춘기를 보내는 미셸의 삶은 소설 첫 머리에 실린 문구 "나는 비관주의자로 살면서 언제나 똑똑하게 굴기보다 실수를 저지르며 낙천주의자로 살고 싶다"로 고스란히 연결된다. 사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회에 대한 불신들을 치솟게 하는 소식들은 삶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한 시대에도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나가야 한다.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살아남아야 한다면 비관하고 우울해하기 보다는 낙관하고 희망의 끊을 놓치지 않는 게 스스로에게 더 좋지 않느냔 말이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