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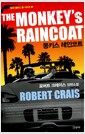
-
몽키스 레인코트
로버트 크레이스 지음, 전행선 옮김 / 노블마인 / 2009년 8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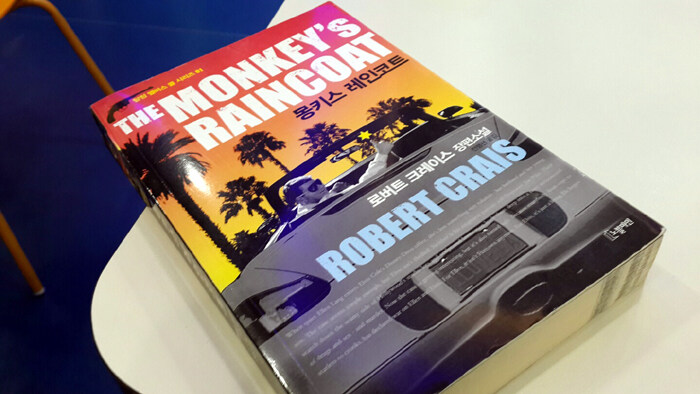
난 아무래도 로버트 크레이스 작가의 팬이 된 모양이다. 지금까지 아마 세 권의 그가 쓴 미스터리를 읽었는데 작가의 데뷔작인 <몽키스 레인코트>를 읽고 판가름이 나 버렸다. 지난 주에 신간 <서스펙트>를 읽고 나서, 2월달에 사두었던 <몽키스 레인코트>를 읽기 시작했다. 정말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도 마다하고 이 책부터 다 읽게 됐다 어젯밤에. 새벽까지 책을 읽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더 재미에 가속도가 붙어서 도저히 고만 읽을 수가 없더라.
자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설 탐정이라고 자부하는 전직 육군 특수부대 출신 엘비스 콜과 전직 경찰이자 묵묵하기로 소문난 남자 조 파이크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평가하고 싶다. 아무래도 할리우드 바닥에서 극본가로 다년간 활동한 경험이 놀라운 데뷔작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로버트 크레이스가 구사하는 문장은 간결하다. 그건 마치 한 편의 텔레비전 범죄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당연히 속도감도 탑재되어 있다. 다만 첫 소설이니 만큼 세련된 점이 아쉽긴 한데, 그런 점들은 후속작에서 개선되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이제 본격적인 <몽키스 레인코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올해 35세의 주인공 엘비스 콜은 39세 전업주부 엘렌 랭의 사건 의뢰를 받는다. 경찰이 개입되는 건 싫으니, 우리와는 달리 사설 탐정 서비스가 공인된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비용이 든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건 수수료는 별도의 청구를 빼고 2,000달러. 30년 전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 엘렌 랭은 실종된 자신의 남편 모트와 9살난 아들 페리를 찾아 달라고 한다.
사건 초반에는 할리우드에서 제작자로 활동하던 바람난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잠적한 단순 사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능한 탐정 엘비스 콜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수록 쉽지 않은 미션이라는 점이 속속 들어난다. 모트가 지역에서 투우사 출신의 이름난 범죄조직 두목인 돔(도밍고) 가르시아 두란이 아끼는 마약을 훔쳐 달아났다고 추정된다. 두란 패밀리는 잃어버린 마약을 찾기 위해 랭 씨네 집을 뒤집어엎고, 아이를 납치하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놈들이다. 미스터 두란에게 끌려간 엘비스 콜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마약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한다. 이거 점점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하는걸. 천하의 엘비스도 거물 범죄조직을 상대하기가 버거워 보인다. 신뢰하는 동료 조 파이크도 등장하지만, 쉽지 않은 대결이 전개된다. 물론 그 와중에 두 건의 로맨스인 듯, 로맨스 같지 않은 메이크아웃(make out)도 거칠게 등장한다. 이런 부분이 약간 세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
경찰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두 마리의 외로운 늑대 엘비스 콜과 조 파이크는 나름의 무장을 갖추고, 할리우드 람보 스타일로 두란 패밀리와의 최후의 대결에 나선다.
무엇이 30년 전의 <몽키스 레인코트>가 지금도 여전히 흥미진진한 소설적 아우라를 풍기게 만들었을까. 우선 현재 진행형인 엘비스 콜과 조 파이크 듀오의 끈쩍한 브로맨스가 그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엘비스 콜이 시니컬한 유머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반대에서 조 파이크는 침묵 가운데 동료와 그의 의뢰인을 호위하고 거친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둘은 불사신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때로는 범죄조직원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부러지고 깨지고를 반복한다. 심지어 최후의 대결에서 조 파이크는 총에 맞기도 하지 않던가. 그들도 인간이기에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다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념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다.
그렇다고 해서 엘비스 콜이 막무가내인 것만은 아니라고 로버트 크레이스 작가는 매력적인 엘렌의 친구 재닛 그리고 엘렌과 차례로 관계를 갖는 장면으로 이에 대해 항변한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들이 좀 소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30년 전에는 의뢰인과의 로맨스가 그런대로 받아 들여졌나 싶기도 하다. 지금은 아무도 모를 (존 쿠거) 멜런캠프의 이름이 소설에 등장하는 순간, 아 나도 옛날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다. 멜런캠프와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이 한 시대를 상징하는 미국 문화 아이콘을 절묘하게 다루는 점에서 로버트 크레이스가 대중들의 코드를 잘 읽는 작가라는 점을 엿볼 수가 있었다.
내가 다음에 만나보고 싶은 엘비스 콜/조 파이크의 작품은 바로 <L.A. 레퀴엠>이다. 이 책은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지 않을까 싶다. 아, 참고로 이 걸출한 소설의 제목 <몽키스 레인코트>는 바쇼의 하이쿠에 나오는 ‘원숭이도 도롱이가 필요하다’는 싯구에서 차용했다고 한다. 여전히 소설의 어떤 내용과 문맥이 맞아 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