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출처 : 마태우스 > 리뷰특강(3): 제목 붙이기
전출처 : 마태우스 > 리뷰특강(3): 제목 붙이기
초창기, 알라딘에 리뷰를 올릴 때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가장 큰 골치였다. 그냥 책 이름으로 하면 될 것을 왜 제목을 쓰게 했담, 이라며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그런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멋지구리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
내가 붙였던 제목을 보자.
-<리콴유 자서전>: 리콴유 자서전을 읽다
-<삼국지>; 삼국지 감상문
-<칼잡이들의 이야기>: 보르헤스의 책을 읽었습니다
무미건조하고 성의없어 보이는 제목, 이게 뭔가? ‘이렇게밖에 할수없던 내가 원망스러워’라고 노래한 빅마마가 생각난다. 제목에 대한 고민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
|
제가 요즘 리뷰를 못쓰는 건 제목 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책은 열심히 읽고 있다구요! - 2005-02-12 13:47   |
대체 어떤 제목을 붙였길래 리뷰 쓰기가 싫어졌을까? 그간 복돌님이 붙인 제목들을 한번 보자.
-김영하 저, <오빠가 돌아왔다>--> 누나는 언제 돌아오나?
-베르나르 올리비에 저, <나는 걷는다>--> 가끔은 달리고 싶다
-조지 오웰 저, <코끼리를 쏘다>--> 등짝이 넓어서 맞추긴 좋겠다
여기서 보듯 붙인 제목들이 다 시비조다. 독후감의 제목이란 책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함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야지, 시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럼 어려울 때마다 궃은 일을 도맡아 주는 따우님의 서재에 가보자. 과연 따우님은 어떤 제목을 붙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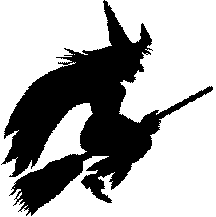
-<허삼관 매혈기>
원래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다. 따우님의 결론은 이랬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읽었던 현대 중국 소설 중 가장, 어쩌면 유일하게, 한 개인으로서의 '남자('여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인간'이라는 단어는 지양하겠다)'를 느끼게 해 준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결론을 내려주신 따우님이 이 리뷰에 붙인 제목, “드라큘라 얘긴 줄 알았어요”
수준높은 리뷰와 별반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라는 데 모두 동의할 거다. 따우님 역시 제목을 붙이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증거가 될 듯싶다.
그러고보면 제목을 잘 다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로드무비님이 <체호프 단편선>을 읽고 붙인 제목을 보자. “체호프를 읽으니 맥주가 땡기네요” 체호프--> 맥주, 이것 역시 그리 좋은 제목은 아니다. 리뷰에 쓴 것처럼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과 달리, 쩔쩔매며 살아간다는 게 제목으로는 더 좋았을 텐데.
 "나는 로드무비라네. 쿠오레!!"
"나는 로드무비라네. 쿠오레!!"
여기까지 읽고나면, 제발 자신이 쓴 리뷰는 언급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난 내 눈을 피하는 사람일수록 쫓아가서 확인하는 짓궂은 면이 있다. 깍두기님이 쓴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리뷰를 보자. 앞만 보며 달려가기보다 가끔은 하늘을 보자는 이 소설에 대해 깍두기님은 이렇게 리뷰의 끝을 맺는다.
“난 이 사람을 한 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다면, ‘박민규를 보고 싶다’든지 하는 제목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깍두기님은 우리 상식을 깬다. “이거 보다가 밥 태웠다” 재미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아니 요즘 밥 태우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현실을 무시한 제목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법, 페이퍼 제목은 기가 막히게 붙이는 깍두기님 역시 리뷰 제목은 어렵나보다.
 "저는 깍두기예요 히히"
"저는 깍두기예요 히히"
그럼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할까? ‘제목에서 일단 50점을 따고 들어간다’는 평을 듣는 마냐님께 오늘의 특강을 부탁드린다. 마냐님의 리뷰는 그 자체도 예술이지만, 탁월한 제목은 리뷰를 더 빛나게 하는 보석같은 존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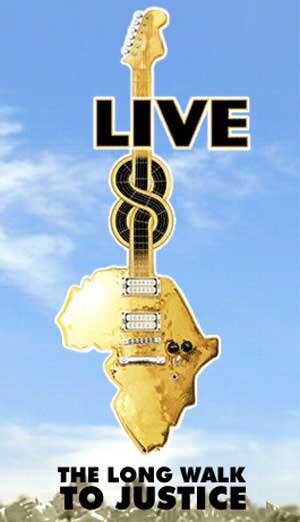 "저는 마냐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 닮아 이쁘죠?"
"저는 마냐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 닮아 이쁘죠?"
-<가상역사 21세기>; 구라도 탄탄한 토대를 갖추면 이미 역사다
가슴이 덥혀지는 멋진 제목이 아닌가. ‘구라’라는 속어도 마냐님이 쓰니까 괜히 예술 같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과 유리된 우아한 단어가 아니라 핵심을 짚어내는 말을 찾는 것이다. ‘역사’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토대’가 들어가고, ‘이미 역사다’라며 마지막을 정리한다. 이거 가지고 좀 어렵다고? 다른 예를 보자.
-<카트린 M의 성생활>: 서늘한 섹스담
‘서늘한 섹스담’이라니, 이만큼 이 책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우리는 ‘섹스’라는 단어 쓰기를 주저한다. 제목이 ‘성생활’로 끝나는 건 바로 그래서인데, 위선적인 그런 말보다는 적나라하게 ‘섹스담’ 하니까 필이 딱 오지 않는가.
-<그 남자네 집>: 베르베르, 노통브, 김영하, 당신들은 이런 글 못 쓸껴
도발적이기도 한 이 제목은 책에 대한 마냐님의 만족도를 잘 드러냄과 동시에, 노통과 베르베르 등 신세대 작가들에게 좋은 책이 것이 무엇인지를 통렬히 꾸짖고 있다.
-<모레>; 다빈치코드, 아성은 언제 깨질까
이 제목을 통해 마냐님은 <모레>가 <다빈치 코드>와 비슷한 서스펜스물임을 말해주고, 또한<다빈치 코드>같은 책이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1위에 머물고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걸 나타내 준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웬즈데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건...기대치가 낮았던걸까
마냐님은 우회적으로 이 책을 읽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전에 내가 붙였던 ‘돈이 아까운 책’보다 훨씬 세련되고 완곡한 표현이다.
어떤가. 좀 느끼는 게 있는가? 이쯤 했으니, 실전으로 들어간다. 마냐님에게 배운대로 고쳐본 제목이다.
-<리콴유 자서전>: ‘서늘한 일대기’. 필이 딱 오는 좋은 제목이다.
-<삼국지>: 수호지 아성, 언제 깨질까.
-<오빠가 돌아왔다>; 서늘한 가출담
-<나는 걷는다>: 베르베르, 노통, 당신들은 이렇게 못 걸을껴
-<코끼리를 쏘다>: 서늘한 사냥기
-<허삼관 매혈기>: 서늘한 매혈담
-<체호프 단편선>: 구라도 탄탄한 토대를 갖추면 소설이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김영하, 당신도 빨리 팬클럽 가입해!
하나같이 훌륭한 제목으로 탈바꿈했다. 제목 정하는 게 ‘별 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실 세상 일이란 게 알고보면 다 그런 거다. 이제 더 이상 제목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리뷰를 쓰자!!!
* 자진해서 비판의 도마위에 올라와주신 분들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