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0년은 <트윈픽스(Twin Peaks)>가 방영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4월 8일 ABC방송에서 방영한 문제의 드라마는 미국 전역을 떠들석하게 했고, 프랑스와 일본에까지 신드롬을 일으키게 했다. (일본에서는 트윈픽스의 배우들로 커피 광고까지 찍었고, 프랑스에서는 트윈픽스 극장판의 제작까지 했으니, 그 대중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났으리라)
내가 이 드라마를 처음 본 것은 93년인가, 94년인가. 15편으로 출시된 비디오를 매일 한 편씩 빌려보았다. 아련하고 몽환적인 음악. 캐나다 국경 근처에 위치한 조그마한 시골도시. 온 마을 사람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사랑했던 한 소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 범인이 잡히고 사건이 해결되도, 세상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망가진 채, 상처를 드러내고 계속 존재한다는 것. 그저 '대발이 아버지의 호통'을 들으며 움찔 하거나, '목욕탕 집 남자들의 짝짓기'를 보고 킥킥댔었던 내게, 이 드라마는 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었다. 설명이나 해결이 없는 세상. 불가항력으로 그저 흘러가는 세상. 혹시 내가 사는 세상은 저런 게 아닐까?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내다, 2007년 겨울, 우연히 <트윈픽스>를 다시 보게 되었다. 솔직히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내용을 다 알고 본다는 것은 김빠지는 일이다. '브루스 윌리스가 어쩌고', '절름발이가 저쩌고'라는 말을 듣고 <식스 센스>나 <유주얼 서스펙트>를 본다면, 얼마나 김빠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윈픽스>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었다.
작년 초에 다시 감상하면서 느낀 점. 이 드라마의 힘은 미스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불완전한 인간들이 완전한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속임수와 위선이다. 통나무, 제재소, 잣나무숲, '지랄맞게 맛있는(Damn Fine)' 커피와 체리파이, 평화로운 전원생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트윈 픽스를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임수와 위선이었고, 로라는 그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튕겨나와 죽었다. <트윈픽스>는 겉보기에 한없이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위선을 매 회 하나씩 까발리는 드라마였다. 외지사람 FBI수사관 데일 쿠퍼의 개입으로. 언제나 정체된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법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여름이 오기 전에, 이 드라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다. 여러가지 목록을 준비중인데, 알라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라 아쉬울 뿐이다. 워낙 오래된 작품이라 관련 상품도 다 절판인 점도 아쉬운 점이고. 중고상품을 찾긴 했는데, 아마존이나 이베이는 불안한감이 없지않다. 그리고 고작 5,000원도 되지 않는 상품을 세 배나 되는 배송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눈물나고. 기도가 차면 들어주시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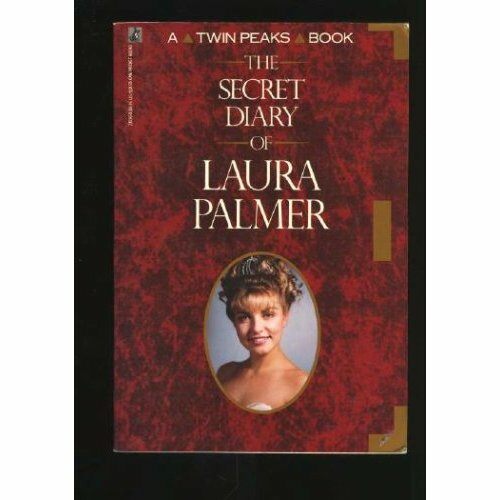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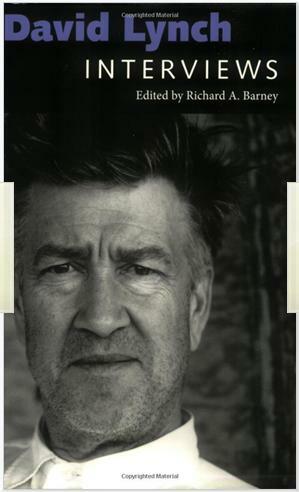
 |
"누가 로라 팔머를 죽였는가?"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그 질문은 "로라 팔머는 왜 죽었는가?"로 수정되어야 한다. |
 |
사건의 처음인 테레사 뱅크스의 살인 사건과 로라가 죽기 전 일주일을 그린 영화. 마크 프로스트가 빠지고 데이빗 린치만 남은 이 영화는 처연하게 역겹고, 기막히게 슬프다. |
 |
안젤로 바달라멘티의 아름답고 슬픈 선율, 줄리 크루즈의 몽환적인 목소리. 단 한 곡도 뺄 게 없는 최고의 OST |
 |
TV OST가 몽환적이고 아름다웠다면, 영화 OST는 퇴폐적이고 끈적하다. 같은 내용을 전혀 상반된 분위기로 표현해내는 안젤로 바달라멘티의 뛰어난 솜씨. |
 |
국내에 유일하게 번역된 데이빗 린치의 저서. 적은 분량에 절반은 그가 설립한 명상 재단에 관한 내용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영화에 관한 그의 내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