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5세가 되면, 누구에게나 단어가 내린다고 한다. 쿵 떨어지건, 끈적하게 들러붙던,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묘사하건 간에 관계없이 다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단어가 찾아온다고. 내게 특정한 단어가 찾아오는 세계란 과연 어떤 세계일까. 그 단어는 숙명이 되는 것일까 동반자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가장 상상하고 싶지 않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 흥미로운 설정이다.

흡사 주제와 변주를 떠올리게 하는 구성의 이야기 모음.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이 얽혀 선택의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는지를 밝혀 보고자 했던 듯하다.

인지편향을 넘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

이 책의 상세페이지를 열어보고 오랫동안 넣어둔 기억을 꺼내보았다. 여전히 아픈 기억이다. 마음이 아파서 버리고 싶었던 사람의 치열한 생존기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제목 그대로 진짜 60편의 이야기가 가득 들었다. 아마도 이 책에선 온갖 갈래의 감정을 주워담을 수 있지 않을까. 몇 페이지 안 되는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대체 긴장과 이완이 자리잡을 여유가 있긴 있었을까 궁금한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보다.

진짜 살아있는 경제교육. 소개글만 봐도 재미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박은 역시 선생님 몸무게 주식... ㅎㅎㅎ

직업인의 글을 좋아합니다. 그 필드의 전문가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란 게 세상엔 있잖아요?

정말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 역시 세상엔 먼저 내놓은 사람이 위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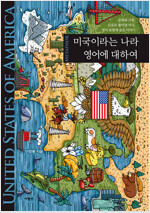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잘 하고 싶은 1인으로서 영어로 쓰고 말하는 일을 다루는 책은 가능한 한 많이 본다. 그럴 때마다 절감하는 건, 외국어를 배우는 건 피상적으로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는 일에서 시작할지 몰라도 그 언어를 구사하는 숙련도와 세련미는 결국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많이 좌우되더라는 거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이상이 발생했을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보면 내가 챙겨 들을만한 조언이 꽤 많을 거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고.

정세랑 작가의 여행 에세이라고. 여행하는 정세랑 작가는 어떨까 생각하자마자 낯선 여행지에서 문득 들려오는 새소리에, 쟤는 누구일까를 곰곰 고민하는 작가의 모습이 같이 상상되었다.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이 알아버릴 것 같지만.

리즈 무어의 Heft를 굉장히 감명 깊게 (와, 이 고전적인 감상문구 국딩 졸업 후 처음 써 본다!) 읽었었다. 그 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일단 사다는 놓고 아직 읽지 못했는데, 이 책도 일단 사다는 놓고 언젠가 읽을 날을 기약해야겠다.

제목만 저런 줄 알았다. 목차를 보니 진짜 사전이다! +_+
살다보면 한 번쯤 발을 걸고 넘어질 만한 넘들을 총망라(에 가깝게...)한 듯한 재미난 책인 듯.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올시다인데 어쩌다가 최근 (이건 순전히 북클럽 친구들 때문이라고 둘러대겠다 ㅋㅋ) 미국 작가의 로맨스 소설 두 권을 읽게 됐는데 정신이 혼미해졌다. 요즘은 로맨스라는 장르가 이렇게 수위가 높단 말입니까. 손절하겠어!를 외치기 전에 왠지 순진해 보이는 연애소설은 한 번 보고 지나갈까 싶기도 하고(개인적으로는 이도우 작가 풍의 연애소설이 딱 좋다... 그 이상 넘어가면 멀미나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화적 코드를 새기며 살아왔지 싶은 곽아람 작가를 좋아한다. 그녀의 책에는 여기저기 콘센트가 있어서 언제든 원할 때 공감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친밀하게 느껴지는 작가의 책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운이 좋은 일이다.

와 책 제목 정말 절묘하게 잘 뽑았다 싶다. 취사 선택의 기술을 알려주는 실용서 같...

저자의 직업이 '디지털 문화심리학자'라고 한다. 익숙한 직함은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직업도 있었나 싶은 직업들이 더더더욱 많아지겠지. 레드오션 레드오션 하는데, 남들이야 뭐라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낯선 직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단 귀기울여 보면 챙겨갈 것이 있더라.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두어 달 전 읽었던 데비 텅의 만화가 생각났다. 약속이 취소되면 책 읽을 시간이 생겼다며 만세를 부르는 그녀.

제목만큼 신나고(??) 명랑한 소설인 줄 알았는데 조금의 사연도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갖은 미식 메뉴와 낮술이라니 참... 참... 상큼(?)한 조합 아닙니까?
+
본의는 아니지만 요즘은 책 사재기를 좀 자제하고 있다. 여기저기 자리잡은 책꽂이 중에 '안 읽은(읽으라고)'책 칸이 있는데, 이 칸(평균 250페이지 25권 정도가 꽂힌다)이 넘어가면 사유야 어쨌건 무조건 책 구입을 중단하기로 작년에 자신과 나름 엄숙한 -_- 서약을 했기 때문이다. 이 중에 밀레니엄 시리즈 1권과 4권이 있었는데(구비만 해 놓고 안 읽는 이 괴이한 버릇은 조만간 영구폐기해야할 텐데 잘 안...) 사나흘 전쯤 우연히 1권을 읽었다가 오늘 하루를 2권 읽는데 온전히 갖다부었다. 작가가 바뀐 뒷 시리즈도... 텐션 여전할까? 더 시간을 쏟지 말고 이쯤에서 발을 빼야 하나... 이런 일없는 고민을 하느라고 저녁 이후의 귀중한 휴식시간도 다 내다버렸다.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