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득 떠오른 몽롱한 아이디어가 부분적으로 오싹한 상상이 되어 짜낸 이야기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이들은 무엇이든 크게 받아들인다.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별 것도 아닐 일을 정말 크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런 아이들의 심리와 작가의 상상력이 만난 여섯 편의 이야기가 실린 단편집이다. 표제작인 <나무가 된 아이>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말 그대로 나무가 되어버린 아이의 이야기인듯.

김동식 작가의 소설집 9, 10권이 동시 출간되었다.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김동식 소설집 시리즈는 이것으로 막을 내리고 다른 기획에 들어가는걸까. 사실 나는 3권까지 읽고 이후엔 미처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식 작가의 매니아가 된 중딩이들 덕분에 뒷 권들 내용을 다 알아버렸다. -_- ... 이번엔 내가 먼저 읽고 얘네들한테 다 스포일해버릴까. 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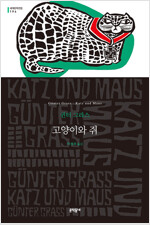
사실 나는 귄터 그라스를 읽어본 적이 없다. 일단은 작가가 그래픽 아트를 전공했다는 이야기가 금시초문이었고, 표지의 고양이 그림이 작가가 직접 그린 것이라는 게 그림의 인상을 넘어선 강렬한 충격이었다. 전달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글 말고도 또 있는 작가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늘 생각하는데, 귄터 그라스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구나.
그리고 마지막. 나치 이데올로기를 고발한다, 라는 소개글에 낚임. 지난주에 읽었던 엘리 위젤의 <나이트>가 너무 힘들었어서 당분간 나치 이야기는 외면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방관자도 동조자다, 결국 그 준엄한 말의 위력에 굴복한다. 맞다. 아무리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어도 그래선 안 된다. 결국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위해를 가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니까.

편견은 정말 무섭다. 대부분의 경우 이 놈이 이성을 압도해 먼저 컨트롤 패널을 잡기 때문이다. 내가 옹졸하고 편협한 소리(행동)를 했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물이 엎질러진 뒤였다. 우리는 왜 자꾸 편견을 가질까. 편견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편견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 왜 그런지를 공부해야, 조금이라도 그런 경향을 덜어낼 수 있겠지. 추천사가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서 가져와봤다.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정말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처음 듣는 이름의 작가인데 간단명료하면서 감추는 게 몹시 많은 것 같은 저 제목이 아주 눈길을 끈다. 요즘의 책 제목들은... 사실 제목 읽는 것만으로도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그런 게 좀 많아서... 뭣보다도 저 표지의 일러스트가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절반은 다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다. 정교하고 사실적이면서 좀 몽상적이고 목덜미가 간질간질하다 쭈뼛 소름이 돋을 것만 같은.

섭스크립션 서비스가 워낙 종류가 많아지면서 이젠 트렌디한 느낌은 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싶다. 아직 구독경제에 관한 책은, 마음만 앞섰지 제대로 읽은 건 하나도 없긴 한데 경제 모델의 흐름도를 파악하고 있으려면 한 권쯤은 꼭 읽어야 하지 않나 싶다.

김정선 선생님이 내신 맞춤법 책. 이건 뭐... 그냥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본과 연합한 기술의 침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러시코프는 인류가 개인주의 대신 연대하여 team human이 되어 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은 어디까지 밀고 들어올 것인가.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더 이상 잠식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일만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어린 시절에 공간에 대한 아주 미약한 지식이나마 얻어들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공간 감수성을 얼마나 다르게 키우는지를 적나라하게 봤던 관계로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게 해 주고 관련 지식을 (책으로 밀어넣어줘야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 건네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공간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에 따라 결국 도시의 질이 달라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아주 거창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테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인 듯한데 주인공이 아주 맘에 든다. 또래보다 작은 체구의 청각장애 소년이란다. 당연하지, 사지 멀쩡한 아이들만 모험의 주인공이 되라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게 그런 감각에서 '잘' 쓰인 소설인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다.

인간처럼 진화한 개들의 이야기. 인간과 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이 설정에서, ... 적어도 아이들은 뭔가 '...' 하고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문화는 애초에 문명과 같은 의미였다고 한다. 지금은? 지금은 문화는 거의 자본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문화에 대해서 테리 이글턴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문화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문화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으며, 무엇을 해야 할까.

루이 비뱅 말고도 늦은 나이에 그림에의 열정을 불사른 나이 든 화가가 한 분 있다. 모지스 할머니는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듯하다. 모지스 할머니 말고도 이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화가로 이름을 떨친 분이 계실 줄은 정말 몰랐다. 모두가 비슷한 환경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뭔가를 항상 더 이루어내곤 한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잠깐이라도) 사뭇 강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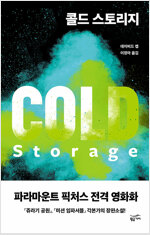
이거 우리 중딩1호가 맨날 걱정하는 건데 딱 그 스토리로 소설이 나왔네... ㅎㅎㅎ
과거의 바이러스가 현대의 우리를 습격하는 바로 그 스토리. 음... 영화화한다는 띠지를 보니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한데 어떠려나.
지난 주도 책 많이 사시고(... ㆀ) 책도 많이 읽으셨기를... 이번주도 열심히 읽는 한 주 되세요 :)
이번주의 목표. 다음주 신간 정리 하기 전에 최소 3개의 포스팅이 사이에 끼어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