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세 권 :)
3.

책 좀 읽는다는 지인들이 빠트리지 않고 꼭 추천했던 작가가 루이즈 페니인데.... 되도 않는 곤조를 부리느라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쩌다보니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아주 상태가 좋은 가마슈 경감 시리즈를 중고로 내놓은 분이 계셔서, 시리즈를 전부 갖추게 된 김에 읽기 시작. 나 왜 이거 진작 안 읽었던 걸까...
스리 파인즈라는 캐나다의 어떤 시골 마을이 있다. 모두가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작고도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가마슈라는 이름의 경감이 이곳에 파견되어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려 한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몹시 독특해서 일반적인 경찰 또는 탐정에 익숙한 미스터리 독자에게는 이질감까지 선사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수사를 한다. 최대한 객관적인 것만을 수용하려 하고 섣부른 판단과 추론을 끝까지 경계한다. 현실에선 굉장히 희귀한 타입이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인물이지만 그래서 나는 그를 더 응원하게 된다. 당신의 신념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나는 지켜보네. 관찰해서 뭔가 알아차리는 걸 아주 잘하지. 그리고 들어. 귀담아듣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낱말과 어떤 목소리를 택해서 무얼 말하는지, 혹은 무얼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니콜 형사. 바로, 선택이지."
"선택이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선택해. 지각 대상도 선택하지. 태도도 선택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지. 그 증거를 숱하게 보았거든. 매번. 통곡할 일에서든, 환호작약할 일에서든. 결국은 선택 문제야." -113쪽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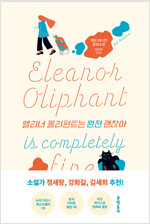
엘리너 올리펀트는 평범하지 않게 평범한 사람이다. 타인들은 평범하지 않다고 그녀를 평가하고, 자신은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너는 정말로 평범하려고 힘껏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종종 엘리너가 들을 줄 알면서도 그녀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비웃는다. 평범하려는 그 노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나는 안다. 세상엔 엘리너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어디선가 툭 부딪히며 튀어나온 엘리너들이 내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사회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일단은 눈썹을 둥글게 휜 채로, 저 사람 도대체 뭔가 문제야, 왜 저래? 라고 혼잣속으로 생각할 거다. 그들 안에 어떤 우물이 있는지 모르면서, 알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다행히도 좋은 사람들이 좀 나온다. 잔뜩 나온다고는 못 하겠는데, 조금 나오지만 한 열 명쯤의 좋은 사람 몫을 합한 것 같은 좋은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은 엘리너를 알아보고 살짝 뒤에 서 있다가, 조금 기다려서 옆자리로 옮겨 함께 걷는다.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좋다. 세상에 이렇게 심성이 따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없었더라도 이런 소설을 읽으면 조금 별나 보였던 사람들을 보는 눈이 예전과는 좀 다를 거다.
레이먼드가 빠르게 걸었고, 나는 새 부츠 때문에 그와 보조를 맞추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걷는 속도를 늦춰 보폭을 맞추었고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작은 제스처 - 그의 어머니가 식사 후 차를 내올 때 내게 물어보지 않고도 내가 설탕을 넣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 로라가 미용실에서 내게 커피를 가져다줄 때 접시에 작은 비스킷 두 개를 올린 것 - 가 아주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런 단순한 일을 해주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241쪽
5.

2020 탑픽5에서 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쉽게 읽힐 책이라면 주저없이 이 책을 먼저 추천하겠다. 가장 공감하기 쉬운 감정과 상황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리스의 한 섬에 휴양차 여행을 온, 아무 연고도 없던 관광객들이 우연히도 동시에 비극적인 해상 사고를 목격한다. 현재진행형으로. 그 사건은 그들에게 공통의 트라우마 비슷한 낙인을 찍고 그들을 한데 묶어버린다. 관광만 하고 떠나려던 섬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은 그들에게 정신적인 상처만 남긴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키를 크게 틀어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라는 것이 이 소설의 큰 얼개이고, 사실 이야기의 전부라고 과장할 수도 있지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을 촘촘히 메우는 이야기의 질감과 무늬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
불행 앞에서의 사람들의 연대감이라든가, 사람은 누구든 자기 일만큼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든가, 아무리 남의 조언이 중요해도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라든가...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공감하면서 읽기에 더없이 좋다. 쉽게 읽히면서 재미있고 그런데 팔랑팔랑하니 가볍지 않게 쓰고 예쁘게 마무리 매듭까지 잘 감추는 게 이 작가의 장점인 것 같다(고 하기엔 이 책밖에 읽어본 게 없어서 말하기 어렵...).
2020년도 재미난 소설들과 - 유난히 소설을 많이 읽은 해였다 - 다이내믹하게 보낸, 감정적으로는 다이내믹했는데 실제 현실은 맨날 집순이... -. 올해는 사정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라도 역시 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쌓고 그리고 또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