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은 괴상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한다. 나도 그 땐 그랬다. 왜인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끈적끈적하게 기분나쁜 괴이한 이야기보다는 적당히 서늘하고, 신나고, 조금 섬뜩하지만 마음이 풀리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책일 것 같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섣부르게 위로하는 말보다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끌러놓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어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가 풀어놓은 아픔을 한 걸음 물러서서 물끄러미 바라보면 객관적인 거리감때문에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누군가는 우연히 그것을 지나쳐보다가 아, 하고 잠깐 멈춰설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

네 저는 이런 제목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긴 뭐가. 누구 마음대로. 제발 이런 제목 안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타이틀에 혹하는 어린이(is 13 going on 14)가 한 분 계신다. 제목은 영 별로여도 내용이 재미있고 쏠쏠한 경우가 많긴 하더라.

작가 프로필을 보다가 포복절도. 호러소설 창작그룹 괴이학회... 이름 진짜 창의적이다. 답답해 죽겠는 이런 시절에 이런 액션 소설 한 권쯤 읽고 싶다. 요즘 루이즈 페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재미가 있기는 진짜 있는데 마음이 자꾸 무거워져.

아, 다 읽고 나면 진짜 뭔가 속에 확 가라앉아서 지독한 체기마냥 한동안 묵묵할 것만 같은데... 그런 필이 확 오는데, 그런데 왠지 읽어야만 할 것 같은 스멜. 사회파 미스터리는 왠지 읽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늘 생기는데 읽기는 힘들고 읽고 나서는 더 힘들고. 어째야 하나.

어쩐지 있으려나 서점을 연상시키는데... 아니었다. 그런데 왠지 여기는 있으려나 서점 같은 서점일 것만 같네. 서점 이야기는 에세이여도 좋아하고 소설이어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점 책이 나왔으면 읽어야 하는... 읽고 싶어지는... 스스로에게 부과한 숙제 같은 거다. 그런데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처음 들어본 서점이지만(소식이 늦다) 지금까지 들어본 국내 서점 중에 제일 관심이 간다.

이 명사가 설마 그 noun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멋대로 오해해 놓고 한 방 먹은 기분. 어쨌거나 명사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문장이 어디 있고 스토리가 어디 있겠나, 명사가 차지하는 자리는 대개가 정해져 있으니 다른 손님들도 어울렁 더울렁 들어와 앉아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고보면 명사 하나를 두고 이야기 손님을 초대하면 얼마나 많은 얘깃거리들이 쏟아져 나올지 가늠도 안 된다. 이 분에게 의미가 있던 명사들이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해진다.

나는 이름붙인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몹시 부럽다. 제일이라고는 못 하겠지만, 여하간 세 번째나 네 번째쯤 부럽다. 가끔 생각해 보는데, 내가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곳이 책으로 가득할지, 스케치북과 연필과 물감으로 가득할지, 원단과 재봉틀과 실뭉치로 가득할지, 그 모두로 복닥거릴지는 여전히 상상이 잘 안 된다는 결론만 난다. 이토록 정신 사나운 취미부자가 또 있을까 몰라. 여하간, 여러 면에서 워너비의 삶을 사셔서, 그냥 부럽다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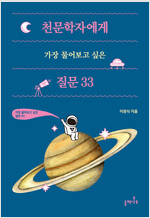
천문학에 관심이 급증한 우리 중2가 아주 좋아하겠다. 얘가 뭔가 물어보면 이제는 내가 동공지진의 강도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아... OT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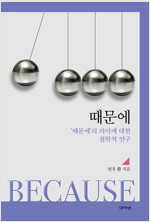
으악. 난 내가 이런 책 절대 못 읽어낼 걸 안다. 그렇지만 있어빌리티는 장난이 아니구나... 아니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이런 책을 써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굉장한 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부모들이 준비하는 것이 뭔지 궁금할 때가 있다. 물어보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솔직한 답을 듣기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담론은 불확실성만큼이나 혼돈 그 자체라서 각자도생밖에 길이 없는가... 싶기도 한 게 솔직한 심정이다. 다만 어떤 학계나 집단의 대표보다 이런 개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다. 여하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고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지 싶다는 거.

컨셉트가 좋은 책들이 눈에 띄면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조금 알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밤은 누구나 수다쟁이로 만드는 시간인가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선호하는 어른이는 잘 모르...(퍽) 어쩌면, 유희경 시인은 원고를 넘긴 뒤 무심결에 다시 펼쳐보고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만요! 를 외친 순간이 혹시 호옥시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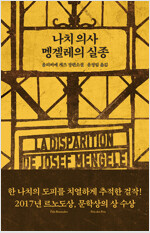
어떤 소설을 읽다보면 작가와 별도로 이 소설의 퍼스널리티는 뭘까?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할 때가 있다. 작가도 분명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썼을 것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인 양 어떤 성격을 띠는 게 아닌가 가아끔 생각한다. 그럼 이런 책의 퍼스널리티는 뭘까. 사람으로 치면 어떤 나이대의,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복장을 하고 주로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스스로도 이상하지만, 왠지 이 책의 표지만 보고 나는 사립탐정을 떠올리고 말았다... 물론 아직 읽어본 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