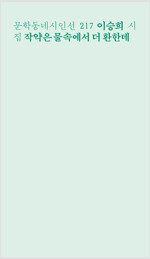주문한 작약이 도착했다. 해마다 작약을 주문하는 일은 새해 소망 리스트 같은 것이다. 새해를 기다리며 하고 싶은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기대를 품지 않는다. 하지만 작약은 다르다. 3월부터 나는 작약을 검색한다. 적확하게는 작약 생화. 그리고 기다린다.
작약을 기다린다. 나는 작약이 좋아서, 작약을 기다리는 4월이 좋고, 작약을 만나는 4월과 5월이 좋다. 올해의 작약은 작년보다 비쌌다. 구매 기록을 살펴보니 그렇다. 월급을 뺀 나머지가 다 오르니 당연하다. 코랄 작약 주문이라고 다이어리에 메모를 했지만 코랄 작약은 구매할 당시 품절이었고 나는 핑크를 주문했다.


그냥 좋다. 작약은 그냥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마구 찍는다. 꽃이 피기 전 이런 봉오리는 설렘 그 자체다. 하루 사이에 마구 피어나는 작약. 수요일에 만난 작약은 이틀이 지난 지금은 만개했다. 벌써부터 아쉽다. 풍성한 작약을 보고 있노라면 부자가 된 기분이다.


5월이니 새 책도 주문했다. 박세미의 신간(나, 박세미 좋아하나?)이다. 난다의 시의적절은 매달 구매하지는 않고 끌리는 제목이나 저자를 선택하는데 이번 5월은 박세미의 『11시 14분』였고 나는 냉큼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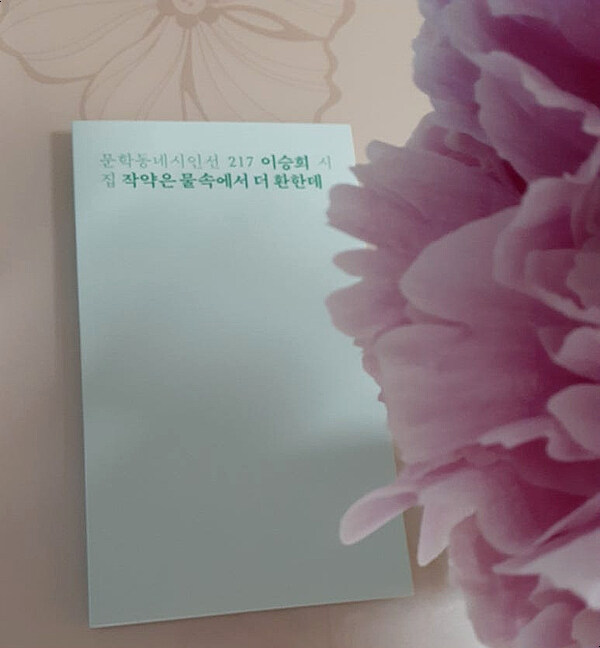
그리고 이런 시집을 펼친다. 작약이니까. 이승희의 시집 『작약은 물속에서 더 환한데』속 이런 시를 읽는다.
우리는 서로를 모른다
모른다고 종일 속삭인다
속삭이면서 발을 내어놓는다
발을 내어놓으며
맨발이라고 했다
참 따뜻한 발을 가졌으니
예쁜 모자가 어울릴 거야
그런 세계를 보게 되면 초대할게
모르는 세계는 그런 거니까
어긋나는 게 생활이야
어긋날 수 있다니
어긋나기 위해 사는 거라니
넌 정말 위대한 건축가가 되고 싶구나
자꾸 죽는 것과 자꾸 사는 것이
서로 좋아해서
물고기떼처럼 흘러가는 세계
그런 세계는 잘 모르지만
몇 번 죽으면 갈 수 있을까
나를 아주 가끔만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어
안으면서도 몰랐고
몰랐으면서도 안았고
흩어지는 온도를 기록해보고 싶었는데
모르는 것이 생겨날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했어
그냥 우리는 모르는 일에만 열중하자
모르는 것들 사이로
모르는 것들 조금씩 박아넣으며
모르는 것들을 낳을 때까지 (「정원을 파는 상점」, 전문)

5월은 작약과 시와 함께 시작한다. 활짝 핀 작약이 져도 5월은 작약으로 남을 것이다. 시를 다 읽어도 시를 다 읽지 못해도 5월은 이승희의 시로 기억될 것이다. 박세미의 책을 읽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