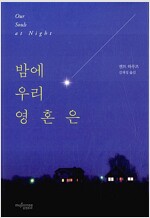지난 주말에는 H를 만났다.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그녀는 먼 도시에 살고 있다. 먼 도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 나를 보러 왔다. 우리의 만남은 2016년 가을에 만난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 사이 서로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삶을 이동하는 일, 삶을 다시 정비하는 일이라고 하면 맞을까. 그건 회복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된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곳에서 유명하다는 빵집에 들러 한 바구니의 빵을 사 왔다. 밤이라 그랬는지 사람도 없었고 빵도 없었다. 늦은 밤에는 술을 마셨다. 아니, 술은 나 혼자 마셨다. H가 술과 커피에 대해 민감한 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대로 몰랐다. 잘 모른다는 걸 알았다는 게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으니 더 좋았다. 내가 맥주를 마시는 동안 H는 사이다를 마셨다.
우리의 시간에는 말이 넘쳤다. 말이 둥둥 떠다니고 거실 바닥과 식탁 위에 말이 나뒹구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상상이었다. 그만큼 우리의 말들은 다양했다. 하고 싶었던 말, 주저했던 말, 고민으로 뭉쳐진 말, 모든 말들이 다 그곳에 있었다. 그 말들이 다 우리의 것이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다. 자주 만나지 못하기에 그랬을까. 아니, 나의 말을 모두 들어주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맑은 하늘과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다”는 말을 자주 하며 사진을 찍는 H가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었다. 그에 비해 나는 감탄은 양이 적다는 걸 발견했다. 나이가 드는 탓일까.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픈 몸에 대해, 늙은 몸에 대해 두려움이 아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그런 대화는 책으로 이어졌다. H가 영화로 보고 나는 책으로 읽은 『밤에 우리 영혼은』에 대해 서로의 느낌을 말하면서 같은 작가의 『축복』도 좋았다고 추천했고 조남주의 소설집 『우리가 쓴 것』속 여성 서사와 황정은 소설에 대해 환호하면서 『백의 그림자』 에 대한 감상을 나눴다.
우리로 채워진 시간은 지나갔고 각자의 시간이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