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읽기가 지겹거나 인문서 읽기가 무거워지면 찾는 책이 에세이다. 달달하고 감성적인 산문에서부터 딱딱해보이지만 통찰력이 엿보이는 에세이. 인간에겐 역시 인간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에세이 골랐다. 읽었거나, 읽기 위해, 혹은 읽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책들. 꽤 많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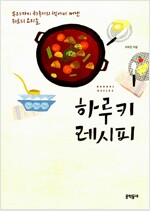
두어 달 전, 홍대에 있는 네타스 키친에서 행사가 있던 날, 살짝 엿들었었다. 곧 하루키 작품 속의 요리들을 묶은 책이 나올 거라고. 요리책을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루키'라는 이름에 귀가 쫑긋 세워졌다. 와, 대박! 하루키 작품 속 요리라니!! 그러고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다. 제목하여 『하루키 레시피』. 마침 하루키의『여자 없는 남자들』을 읽고, 이전에 신형철 평론가 덕분에 하루키의 단편에 빠져 있던 차인지라 우연처럼 맞아떨어진 하루키와 관련된 책에 바로 빠져들었던 것.
『하루키 레시피』를 쓴 차유진 요리사(난 작가나 푸드 칼럼니스트보다 요리사라고 부르고 싶다!)는 이미 하루키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 나오는 '손녀딸')로 닉네임을 정해 '하루키빠'임을 입증하고 다녔더랬다.『손녀딸의 부엌에서 글쓰기』란 책도 일찌기 사 읽었다. 요리에 관한 책이니까! (진짜, 나도 한 때는 친구들에게 요리집(ㅋ) 내라는 소릴 많이 듣던 사람이었다. 진짜!) 하물며 하루키 작품 속 요리라니. 난 요즘 하루키하고 같이 사는 것 같다. 나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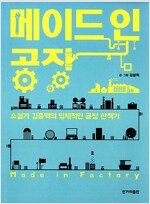
프롤로그에서 그가 말한다. "공장은 나를 가로막는 높은 벽이었고,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진다 싶으면, 반 등수가 조금이라도 내려간다 싶으면 '공부 당장 때려치우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라'는 말을 하셨다.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서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표정한 얼굴로 나사를 조이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이 문장을 읽는데 공감이 되었다.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공장이 많은 도시가 옆에 있던 내 고향은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대학에 가지 못하면 그 도시의 공장으로 갔다. 공장이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어린 마음 속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했었다.
김중혁 작가의 새 산문집 『메이드 인 공장』은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그런 공장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젠 다 자라 공장이라는 말에 떨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공장이라는 것에 대해 수다스러운 글과 그림으로 들려준다. 책소개에 나오듯이 '김중혁의 느긋하고 수다스러운 공장 탐방 산책기' 산책, 어쩐지 김중혁과 참 잘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공장이 그렇다기보다는 그가 다닌 공장들이 다 그런 듯. 흥미롭다. 소설보다 산문이 더 끌리는 작가. 미안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 그에게 붙은 수식이 소설가, 만은 아니니까.

여기 소설가이지만 산문이 더 좋아요, 라는 소릴 듣기도 하는 작가가 한 사람 더 있다. 그런 소릴 듣는 작가는 아마도 품성이 따뜻한 사람일 것이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보다 솔직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니까. 거문도엘 다녀왔다. 책에서만 보던 그곳의 바다를 보며 감탄을 한 며칠이었다. 등대를 보았고, 낚시를 했다. 해질 무렵의 바다가 얼마나 붉은지 확인을 했고, 보로봉에서의 일출을 경험했다. 한창훈 작가의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와 『내 밥상의 자산어보』가 아니었으면 거문도라는 섬은 누구처럼 내게도 거제도일 뿐이었으리라.
『내 밥상의 자산어보』가 바다의 먹거리를 위주로 글을 썼다면 『내 술상의 자산어보』는 바다와 작가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거문도에서의 며칠은 먹거리보다, 고독과 쓸쓸함을 느낀 날들이었다. 홀로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 산책을 하거나 인적 없는 갯바위를 때리는 세찬 파도를 바라보거나 보로봉에서 등대로 가는 길을 걸으며 섬에서의 생활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보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아, 새로나온 책에서 세 권의 이 책을 보는 순간, 눈이 휙~ 돌아갔다. 한데 출판사를 보고 다시 한번. 돌아간 눈. 이럴 수가. 열화당이라니! 이 출판사는 이벤트도 없고 할인율도 낮다. 얼마 전에 존 버거의 책을 사러 들어갔다가 5%라는 할인율을 보고 뭐지, 이건? 괜히 툴툴거렸다. 마치 그들이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한데 그 출판사이니, 이벤트는 없을 테고, 기다려도 5%이상으로는 내려가지도 않겠지. 심지어는 정가대로 받는 책도 수두룩하니. 10%할 때 얼른 사야 한다며(-.-)
딴 소리로 샜는데, 아무튼 열화당에서 나왔다. 『고백의 형식들』 『끝나지 않는 대화』 『어둠 속의 시』, 3권 세트로. (존 버거의 책들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만화 세트 아아, 사고 싶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고 말겠지만, 아직은 참는다ㅠ.ㅠ) 대담은 두고서라도 산문과 시집은 몹시 땡겨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다. 내가 찜을 했으면 분명 '이성복'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살 친구들도 찜했을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일단 실제로 본 후에 구입하겠노라, 미루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하여.

'소설가의 눈에 비친 인간이라는 작은 지옥' 예판을 할 때부터 나는 이 문장에 꽂혔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의미심장했다. 책이 왔고, 책을 읽었다. 감성적인 문장은 없다. 소설가로서 그는 사람을, 세상을,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와는 다르게, 소설가답게. 그래서 한 꼭지 읽을 때마다 그의 깊은 통찰과 사유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보다』, 김영하 산문집. 그의 산문을 읽은 기억은 있지만 기억이 나는 글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산문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산문집을 낸 것도 아주 오래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소설이 아닌 산문을 읽는 재미가 색달랐다.

그리고 예판 중에 있는 또 한 권의 에세이. 허지웅의 『버티는 삶에 관하여』, 이전에 쓴 소설은 솔직히 내 취향이 아니어서 허지웅의 글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더랬다. 내가 소설은 내 취향이 아니던데? 하면 그들은 소설 말고! 라는 말을 해주었다. 그는 블로그에 글을 꼬박꼬박 올리던 사람이고 기자로서 써내던 글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글에 대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에세이가 나온다는 얘길 듣자마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버티는 삶에 관하여』에는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기억, 20대 시절 그가 맨몸으로 세상에 나와 버틴 경험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 '글쓰는 허지웅'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혹은 '글쓰는'이라는 수식어에 자신감이 붙어 있는 걸로 보니. 괜찮은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

아침에 페북을 통해 신형철 평론가의 새 책 표지 감리하는 사진을 봤다. 평론을 써서 이렇게 인기를 얻은 평론가는 아마 몇 안 될 것이다. 그만큼 그의 글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평론이 어렵지 않게 읽힌다면 이번에 내는 에세이는 얼마나 말랑거릴 것인가? 몹시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 기다리고 있는 책은 출판사 카페에서 연재했던 김연수 작가의 '소설가의 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른 나와주었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이 가을에 이들의 에세이를 다 읽을 수 있다면,
정말이지. 가는 세월.. 빠르다고 탓하지 않을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