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절하게 참 철없이 - 2009 제11회 백석문학상 수상작 ㅣ 창비시선 283
안도현 지음 / 창비 / 2008년 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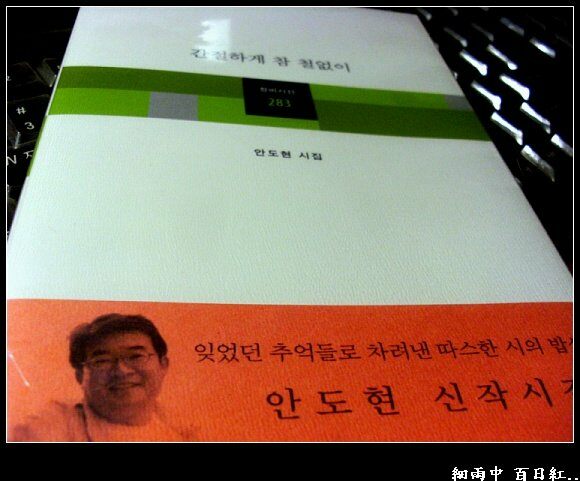
몇몇 이웃님들이 말씀하시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가 있다면,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움이라고 하신 게 생각난다. 특히나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과 넘치는 감성을 설명해 뭣하랴. 때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선의 대혼란기(?)처럼 가을이, 청명한 하늘이, 스산한 듯 이는 바람이 사람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다, 는 불평의 소리 또한 없지 않지만, 그마저도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이 귀엣말을 하는 것 마냥 혹은 수북이 쌓인 낙엽 위를 걸을 때만 만끽할 수 있는 아련하면서도 아릿한, 그런 기분 좋은 속삭임마냥 사람들은 예의 그 사치스러운 불평을 즐기며 만끽하는 게 아닌가 싶다.
나에게 가을이란 어떤 의미일까.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 이것 하나만은 명징하게 말해주는 셈이다. 내가 아직까지도 설익은 독자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 같다고 할까. 봄에는 너무 싱그러워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라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기피하고 등한시한 시를 가을이 가까워지면서부터 그리워하는 까닭이다. 앞으로도 여전히 설익은 독자래도 매해 깊어가는 가을마다 시 한 수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 같다고, 다시금 얼치기 같은 핑계를 내뱉어본다.
*
『간절하게 참 철없이』는 시집이다(?). 그렇다고 시집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지난 시간들 속에 여기저기 너부러져있는 기억들을 아주 촘촘한 그물로 한데 그러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안도현의 이 시집은 그보다 더 디테일한 무엇이다. 가령, 어린 날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뛰어다니다가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간 아이가 방에 들어서면서 마주하게 되는 군침 도는 점심밥상 같다고 할까. 그보다 점심밥상 위를 살포시 감싸고 있는 ‘밥보(밥보자기)’를 보면서 온갖 맛있는 상상에 빠져들 수 있는 잠시잠깐의 숨고르기 같다고 할까. 시라는 진수성찬을 살포시 덮고 있는 ‘시보’를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들춰내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된 듯했다.
저녁 먹기 직전인데 마당이 왁자지껄하다
문 열어보니 빗줄기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있다
둥근 투구를 쓴 군사들의 발소리가 마치 빗소리 같다
부엌에서 밥 끓는 냄새가 툇마루로 기어올라온다
왜 빗소리는 와서 저녁을 이리도 걸게 한상 차렸는가
나는 빗소리가 섭섭하지 않게 마당 쪽으로 오래 귀를 열어둔다
그리고 낮에 본 무릎 꺾인 어린 방아깨비의 안부를 궁금해한다
∥「빗소리」_ p21∥
눈을 감고 오래도록 상상해본다. 아주 어린 날, 여름방학을 맞아 찾아간 외가에서 때 아닌 ‘백만대군’이 쳐들어와 마루에 하염없이 걸터앉아 심심함에 몸서리치던 때를 기억 아니 상상해본다. 비의 장막이 쳐지고 밥 짓는 냄새가 알싸하게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마당 쪽인지, 비의 장막 너머 아련한 산이며 논이며 밭의 풍경 쪽인지, 이도저도 아닌 아예 부엌 쪽으로 코만 뻐끔하게 열어뒀는지 모른다. 방아깨비의 안부보다 낮 동안 비닐하우스 안에서 성글게 익어가는 참외의 달달한 맛이 궁금했었는지도 모른다.
외할머니가 살점을 납작납작하게 썰어 말리고 있다
내입에 넣어 씹어먹기 좋을 만큼 가지런해서 슬프다
가을볕이 살점 위에 감미료를 편편(片片) 뿌리고 있다
몸에 남은 물기를 꼭 짜버리고
이레 만에 외할머니는 꼬들꼬들해졌다
그해 가을 나는 외갓집 고방에서 귀뚜라미가 되어 글썽글썽 울었다.
∥「무말랭이」_ p45∥
무말랭이라는 말을 언제 처음 ‘알아’듣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보다 여전히 나는 오그락지, 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시인처럼 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그락지’를 보며 눈물 글썽일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집에 일 년 내내 빠지지 않고 항상 냉장고에서 제 맛으로 익어가는 것, 늘 밥상 위에 올라 나를 폭식하도록 꾀어내는 반찬이 바로 오그락지다. 엄마는 나 때문에 다른 식구들은 그다지 즐겨하지 않는 오그락지를 일 년 내내 마련하신다. 꼭 무를 직접 썰어 베란다 화초들 사이에 잘 말려낸 탓인지 아직은, 시인처럼 슬프지 않고 향긋한 맛이라 더없이 행복하다.
태평추는 채로 썬 묵에다 뜨끈한 멸치국물 육수를 붓고 볶은 돼지고기와 묵은지와 김가루와 깨소금을 얹어 숟가락으로 훌훌 떠먹는 음식인데 눈 많이 오는 추운 날 점심때쯤 먹으면 더할 수 없이 맛이 좋았다 입가에 묻은 김가루를 혀끝으로 떼어먹으며 한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며 갯내를 혼자 상상해본 것도 그 수더분하고 매끄러운 음식을 먹을 때였다
∥「예천 태평추」부문_ p59∥
예천에 가본 적도 그곳에서 태평추를 먹어본 적도 없다. 하지만 일명 ‘묵국’이라고 불리는 음식이 대구에도 있다. 태평추처럼 ‘뜨끈한 멸치국물 육수’에 ‘묵은지와 김가루와 깨소금을 얹어 숟가락으로 훌훌 떠먹는 음식’을, ‘볶은 돼지고기’는 없지만 아무렴 어떨 묵국을 종종 먹는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 옆 서문시장에 즐비한 일명 ‘할매 포장마차’에서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난다. 얼마 전 추석 때도 큰고모가 묵을 손수 해 오셔서 성큼성큼 잘라 푸짐하게 먹었던 게 아직도 선명하다. 밥까지 말아먹어서 그런지 내게는 ‘갯내’보다 ‘논내’며 ‘상수리숲내’가 더 짙게 남아 있다. 물론 ‘수더분하고 매끄’럽게.
어릴 때,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 반가운 말은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돼지고기 두어 근 끊어왔다는 말
정육점에서 돈 주고 사온 것이지마는 칼을 잡고 손수 베어온 것도 아니고 잘라온 것도 아닌데
신문지에 둘둘 말린 그것을 어머니 앞에 툭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한마디, 고기 좀 끊어왔다는 말
가장으로서의 자랑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애정이나 연민 따위 더더구나 아니고 다만 반갑고 고독하고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같아서 좋았던, 그 말
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이웃에 고기 볶는 냄새 퍼져나가 좋을 거 없다, 어머니는 연탄불에 고기를 뒤적이며 말했지
그래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방문을 꼭꼭 닫고 볶은 돼지고기를 씹으며 입 안에 기름 한입 고이던 밤
∥「돼지고기 두어 근 끊어왔다는 말」_ p62∥
어린 날, 세 들어 살았을 적에, 엄마가 ‘고기 볶는 냄새 퍼져나가 좋을 거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다고 아빠가 ‘고기 좀 끊어왔다는 말’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다만, 종종 ‘신문지에 둘둘 말린 그것을’ 아빠도 엄마도 종종 들고 왔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런 날, 내가 좋아했었는지 어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적어도 작은 방안이 어딘지 모르게 따숩고 정겨웠던 환했었던 것 같은 느낌은 여전하다. 그것이 아빠 혹은 엄마의 ‘반갑고 고독하고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처럼 느끼기엔 난 너무 어렸었다.
한 3분쯤 마당귀 두드리다 가는 빗소리 데리고 살까
까치발, 까치발로 크는 상사화 옆에 살까
풀어놓은 다람쥐 불러들여 도토리 던져주며 살까
땅에다 혼자 혀를 박고 있는 삽 한 자루 되어 살까
짐승의 발소리 하르르 알아맞히는 고사리 되어 살까
∥「허기」_ p79∥
어쩌면 아무리 진수성찬의 밥상 앞에 만날 삼시세끼 잘 챙겨먹는다고 한들, 삶의 허기까지 채워질까. 물론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나, 대개가 물질문명의 병폐니 어찌나 하는 시시껄렁한 소리로 위안을 삼지 않더라도 그 허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안다. 그 무엇이란 조금은 두려운 마음일지도 모른다. 또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은 탓에 부대끼지 못해 이미 쇠약해져버린 오성에 대한 슬픔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삶의 허기를 오롯이 만족할 만큼 채우거나 대체할 순 없다하더라도 조금은 살살 달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
『인생은 지나간다』에서 구효서가 추억의 통로로 삼은 것은 사물이었다. 그 사물들 중에는 이미 ‘지나간 것’도 있었으며 다분히 아직도 ‘지나가는 것’도 있었다. 신기한 것은 아직 실체가 없는, 미래의 사물 또한 ‘지나간 것’ 혹은 ‘지나가는 것’의 익숙한 것을 통해 그 낯설음을 상쇄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도현은 아주 상다리 으스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음식을 차렸다. 추억의 통로임과 동시에 지난 생을 반추하고, 지금 지나고 있는 생을 잠시 쥐어본다. 그리곤 지금을 찬찬히 돌이켜 보면서 허기진 삶을 배불리 먹이고픈, 시인 홀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런 욕심쯤을 거뜬하게 부리는 듯하다.
덧붙여, 이젠 배곯을 시절도 아니고 그런 처지도 아니지마는 어쩐지 이 시집을 보노라면 허기가 지는 듯하다. 그 허기란 끼니를 챙겨먹지 못한 배고픔 따위가 아니라 잃은 것, 잊은 것에 대한 애달픔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 천진하리만치 단순하고 해맑았던 내 미각에 대한 그리움 같기도 하다. 시인이 이렇듯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는데, 눈으로 우걱우걱 먹는 일만 했음에도 여전히 허기가 지는 건 왜 일까. 숭늉 대신 비저 나오려는 눈물인지 콧물인지를 훌쩍 삼켜보는 서글픔이어라. 그런 밤이어라.
《이 시집에 나오는 그물로 낚고픈 자글거리는 햇살 같은 말》
욜랑욜랑, 우묵하게, 나박나박, 도닥도닥, 오슬오슬, 싸리울, 허청허청, 오글오글, 하르르, 차랑차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