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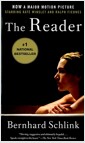
-
The Reader (Paperback, Media Tie In) - Vintage International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음, Janeway, Carol Brown 옮김 / Vintage Books / 2008년 12월
평점 :

절판

먼저 그냥, 영화로 봤다.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면 봤는데 탄탄하지만 그저 러브스토리일 뿐인가 보다 하면서 봤었다. 하지만 한나가 재판을 받는 이야기부터 (그녀가 문맹임이 그때 드러난다) 나는 긴장하며 보기 시작했다.
그 전날 나는 키에슬로브스키의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을 봤다. 영화 속 두 베로니카의 출생연도인 1966년은 내가 출생한 해이기도 하다.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지만 친구가 붙여준 나의 별칭이 베로니카이기도 해서 그 영화는 내게 매우 특별했다. 전혀 다른 곳에 사는 닮은 꼴의 두 베로니카. 물론 나는 그들과 매우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해에 태어난 또다른 베로니카이기도 한 나에게 영화는 아지 못할 곳에서 온 메시지처럼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이 영화와 '더 리더'는 물론 아무 연관도 없다. 그저 비슷한 시기에 내가 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우연히도 한나 슈미츠가 전범 재판을 받은 해도 1966년이었다. 난 내가 태어난 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다. 사람들의 생은, 심지어는 영화나 책 속 사람들의 생도 서로 무관한 듯 얽힌다.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이다. 우연이 의미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건 키에슬로브스키도 베로니카를 연기한 배우들도 베른하르트도 나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거나 못할 것이다. 그냥 지구 한 모퉁이에서 남들은 관심도 없는 생의 우연에 무슨 의미라도 있는 걸까 궁금해 하는 어떤 여인이 있을 뿐이다. 평범하게 태어나 살고 있는, 그러다 어느 날 찔레꽃처럼 무심하게 우주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갈 한 여자는 그렇게 두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태어난 해에 대한 생각에 잠겨보았다.
아무튼, 연속으로 본 영화 속의 1966이란 숫자 덕인지 나는 한나 슈미츠에게 금방 감정이입이 되었다. 문맹은 자존심이 높은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죄를 뒤집어쓰는 한이 있더라도 밝히고 싶지 않은 치부였다. 세상에서 그녀의 문맹을 '눈치챈' 유일한 사람이 미하엘이었는데 한나와 미하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뷰파인더는 남들의 내면을 그리 깊게 들여다 볼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난 서툴고 무뚝뚝한 눈빛과 말빛으로 그 사람을 짐작해야 할 뿐이다. 소설 속 인물들에게 카메라를 얼마나 깊숙하게 들이미는가 하는 것은 소설가의 서술방식에 달렸겠지만이 소설은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얼핏, 한나는 미하엘을 사랑한 걸까, 미하엘은 소년 시절 이후에도 계속 한나를 사랑한 걸까, 의문이 든다. 그건 그들의 방식일 뿐이었다.
그들이 사랑하는 그 느낌과 방식은 심상했다. 세상의 다양한 사랑에 별 관심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든 미하엘이 한나에게 책 읽은 테잎을 보내는 장면부터 나는 모든 신경을 세우고 영화를 보았다. 책을 읽어 보니 그 장면이 그렇게 민감하게 그려진 것은 원작의 힘이기도 했다. 사랑의 힘이 글을 읽게도 하고 춤을 추게도 하고 거지를 왕자로 거듭나게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이 보아왔다.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 사랑을 말하고 있는 소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글을 깨쳐가는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가 아닌, 빛이 환하게 눈앞에서 터지는 각성의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목소리로 듣는 책의 그 환희로운 느낌, 그걸 넘어서 듣고, 책에서 그 단어를 찾아 하나씩 글자를 익혀가는 과정은 퍼즐을 맞추듯 신기하고 신비롭다.
나는 교사다. 나는 그러한 빛나는 소통과 각성의 순간들을 조금은 안다. 그런 순간들을 아이들과 주고받고 싶다.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는지도 모른다. 홀로코스트의 치죄나 사랑에 대해 집중하지 못한 것은 내 방식이다. 어쨌거나 참으로 감동적인 반년의 독서였다. 외국어로도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음에 대해서도 또한 원작자에게 감사한다.
생각해 보니 영화를 통한 관심 때문에 원서로 된 책을 사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읽어가는 과정은 어쩌면 한나가 글자를 익혀가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사랑이란, 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이기도 하다. 나는 마치 앓듯이 어딘가에 몰입하고 사로잡히는 이런 기분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서 책을 덮는 날, 모르는 단어가 형광펜으로 가득 뒤덮여 있던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슬펐던 건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