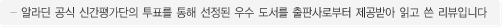[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 - 두번째 무라카미 라디오 ㅣ 무라카미 라디오 2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권남희 옮김, 오하시 아유미 그림 / 비채 / 2012년 6월
평점 :



하루키의 에세이집을 읽을 때마다 늘 습관처럼 드는 생각이 있다. ‘이걸 대체 내가 왜 읽고 있을까?’ 절대로 하루키의 책들이 나쁘다거나 읽을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굳이 하루키의 팬을 자처하기 어려운 내가 진정 경애해 마지않는 어떤 작가의 책보다도 의무적으로, 빠짐없이 찾아서 읽게 되는 이 습관의 연유를 되묻는 것이다. 하루키 본인도 책에서 ‘아무런 메시지도 없다. 흐물거리기나 하고 사상성도 없고 종이 낭비다’(34)라는 비판을 받을 때도 있다고 고백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굳이 안 읽어도 그만인, 사는데 지장 없을, 그렇다고 미친듯한 흡인력으로 시간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도 아닌 이 에세이들을 꾸역꾸역 찾아서 읽는 것은 독서에 게으른 나로서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런 일개 독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하루키는 맨 마지막 글에서 다음과 같은 꽤 그럴싸한 변명 아닌 변명을 슬며시 내놓는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정말로 슬펐던 적이 몇 번 있다. 겪으면서 여기저기 몸의 구조가 변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상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기에 뭔가 특별한 음악이 있었다, 라고 할까, 그때마다 그 장소에서 나는 뭔가 특별한 음악을 필요로 했다. … 음악은 그때 어쩌다보니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걸 무심히 집어 들어 보이지 않는 옷으로 몸에 걸쳤다.
사람은 때로 안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음악에 실어 그것의 무게로 제 자신이 낱낱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음악에는 그런 실용적인 기능이 있다.
소설에도 역시 같은 기능이 있다. 마음속 고통이나 슬픔은 개인적이고 고립된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더욱 깊은 곳에서 누군가와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공통의 넓은 풍경 속에 슬며시 끼워넣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소설은 가르쳐준다.
내가 쓴 글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219)
그가 말하는 소설은 아니지만 그의 에세이에서 확실히 나는 뭔가 위안과 희망 비슷한 것을 줄곧 얻어온 듯하다. 현실적으로야 유명 작가와 독자라는 넘사벽의 차이가 있지만, 왠지 책을 읽는 동안에는 하루키처럼 혼자 글 쓰고 번역하고 달리고 맥주 마시고 음악 듣고 여기저기 여행하며 사는 인생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 꽤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에 대한 무지막지 버거운 부담을 슬쩍 내려놓고 막연히 내가 바라는 이상향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려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러자면 ‘정녕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테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평소 나도 모르게 꽉 조였던 마음의 끈을 잠시나마 느슨히 풀고 모처럼 쉬는 기분이 드는 건 분명 사실이다. 이렇듯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평범한 독자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안을 준다는 점이 하루키의 단연코 특출난 매력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