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미국 생활의 자명한 진리 중 하나를 깨닫게 됐다. 일단 인기를 얻으면 어디서나 그 사람을 찾는다. 미국 문화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늘 무시된다.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되기 일쑤다. 발행인, 잡지 편집자, 제작자, 갤러리 주인, 에이전트들을 설득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람은 낙오자로 취급될 뿐이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각자 찾아내야 하지만, 그 누구도 성공을 이룰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다. 명성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더라도, 자기 판단만 믿고 무명의 인물에게 지원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무명은 대부분 계속 무명으로 남는다. 그러다가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온다. 행운의 밝은 빛에 휩싸인 후로는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반드시 써야 할 인물이 된다. 이제 모두 그 사람만 찾는다. 모두 그 사람에게 전화한다. 성공이ㅡ 후광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 생활의 자명한 진리 중 하나를 깨닫게 됐다. 일단 인기를 얻으면 어디서나 그 사람을 찾는다. 미국 문화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늘 무시된다.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되기 일쑤다. 발행인, 잡지 편집자, 제작자, 갤러리 주인, 에이전트들을 설득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람은 낙오자로 취급될 뿐이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각자 찾아내야 하지만, 그 누구도 성공을 이룰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다. 명성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더라도, 자기 판단만 믿고 무명의 인물에게 지원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무명은 대부분 계속 무명으로 남는다. 그러다가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온다. 행운의 밝은 빛에 휩싸인 후로는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반드시 써야 할 인물이 된다. 이제 모두 그 사람만 찾는다. 모두 그 사람에게 전화한다. 성공이ㅡ 후광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빅 픽처 - 더글러스 케네디
더글러스 케네디의 <빅 픽처>에는 두고 볼 포인트들이 꽤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공, 미디어, 인기, 타이밍' 에 대한 이야기. 사진작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게리가 몬태나에 머물면서 신문사 사진부장인 앤을 사귀게 되고, 앤의 별장이 있는 숲 속 깊은 오두막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산불의 한 복판에 놓여지게 된다. 몬태나 지역의 아름다운 산, 자연경관, 국립공원이 있는 곳으로,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그 와중에 게리는 소위 '사진 한 장으로 백마디 말을 하는' 그런 사진을 찍게 된다.
신탁 담당 변호사 시절의 벤과 사진가인 게리는 같은 사람이다. 그의 사진이 며칠만에 대단히 나아질 리 없다. 물론 그가 변호사에서 아마추어 사진가로의 옷을 갈아 입으면서 힘을 뺐을 수도 있고, 책에도 나오듯이 사진가, 화가, 소설가 등의 예술가들의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몬태나' 의 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아마추어 사진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가로, 타임지를 비롯한 전 세계의 유명한 언론에서 그의 사진을 찾고, 그를 찾게 만든 것은 바로 산불이 난 그 장소에 있었던 타이밍.이었고, 그 장소에서 어린 소방관을 잃은 소방대장의 절규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으로 그는 '누구나 찾는 사람'이 된다. '후광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알아보게 하는 것은 실력보다는 타이밍. 운. 이라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알아보게 하는 것은 실력보다는 타이밍. 운. 이라는 이야기.
물론 그건 실력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타이밍 + 운'
미국에서는 '타이밍', 프랑스에서는 어느정도 '실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연줄, 빽, 인맥, 돈, ...

에밀 아자르 <그로칼랭>
1974년 초, 먼저 갈리마르 출판사, 그 다음에는 메르퀴르 드 프랑스 출판사의 편집자들과 전문 원고 검토자들은 정체를 알 수 없지만(그 때문에 이미 조금 의심을 사고 있었다) 대단한 재능이 있는 (레몽 크노는 그 점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미 자리를 잡은 작가, 한마디로 '성가신 인물'의 계획임을 알아차렸다고 독서 노트에 썼다) 젊은 작가, 어쨌든 에밀 아자르라는 작가의 첫 원고인 <그로칼랭>을 검토한다. <그로칼랭>은 미셸 쿠르노와 시몬 갈리마르의 열광적인 반응 덕분에 그해 가을 메르퀴르 드 프랑스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그후 비평가와 독자들이 그 새로운 목소리에 열광하면서 성공을 거둔다.
<그로칼랭> 머리말中
로맹 가리가 에밀 아자르의 이름으로 낸 첫 소설 <그로칼랭>은 '비단뱀' 파리에 사는 서른 일곱 노총각과 2미터 20센티미터가 넘는 비단뱀과의 동거 이야기이다. 독특한 소재에 감각적인 글이다. 머리말에 따르면, '임신중절 논란에 대한 비판' 이라고도 하니, 새롭고, 재미있고, 의미있고, 테크닉 뛰어난 그런 소설인가보다고 짐작하고, 한 장 한 장 읽을때마다 그 짐작을 굳혀가고 있다.
그렇게 로맹 가리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 '에밀 아자르'로 또 한 번 자신을 인정 받는다.... 천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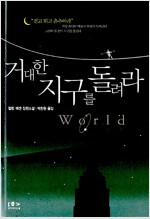
그는 그 줄 타던 남자가 분명 제법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했을거라 생각했다. 그냥 즉흥적인 줄타기는 아니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떨어졌다면 글쎄, 그가 떨어졌다면, 하지만 그가 살아남는다면 그는 하나의 기념비가 된다. 돌에 새겨지고 놋쇠에 둘러싸인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욕이 섞인 감탄사와 함께 "도대체 믿어져?"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뉴욕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다. 뉴욕 사람들의 문장에는 항상 욕설이 섞여 있다. 소더버그는 나쁜 언어 습관을 좋아하지 않지만 적절한 때에는 거기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잇었다. 줄을 타는 남자, 공중 110층에서, 이런 지랄 염병 도대체 믿어져?
컬럼 매켄 <거대한 지구를 돌려라> 中
컬럼 매켄에 나오는 솔로몬 판사 (주인공 이름이 솔로몬 소더버그야. 흐) 의 챕터에 나오는 독백이다.
위의 가리가 천재는 천재였으니,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도 다들 알아 보았던 거겠지. <그로칼랭>을 읽으면서, 거창한 머리말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내가 읽는 책 중 '욕설을 섞을만한 가치가 있는' 천재의 책은 바로

 존 파울즈 <마법사 Magus>
존 파울즈 <마법사 Magus>
기묘한 노인 콘키스 등장. 주인공이자 화자인 니콜라스 어프와 대조적인 콘키스는 조르바의 두목과 조르바를 연상시킨다. (그러니깐, 초반을 읽는 느낌은 그렇다. 이질적이면서도 끈끈한 관계가 말이다.)
그의 영어는 훌륭하긴 했지만 어쩐지 현재 영어가 아닌, 오랫동안 영국에서 살지 않은 사람의 영어에 더 가까웠다. 또 그의 전체적인 모습도 이국적이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피카소와 먼 친척 간인 것 같았다. 그는 원숭이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명력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것을 버리고 수십 년을 햇빛 속에서 살아온, 순수한 지중해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원숭이처럼 교활하고 여왕벌처럼 권위를 지닌 듯한 그는 천성에 의해서만큼이나 자신의 선택과 수련에 의해 강렬한 모습을 갖게 된 것 같았다. 그는 옷차림에서 멋을 부린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도 또 다른 종류의 나르시시즘이 있었다.
존 파울즈 <마법사>中
두툼한 두 권의 책의 이제 150여쪽을 읽었을 뿐이지만, 존 파울즈가 그려내는 그리스와 인물들에 감탄에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고 있다. 첫등장하는 콘키스에 대한 묘사를 읽으며, 이미 작가가 그려준 생생한 배경 속에 생생한 인물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시발, 진짜 잘 쓰네
-> 욕을 그대로 쓸 수 없을때 쓰는 몇가지 영어 'Shoot' , 'Shut the Front door'... 막상 쓰려니깐 생각이 안 나 'ㅅ'
-> 내가 우리말에서 '시발'을 대체하는 몇 가지는 '쉬발', '시퐁', 'ㅅㅂ' ... 이것도 더 생각 안 나네.
뭐, 그렇다고.
아.. 근데, 이 페이퍼 왜 '시발'로 마무리 되는거지? orz
술 땡긴다. 비 더 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