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과 세계 ㅣ 살림지식총서 85
강유원 지음 / 살림 / 2004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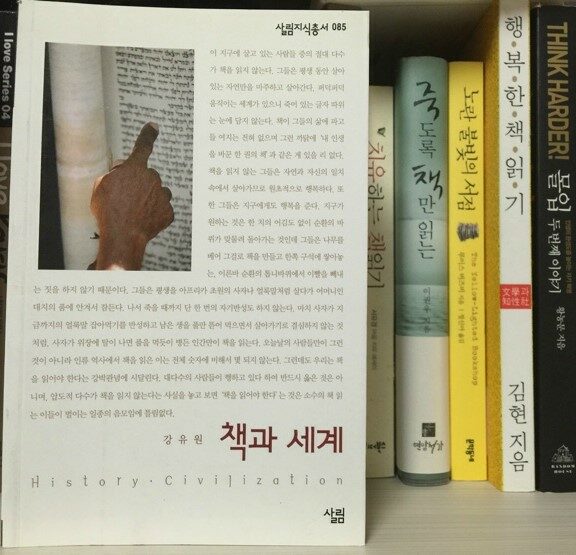
책과 세계 - 강유원, 살림(2004)
살림지식총서 085
가족 모두를 괴롭히던 감기가 사그라졌다. 어른들은 거의 나았고 아이들은 약간의 감기 불씨가 남았지만 그럼에도 예배가 끝나자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며 오후까지 놀았다. 덕분에 꽃잎이 날리는 모습을 오늘은 오래도록 볼 수 있었다. 책을 들고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그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좋았다.
책이라는 텍스트를 늘 지니고 있어도 좋겠지만 이런 유형의 텍스트가 아닌 무형의 텍스트가 모두에게 있으니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공중으로 떠다니고 흩어지는 것들이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니 말이다.
사실 어느 이웃분이 감기 걸렸다고 하니 즐거운 책을 읽으라고 처방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책장을 쭉 훑어보다가 피식 웃어버렸다. 그런 책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손길이 가는 책은 대부분 인문쪽이거나 우울하다고 할 수 있는 책들이었다. 발랄하다고 생각하는 김애란 작가의 책등도 있었지만 결국 손이 간 책이 「책과 세계」였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책은 즐겁기보다는 진지하다. 서론이 길었는데 각설하고 간단하게나마 이 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
살림지식총서 대부분의 책이 얇고 가격도 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아주 진득하다. 얇으니 대략적이며 입문하기 좋고 다른 쪽으로 의식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준다. 이 책 또한 고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저자의 의도이기도 했다. 훌륭하다. 저자의 의도가 성공했으니까. 그럼에도 저자의 말처럼 버려둘 수 없는 책이었다.
>> 나는 이 책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다. 하나는 고전에 대한 자극을 주면서 그것들로 직접 다가가는 길을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그 책들을 읽기 전에 미리 그 책들이 어떻게 서로 이어져 있고 대화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이든지 이루어진다면, 이 책은 불필요해진다. 결국 이 책은 잊혀지고 버려지기 위해 쓰여진 셈이다.
>> 관심사와 연구계획은
인간의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 세계가 만나는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색하고 정리하여, 가능하다면 그 오고감과 산물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철학은 객관세계를 잊은 채 공상에 몰두하고, 자연과학은 인간을 내버려둔 채 물신숭배에 빠져, 그 둘이 도저히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해볼 작정이다.
- 책날개에서 발췌.
이론적으로 체계화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저자라면 가능할 거 같다. 저자의 저서를 찾아보니 인문학, 철학, 고전 쪽으로 책을 내고 번역했음을 알았다. 어떻게 풀어가는지 조금씩 만나봐야겠다. 무언가를 정의하기 위해 고심해본 적이 있다면 그 사고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알 것이다. 몰입의 즐거움과 결과는 색다른 희열을 안겨준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고 흩어진 사고들이 이어지는 경험을 했다거나 한 단계 성숙해진 나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물론 이 책을 읽고 그런 희열을 느끼진 못했지만 생각해본 적 없는 시선을 발견해서 좋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대세계의 텍스트들은 본래 기억에 의지하여 암송되어 전해지다가, 진흙판, 금속 그릇, 거북 등껍질, 죽간, 파피루스 등에 기록된 것들이다. 그것들을 기록한 매체가 대중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아무리 고대세계의 텍스트들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텍스트들의 유통은 근본적으로 지배계급-사회의 상층 일반이기보다는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과 부를 지닌 집단-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쪽)
역사가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 않던가. 역사학자들이 새롭게 찾아내 조금씩 달라지는 세계사 등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텍스트 자체를 두고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추론하고 추적하는 것은 독자 대부분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의 어느 한 조각(혹은 조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뼈저리게 느낀 순간! 그 틀에서 우린 벗어날 수 있다. 아니 의식이 벗어나도록 다른 틈을 찾게 되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마키아벨리 역시 본질적으로 궁정 지식인이었다. 그 역시 지배자를 위한 이념과 실천 지침서, 즉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그였다. 그러나 그는 전원에 파묻혀 고요한 질서를 찬양하는 비현실적 궁정 지식인이 아니라, 분열과 반목, 침략과 방어라는 날것의 현장에서 동분서주했던 서기관이었다. 그의 텍스트들은 역사적 현실이라는 컨텍스트에 너무나 철저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그에 대한 텍스트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이다. (64쪽)
일반적인 혹은 상식적인 시선과는 확실하게 달랐다. 고전이 왜 고전일 수밖에 없는지는 읽어봐야 아는 일이지만 그 고전의 배경이나 시대상까지 알고 읽으면 더 풍부함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몰랐던 이야기들을 저자는 들려준다. 대략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 이 책을 펼치면 좋을 거 같다. 특히나 서양철학과 중세, 르네상스 시기의 책을 읽을 계획인 독자라면 먼저 이 책을 읽거나 함께 읽기를 추천한다. 책과 세계,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해 잠시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읽을 계획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늦추고 있다. 이 책을 만나며 다시 한 번 빨리 읽고 싶어졌다. 즉흥적으로 읽는 책도 있지만 때를 기다리는 책이 있으니 내게 아퀴나스의 책이 후자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에필로그를 남기며 이 책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파우스트』의 한 구절처럼 '모든 이론은 잿빛'이어서 이론은 현실에 맞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이론적 파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론적 파악의 출발점인 읽기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그것이 극단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대응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고전이 보여주는 자아들을 자기 몸에 넣어보고, 다시 빠져나와보고, 다시 또 다른 것을 넣어보고, 또다시 빠져나와본 다음에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질 자아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예 텍스트를 손에 잡지 말아야 하는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실.
(92~93쪽. 에필로그 부분 발췌)
■간단 서평: 인문학이나 고전 입문서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조금이라도 읽고 그것들과의 접점을 찾거나 새로운 시각에 눈 뜰 독자에게 추천하는 책.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 :)
『파우스트』의 한 구절처럼 `모든 이론은 잿빛`이어서 이론은 현실에 맞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이론적 파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론적 파악의 출발점인 읽기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그것이 극단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대응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고전이 보여주는 자아들을 자기 몸에 넣어보고, 다시 빠져나와보고, 다시 또 다른 것을 넣어보고, 또다시 빠져나와본 다음에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질 자아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예 텍스트를 손에 잡지 말아야 하는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실.
(92~93쪽. 에필로그 부분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