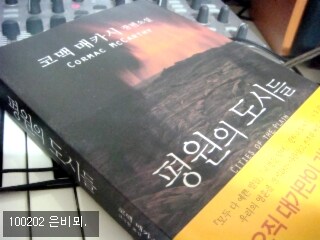-

-
평원의 도시들
코맥 매카시 지음, 김시현 옮김 / 민음사 / 200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국경을 넘어>에 몰입해 읽고 나자 마지막 3부 <평원의 도시들>이 더욱 궁금했다. 물론 전작들을 읽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차례대로 읽는 게 아무래도 각 인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특히나 이 책에서는 1부 <모두 다 예쁜 말들>의 존과 2부 <국경을 넘어>의 빌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목장에서 일한다. 빌리가 더 친근했지만, 존이라는 인물 때문에 1부를 찾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형제처럼 지내며 일하는 이들의 앞에 여지없이 작가는 시련을 또 안겨준다.
마지막 정거장답게 어릴 때 겪은 일들로 이들은 각자의 성격형성을 한 채 어른이 되었다. 우리는 이를 성장이라고 부른다. 빌리는 상처를 많이 겪었지만 덤덤하고 조금은 냉소적인 성격이 되었다. 그런 그 앞에 존이라는 인물은 제법 흥미롭다. 우선 대조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그런데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다고 할까. 존은 창녀 막달리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와 결혼을 꿈꾼다. 물론 막달리나의 마음도 같지만, 이들 사이에 포주라는 악독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서 역시 순탄치 않다. 정해진 비극처럼 이들의 사랑은 핑크빛보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읽는 내내 그들의 앞날이 걱정되었다.
상처와 죽음은 삶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인가 보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겠지만, 우리가 성장할수록 더욱 그렇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도시 엘페소란 곳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에게 삶이란 풍요롭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감내해내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포주와의 한판승 그리고 존의 죽음으로 빌리와 존의 두드러진 대조는 더욱 극명해졌다. 존은 사랑을 꿈꾸었고 죽음으로 완성했다. 사랑을 잃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동시에 사랑을 향해 나아가버린 것이다. 과연 빌리라면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동생의 죽음을 겪고 난 빌리는 형제처럼 지내던 존의 죽음까지 겪게 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은 게 내 추측이다. 아무리 냉소적이더라도 그는 어떻게든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을까. 빌리는 죽음을 목격하는 저승사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그의 비참한 감정이나 슬픔은 앞으로도 느낄 것이다.
삶의 수레바퀴는 끝이 없다. 죽어서야 멈추지만 밟고 지나는 길은 언제나 같지 않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삶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보다 무게감에 비중을 둔 작가 코맥 매카시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좋은 본보기가 이 책이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도 한없이 우울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대신 그럼에도 살아가야겠다는 묘한 희망감이 나를 엄습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작가의 역량인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