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꿀벌의 집
가토 유키코 지음, 박재현 옮김 / 아우름(Aurum) / 2009년 4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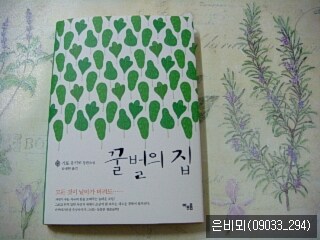
선명한 초록색이 예쁜 디자인의 책 <꿀벌의 집>은 낯선 작가의 책이다. 가토 유키코는 농학부를 졸업하고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자연주의자라는 작가의 책에서는 자연의 상쾌함과 위대함이 느껴진다. 곳곳에 등장하는 도시와 대비되는 모습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연의 품으로 뛰어가고 싶게 유혹한다. 자연은 거대하지만, 또한 소소하다. 그래서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주인공 리에는 동거하던 남자 친구의 떠남과 엄마와의 다툼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는다. 20대 초반의 그녀는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와의 갈등을 안고 있는 평범한 도시처녀였다. 그러다 거처까지 해결되는 일자리를 찾아 꿀벌의 집으로 오게 된다. 도시에서만 살던 그녀가 처음 만난 풍경은 자칫 지루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예쁜 꽃과 양봉이라는 낯선 세계와 그곳의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낀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듯 구성원들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는 듯 보이지만 누구도 선뜻 말해주지 않으며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꿀벌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되어 제법 끈끈한 유대를 유지한다.
20대 중반, 나도 낯선 곳에서 직장생활을 했었다. 리에처럼 혼자 도시에서 먼 지방으로 갔고 표준어를 사용하는 나는 어딜 가나 어디서 왔느냐는 말을 듣고는 했다. 그리고 재미있는 직장인들을 만났고 일에 치여 정신없이 보냈었다. 돌아보면 피곤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리에도 점차 일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도 익숙해진다. 도시에 있는 어머니와도 관계가 개선되는데 이 소설은 신기하게 물 흐르듯 모든 이야기가 진행된다.
잔잔해서 파도 같은 일렁임이 없는 진행이다. 자연과 더불어 그 안에서 성장하는 리에의 모습만이 그려지는데 그렇다고 지루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편안했다. 작가의 자연주의가 잘 깃든 다른 소설도 읽고 싶어질 만큼 말이다. 구체적인 언급과 해석도 없고 꿀벌의 집에서 일하는 모습만 있다. 하다못해 리에의 사랑 이야기조차 정말 간소하게 그린다. 모든 걸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버렸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심심한 책은 아니다.
자연과 치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 느꼈었다. 리에처럼 대부분의 도시인은 상처받거나 지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한다. 마음을 어루만질 곳으로. 그곳은 바로 자연의 품이다. 비둘기의 귀소본능처럼 우리도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기에 바라만 보아도 머리가 맑아진다. 자연을 가까이서 들여다 보면 우리네 삶과 연결된 아픔보다는 평화로운 마음을 먼저 얻게 된다. 이렇게나 다채로운 자연도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살고자, 삶에 대한 열의로 치열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군림하거나 뻐기기 위함이 아니니까.
사람과 꿀벌의 교집합은 무엇일까. 집단생활이 아닐까 싶다. 서로 이용하고(ㅡ여기서의 이용은 나쁜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이다.) 일정한 체계가 있으며 누군가는 일하고, 싸우고, 알을 낳는다. 하나의 큰 공간에서 살지만 개개인의 속성이 다르다. 다만, 사람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있으며 원하면 얼마든 바꿀 수 있다. 일벌은 죽을 때까지 일벌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절대로 그래. 사람의 일생이란 말이지, 땅속에서 솟아나온 물이 구불구불 흘러서 마침내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 흐름을 도중에서 의식적으로 멈추려 하다니……, 어떤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야.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23-124. 조지가 리에에게 하는 말.)
자연스런 흐름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이유를 타인이 다 이해하기란 어렵다. 나조차도 가끔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때 모든 것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으며 속도의 조절을 가끔은 더디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연처럼 서서히 그러나 부단하게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지친 내게 필요한 것이었다.
소설에는 절정이 있다고 학창시절에 배웠지만 <꿀벌의 집>처럼 절정이 없어도 기억에 남는 소설도 있다. 문학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마음 한구석을 잔잔히 채워서 만족한다.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같은 느낌이다. 얇고 평이한 전개로 가독성이 좋아 오래도록 붙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연과 상처에 대해 돌아본 시간은 읽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았다. 양봉처럼 우리도 달콤한 꿀을 얻으려면 마음을 잘 가꿔야겠다. 지나가는 상처에 깨지거나 조각나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