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 오랜만에 맑고 쾌청함
오늘의 책 : 라 트라비아타 살인사건. 사라진 수녀
귀도 브루네티 시리즈의 일부분인 두 권인데 추리소설이라기보다 진지한 형사물에 가깝다. 추리소설과 형사물의 차이가 뭐냐고 한다면 당근 주인공이 탐정이냐 형사냐다. 아마추어이든 프로든 탐정이 등장한다면 추리물이지만 형사가 등장하면 아무리 추리를 잘해도 추리소설이라기보다 형사물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형사가 등장하면 대부분의 경우 범인만큼이나 관료체계가 중요해진다. 탐정의 경우 자유롭게 범인을 찾으면 그만이지만 형사의 경우 지휘체계가 있고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고 범인을 기소해야하는 형법체계가 있다. 이 모든 사회적 체계가 범인 그 자체나 주인공 만큼이나 중요하게 부각된다.
귀도 브루네티는 무능한 상관을 갖춘 나름 유능한 형사다. 게다가 형사이므로 일단 범인을 잡으면 기소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의 문제가 있다. 라 트라비아타 살인사건에서 그는 훌륭한 음악가로 알려진 피해자의 삶을 추적해간다. 아내, 합창단원, 가수들 중에서 몇몇이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딘가 미흡한 구석이 많다. 가진 연줄을 통해서 사교계를 통해 그의 진면목을 추적해 가던 중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던 몇십년전에 알았던 늙은 가수가 사건의 핵심을 지목해 준다. 자상하고 가정적인 형사가 매력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 살인사건 자체는 큰 재미가 없다. 추리과정 자체가 약간 담백하다. 아마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할것이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인터뷰해 나감으로써 범인을 찾게되는거. 하지만 소설이니 자극적인걸 원하는건 당연지사고 그러다보니 약간 밋밋한 감이 있다.
두 번째 시리즈에 해당하는 사라진 수녀는 약간 음모론의 느낌이 나는 소설이다. 비밀 결사 조직이 나오고 그 조직의 권력이 수사기관의 상층부까지 닿아 있어서 사건을 해결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말이다. 한 수녀가 자신이 일하던 요양원에서 수상한 죽음이 있다고 얘기한 직후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 전까지만해도 우습게 봤던게 순식간에 진짜 사건이 된것이다. 열심히 조사하지만 관련자들은 신부나 수녀들로 입을 다물고 있고 상사까지 나서서 사건을 덮을것을 명령한다. 결국 사실을 제대로 명확하게 밝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살인자는 사라지고 피해자인 수녀도 그들이 두려워 자취를 감추고 만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것도 그렇지만 기독교 비밀 결 사단체라는것부터 좀 뭐랄까....우습다고 할까나. 서양처럼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깊이 스며들어 있는 나라가 아니다보니 비밀 결사 단체라는 자체가 우습게 느껴졌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광신도야 많지만은 말이다. 어쨋든 생각하면 할수록 종교라는 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절대자의 감시 아래에서만 도덕성이 유지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인간이 인간에게 할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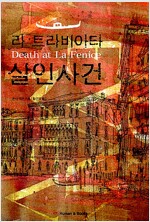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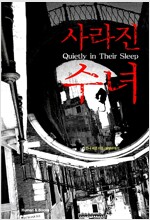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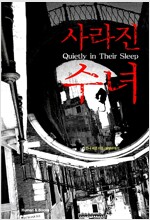
오랜만에 날씨가 좋다. 벌써부터 더워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여름이 오는것이 두렵다. 에어컨 청소도 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