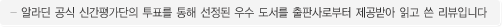[사이언스 이즈 컬처]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사이언스 이즈 컬처]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사이언스 이즈 컬처 - 인문학과 과학의 새로운 르네상스
노엄 촘스키 & 에드워드 윌슨 & 스티븐 핑커 외 지음, 이창희 옮김 / 동아시아 / 2012년 12월
평점 :

절판

21세기는 과연 통섭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문과 과학이 만나고 과학과 종교가 만나고 문학과 예술이 만나며, 정치와 음악이 만나는 그야말로 퓨전의 시대이며 통섭의 시대이다. 이것은 무분별한 잡종이 아니라 새로운 종의 출현을 기대하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섞임인 것이다. 이 책의 기획자 애덤 블리이의 기획의도가 매우 신선했다. 그는 각분야의 매우 탁월한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담을 시키고 지평융합이 일어나도록 했다.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행해져야 할 것이다. 구획짓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종횡무진하면서 그안에 어떠한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불꽃튀며 솟아날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에는 과학이 최종적 지식의 권위를 얻게되었다. 그 과학의 발전 속도에 걸맞게 새로운 인문학적 질문과 대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시대의 새로운 질문에 인문과학, 자연과학, 예술과 미디어등의 새로운 답변이 인류의 새로운 삶의 양태의 출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새로운 창조적 발상의 자리에 초대된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름만 들어도 최고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지식의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노암 촘스키를 비롯하여, 에드워드 윌슨, 스티븐 핑커, 미셸 공드리, 피커 갤리슨 등의 지식의 프런티어들이 모여서 진화철학, 시간, 꿈, 전쟁과 기만, 자유의지, 프랙털 건축, 소셜 네트워크등의 주제에 대해서 풍성한 대화의 잔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거장들의 대화를 중간에 앉아서 들어보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크다.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대가로써의 존중심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잘아는 만큼 자신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사실도 잘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이러한 수준높은 지식과 인격적인 대화는 최첨단의 지식에 대해서 대화라는 장을 통해서 매우 쉽게 일반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대화야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가득찬 전문지식을 가장 쉽고 일반적인 용어로 배울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다. 이 책은 먼저 진화생물학의 저장 에드워드 윌슨과 진화론적 철학자인 데니얼 데닛의 대화로 시작한다. 윌슨은 과학자이고 데닛은 철학자이다. 특히 에드워드 윌슨은 인문학자와의 대화를 어렵게 생각하고 사회생물학으로 인문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러나 두사람과의 대화는 신, 진화, 근친상간, 사회적 규범, 개미등에 대해서 진솔하면서도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한다. 둘은 진화론자이기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과학자와 철학자이기에 다소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그런데 확실히 거장들사이의 대화는 서로를 존중한다는 느낌이 든다. 반대의견을 진정한 존중으로 여기고 그것을 수용한다. 반대의견을 자신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높은 지식과 품격이 느껴지는 대화이다.
이 책은 주제의 다양성이 최고의 장점이자 또한 단점이다. 여러가지 주제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지만 그 호흡이 짧아서 많이 아쉬운 감도 든다. <사이언스 이즈 컬처>는 진화철학, 의식의 문제, 시간, 설계와 디자인, 객관성과 이미지, 기후의 정치학, 전쟁과 기만, 꿈, 픽션의 진실, 음악, 형상, 인공물, 누가 과학을 하는가, 인간등의 주제로 대화가 오고가지만 나는 2장 '도덕은 발명한 것일까 발견한 것일까'에서 스티븐 핑커와 레베카 골드스타인의 대화가 매우 유익했다. 특히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의 도덕적 의식을 심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의 과학자와 소설가들이 만들서 내어놓는 최고의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인간의 도덕성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진화심리학자이기도한 스티븐 핑커는 인간의 도덕성이 인류의 진화과정에서부터 오는 사회성의 산물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소설가인 레베카 골드스타인은 그러한 진화적 관섬을 인간을 동물로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읽으므로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을 깨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학과 인문학의 지평융합을 이르고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은 가공한 허구의 이야기지만 왜 인류가 그러한 가공한 스토리텔링을 그렇게도 좋아했고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 도덕성을 키워왔는지를 말한 부분은 이내용의 백미라고 할수 있다.
과학과 인문학의 지평융합. 이제는 문과 이과로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횡과 종으로 각 분야를 횡단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잡종적 창조물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시대이다. 과학과 인문학의 지평융합은 시도한 이 책의 기획자 애덤 블라이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이제는 정착적 지성인이 아니라 노마드적 유목적 지성인이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시대이다. 종과 횡으로 가로질러 무수한 지평융합을 만들어내는 일이야 말로 이 복잡한 21세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과학과 인문학의 지평융합의 시대..>
과학과 종교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느쪽도 더 강해지지 못했다. 이 싸움은 그저 쌍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을 뿐 대중을 끌어들이지는 못했다(종교의 기반은 과학의 기반보다 훨씬 크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적 전쟁'이 지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유용했다. 그러나 종교는 과학을 쓰러뜨릴 수 없고, 과학 역시 종교를 쓰러뜨릴수 없다. 둘 다 인류 사회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p.7 -애덤 블러드의 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