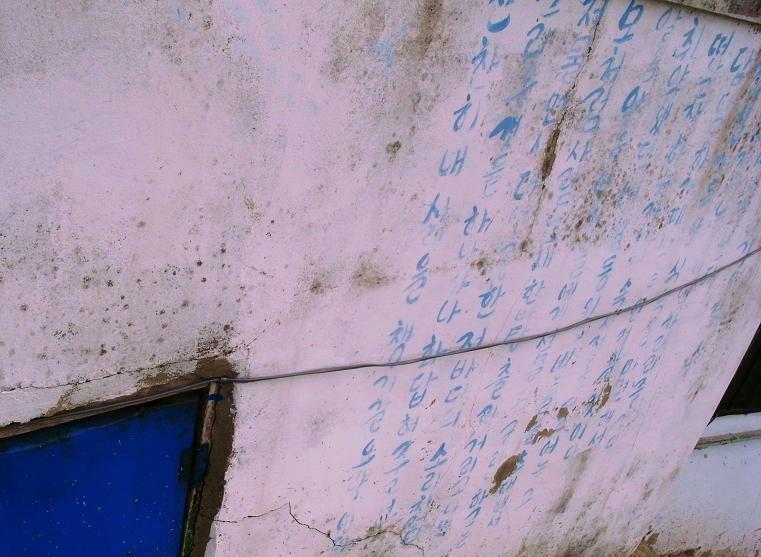
11월 9일. 이곳에 온 지 꽉채운 6개월이 지나고 있다. 벌써라고 하기에도, 아직이라 하기에도 알맞지 않다. 단 1분 조차도 1년 처럼 길기도 하고, 0.1초처럼 짧기도 한 시간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요즘은 섬머타임이 풀려서 다시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단지 한시간 차이인데, 웃긴게 지금이 한시 반인데, 보통 두세시면 자니까 이제 잘 시간이 얼마 안남은건데 시계는 12시반으로 표시되니까 잘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다는 거다. 이게 일할 때로 가보면 원래 시간으로는 6시니까 퇴근시간인데, 시계는 5시로 되어 있으니 한 시간 더 일할 시간이 남은 거고.
한국엔 섬머타임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라고 친구가 묻던데, 난 섬머타임이 있어서 이 한시간 차이가 너무도 적응하기 힘들다. 하지만 며칠 있으면 또 적응 되겠지. 사람은 놀랍게도 어떤 일에도 적응한다. 잊거나 체념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출근길의 2호선에도 적응하고. 툭툭 튀어나오는 너무나도 사소한 기억의 침입에도 적응하고. 그리움에도 적응하고. 미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하게 된 기쁨에도 적응하고. 나 자신이 도구화되어버렸다는 절망에도 적응한다.
천성이 한량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니어서 이것저것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또 맞기도 해서 중도에 포기해 버리곤 빈둥거리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은 할 일 리스트만 잔뜩 만들어놓고는 놀고만 있다. 할 일 리스트라는 건 해치워버렸을 때 기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으면서 실상 그 안에 포함된 것은 애초에 해치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해치우고 기뻐할 수 있는 요리나 청소를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남은 6개월동안 그 이후의 1년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생산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돌아보면 작년 이맘 때 나는 봄에 출국을 하려고 캐나다 비자를 얻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난 2011년을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 목적없이 사는 삶을 지향한다던 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거리낌없이 내뱉었었나보다. 살아나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