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선 작가는 책의 앞부분을 읽다가 읽을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읽기를 중단하고 중고서점에 팔아버린다고 한다. 끝까지 읽을 책이란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책에 표시를 하며 적극적으로 독서한다고. 내겐 이게 매우 호쾌하나 무례한 방식으로 여겨졌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읽고 싶은 책도, 읽어야 할 책도 많다. 공간 역시 한정되어 있고 책은 꽤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물건이다. 이런 면에선 그의 방식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떤 책에 대해 지나치게 빠르게 판결하고 최종 처분까지 내리는 게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초반부 몇십 쪽이 부진하다고 냅다 책을 유배형에 처하는 느낌이랄까(애가 대기만성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같은 일을 하게 생겼다. 역시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내게 손절당할 책은 바로 <자살에 관한 모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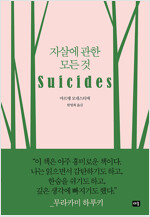
가장 불쾌했던 지점은 이것이다. 자살 현장의 사진과 이미지를 반드시 이렇게 많이 수록해야 했을까. 저자가 기자여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 '스펙타클'로 소비되기 쉬운 사진자료들을 이토록 조심성 없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제시해야만 했을까.
더 근원적이고 교묘하게 나의 불쾌감을 자극했던 포인트는 저자가 책의 주제와 유지하고 있는 '거리감'이다. 그는 딱 취재 대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제3자의 차가운 시선으로 자살이라는 '현상'을 낱낱이 해부한다. 마치 그로써 '자살에 관한 모든 것'을 파훼하고 분류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듯이. 내겐 이게 끔찍한 모욕으로 느껴졌다. 내가 느낀 바에 가장 부합하는 말은 "condescending"이다. 한국어로 옮겨야할 때 가장 난처한 단어 중 하나다. 그러니까 내겐 저자가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경멸적, 시혜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읽은 부분까지는 저자의 '당파성'과 '위치성'이 드러나 있지 않았으므로 판단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더는 읽지 않을 것이므로 설사 뒷부분에서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해도 내가 그걸 발견할 일은 영영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 언술은 그 자체로 부당한 비난이 된다.

앞서 읽은 <자살에 대하여>는 비록 마무리가 정교하지 못했으나 저자의 '당사자성'은 드러났다. 내가 그의 생각과 입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는 자살을 생각해 본 한 사람으로서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했다. 속을 드러냈다. 거기엔 어마어마한 용기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그 자체로 이 책은 좋은 책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자살에 관한 모든 것>에서는 낱낱이 파헤치고 추궁하는 외부자의 시선만이 느껴졌다. 이 책으로 내가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뿐이다. 설사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자살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나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궁금하다. 여기에서 나의 입장은 장 아메리와 궤를 같이한다. 자살은 객관적으로 설명 불가능하다. 이들의 내면을 '예감'하고 증언하는 일만이 이 문제에 관한 접근 가능한 설명의 형태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접근에는 극도의 주관성과 개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장 아메리의 <자유죽음>의 경우 읽자마자 다른 설명 없이도 바로 직감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경계에 선 적이 있었겠구나. 아마도 '구조' 당했겠구나. '뛰어내리기 직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범함과 탁월함은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철저히 죽음 직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존엄을 포기하지 않고는 견디거나 끌어안을 수 없던 '에셰크'가 그 이후 무관해지듯 자유죽음에 한해 그 이후는 타인에게만큼이나 본인에게도 무관해진다. 시도에 실패한 이의 이야기는 따라서 '객관' 만큼이나 경계된다. 장 아메리는 내면의 작용으로부터 자유죽음을 규명하려는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직전의 순간을 훼손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규명의 과정을 오염시킨다. 심리학 역시 경계 대상이다. 그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때 모든 자살이 자유죽음은 아니다. '존엄'과 '자유'는 자유죽음의 필수요소다. 주체는 오로지 자신에게 속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한 죽음은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이 된다. 모순의 모순에 전속력으로 돌진해가며 사유를 밀어붙이던 그가 149쪽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구체적 경험을 진술한다. 나는 여기에서 엄청난 감정적 동요를 느꼈다. 거기에 드러난 그의 가장 연약한, 날것의 속내가 실패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뛰어내리기 직전의 심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책 전체를 빌려 자신의 자유죽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였다. 그제야 비로소 저자의 이력을 확인했다.
이 책은 아무도 설득하려 하지 않지만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더 죽고 싶어지거나 더 살고 싶어지지는 않았다. 그저 저자의 목소리에서 '나'를 발견했을 따름이다. 나는 그가 장엄한 세계의 사람이라 더욱 비참했으리라 생각한다. 그가 살아내야 했을 삶에서 장엄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결말이 아주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208) 심지어 우리 속에 층층이 쌓여 있는 세계는 피부보다 훨씬 더 가깝다. 그 세계는 온전히 우리 것이다. 비참한 것이든 장엄한 것이든, 그것은 우리의 세계다. 우리는 그 세계에 속한다. 이 말은 달리 풀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