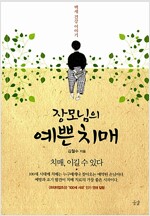
지난 달 초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사실 장모님은 내 어머니와 같은 요양원에 계셨더랬다. 장모님이 요양원에 가셔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주변에 그래도 믿을 만한 곳이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이라 달리 고민이 필요 없었다. 치매를 앓는 장모님이야 그렇다 치고 육신이 불편할 뿐 이성을 온전히 가지고 계셨고 유난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불편해하시는 어머니가 맘에 걸렸을 뿐이다. 같은 건물이 아니지만 사돈 끼리 같은 요양원에서 지낸다는 것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편치는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장모님과 어머니를 모두 요양원에 모시는 못쓸 자식이라는 시선이 불편한 단점이 있었지만 한 걸음에 어머니와 장모님을 뵐 수 있다는 장점도 좋았다. 이젠 모두 돌아가셨다. 그 요양원에 더 이상 갈 일도 없다. 가끔 궁금하다. 어머니와 작별인사를 하고 장모님을 찾아 한 참을 지내다가 요양원을 나설 때 건물 안에서 바깥 구경을 하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요양원에 가거나, 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일요일이 궁금했었다. 겪고 보니 그 자유로움을 애초에 없었다. 그저 같은 일요일이 무심히 지나간다. 장모님이 계실 때는 장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 생전 어머니와 함께 지내시던 할머니들을 우연이라도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 할머니들의 말씀에 신세를 져서라도 어머니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다. 이젠 그 기대도 모두 사라졌다. 젊은 시절 아름다움이라고는 모두 사라진 장모님에게 내 패딩을 입혀드리고 벤치에 앉아서 찍은 사진은 우리 둘만을 담은 처음이자 마지막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