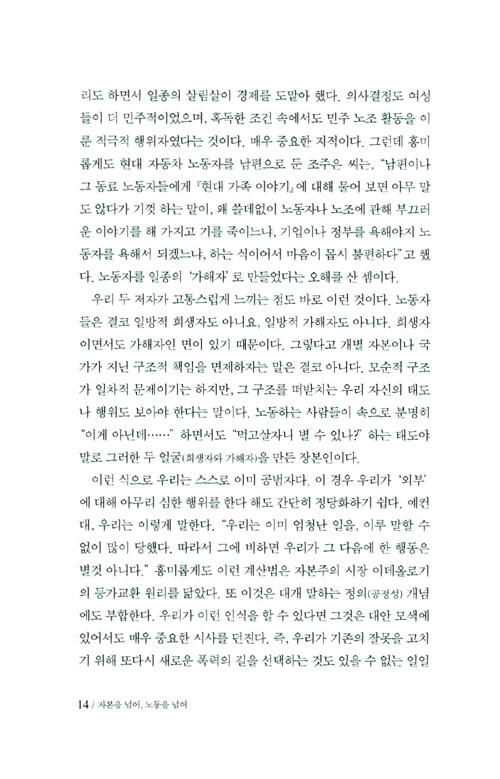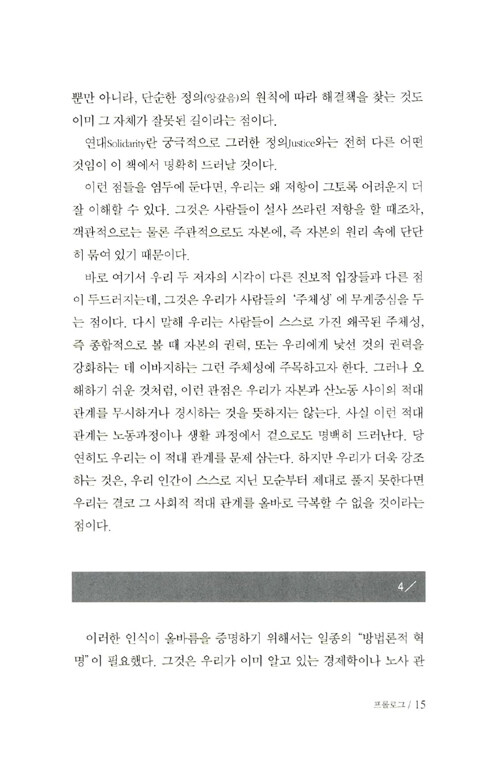<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그곳은 어디인가? 해체론을 오독한 것도 있겠지만-오독은 또한 중요한 해체론의 방법중 하나 아닌가? 잘 모르겠다만- 주체를 분열시키고 형체를 없애 버린 이후 그 바깥에서는 어느 땅 위에 도대체 어떤 형태의 주체를 형성할 것인가 라고 했던 해체론 비판자의 글이 생각난다.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그곳은 어디인가? 해체론을 오독한 것도 있겠지만-오독은 또한 중요한 해체론의 방법중 하나 아닌가? 잘 모르겠다만- 주체를 분열시키고 형체를 없애 버린 이후 그 바깥에서는 어느 땅 위에 도대체 어떤 형태의 주체를 형성할 것인가 라고 했던 해체론 비판자의 글이 생각난다.
강수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는다. 실험적인 과정으로-물론 이런 실험이 혁명의 단초가 되기에 포기될 수 없다- '자본/노동'을 넘을 수 있는 것과 보편적인 차원까지 확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강수돌의 논지는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 타당한 비판의 여지도 많다. '이거 아니면 저거야' 라는 식으로 '자본/노동'을 옹호하는 방식은 최소한 내 방식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진보내에서 가끔 논쟁이 되던 '계급' 문제와 '소수자'문제이다. 이것이 마치 적대적 모순의 관계처럼 논쟁되거나,또는 그렇게 인지되는 방식은 넌센스다. 이론적 논쟁에서 준거 지평으로 틀로서 논쟁을 하는 것은 '이론적 지평'의 문제로 이해해야만 한다. "당신은 '소수자'를 지지하니까 당신은 '계급'문제는 별 필요없다는 거지." 라는 식으로 논쟁을 끌어가거나, 인식하는 방식은 무지의 소산이다. 이 두 문제가 공히 실천 영역에서 변증법적인 화해를 추구할지라도 이론적 영역에서는 또 비판과 반비판은 꾸준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 '전선의 치열성' 에 대한 강조이다. 분명 '전선'은 치열한 경우가 있다. 그 때 행동은 통일되어야 한다. 레닌의 볼세비키당의 장점 중에 하나-레닌은 민주집중제라고 말했던 듯 한데- 당내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가 전선에서의 행동의 일치였다. '전선 치열성'은 역사적인 실체다. 실제로 그 '전선'의 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진보나 혁명 세력에게 가장 중요하다. 기술적인 의미로, 그리고 또한 실제에서도 혁명은 거의 타이밍이다.
하지만 '전선의 치열성'은 폭력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 즉 그 치열성은 '배제'를 담보로 작동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선의 치열성'에 대한 해석의 임의성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선의 치열성'보다도 '이데올로기 작업'으로 '치열성'이 작동할 때가 훨씬 많다. ' 선거 때면 등장하는 '비판적 지지론'의 유령은 '전선의 치열성'이라는 담론이 선점하는 좋은 예가 된다. 물론 거기에는 일말의 진실도 있다.
요는 그거다. 연대...연대하는데...연대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다. 요즘 '연대'는 벽에 봉착한 진보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가 된 듯 하다. 진정한 연대를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타협과 조정에 유연할 수 있는 조직의 인격적 성숙(?)이 필요하다.
강수돌의 주장에 '맞아.맞아 대세는 생태야라며 이 지긋함에서 떠나자'라는 식의 '초월적'자세나또 다른 세계를 기획하는 상상력에 '지금 시국이 시국이거든요.당신 전선을 헷갈리게 하지마' 하는 식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오독하는 방식 모두 지양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강수돌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전선'을 분열시키는 주장이 될 것이다. 물론 '노동자성'에 좀 비판적인 시민운동 주체들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판의 순환고리를 따라 돈다.
다시금 밝히지만 나는 강수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치는 않는다. 얼핏 들으면 다 좋은 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띈다. 사실 듣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존레넌의 '이매진'식의 유토피아적 아나키즘 아닌가...듣기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