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팀전의 관심도서>
솔직히 내 인생에 책이 이렇게 밀려 본 게 언제인가 싶을 만큼이다. 한 해 내가 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책만 읽을 수 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책 말고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 어쩔 수 없다. 관심 도서는 정말 관심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때 그 순간에 눈에 드는 것도 있다. 그래도 전자가 많다. 결국 이런 책들이 쌓이는 거다. 거기에 가끔 서점가서 눈에 드는 것들을 보면 또 몇 권이 쌓이게 된다. 거기에 또 - 쓸모없을지도 모를- 여유만만이 있어서 더 쌓이고 있다.
요즘 내가 자주 보는 책이 그리스 관련 책들이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 관련 책을 읽게 된 이유는 플라톤의 <국가> 를 제대로 읽어보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그냥 냅다 읽으면 어떨까 하다가..뭐 급할 것도 없는데 하면서 '그리스'를 읽다보니 이제 플라톤의 <국가>는 1년 쯤 뒤에야 아니 그 뒤가 될지도 모르겠다. 더디가지만 이게 꼭 나쁜 것 만은 아니다. 의외로 그 앞길을 다지면서 풍부한 것들을 알게된다. <정치와 비전>의 셀던 월린이나 <고대철학이란 무엇인가?>의 피에르 아도같은 이들을 알게 된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브루노 스넬이나 베르낭 같은 이들은 이런 더딘 마음이 아니었다면 내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옛날에 교양삼아선 본 철학사 책들도 앞부분을 다시 뒤적여 보게 된다. 그리스를 보는 것 중에는 푸코의 <성의 역사1.2.3>도 염두에 두고 있다. 푸코의 말년 작업이 '위대한 그리스로의 회귀' 아니었던가. 조르주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를 대충 훑어봤는데 그 안에도 고대적 개념들의 해석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듯 보였다.
결국 그리스를 읽다보니 어렸을 때 본 <일리아드>와 <오뒷세이>,그리고 아직 읽지 않은 <아이네이스> 도 염두에 두게 된다. 3대 비극의 작가들은 전작을 모두 보고 싶어진다. 최근에 묵직하게 제법 잘 나왔다. <플라타크 영웅전>은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이다.
올해도 지젝의 책을 몇 권 쯤 더 볼 생각이고...고진의 책도 몇 권이 밀려 있고... 최근에 방한한 랑시에르도 관심이 간다. 연타로 나온 아리기의 책도 그냥 넘어가진 못할 것 같고...또 세익스피어도 꼼꼼히 볼 생각이다. 김정환 역을 한 번 씩 넘겨보면서 이런 문장들이 있었나 하면서 새삼 감동,감탄을 하고 있다. 왜 그 때 이런 말들이 기억에 남아 있지 않지 하면서 말이다.
회사에서 외딴 고도- 실제 외딴 고도는 아니다-로 강제 발령을 내려는 데 거기 자원할까 싶을때도 있다. 가족들에겐 엄청난 피해이고 또 가서 하는 업무가 좀 다른 거라서 거부하지만...가면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날 것 같다. 그건 밀린 책 처분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이소선 어머니는 대학 다닐때 집회 현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다. 때론 연단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들의 손을 잡으며 도닥여 주시는 모습으로 말이다.
한국방송이 <인물현대사>를 할 때 이소선 어머니의 삶을 다룬 적이 있다. 이소선은 전태일을 낳았지만 전태일은 또 다른 이소선을 낳았다. 그녀는 전태일을 열사라고 부르지 말고 '동지'라고 불러달라고 말한다.
노래가 생각이 난다. "머물수 없는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동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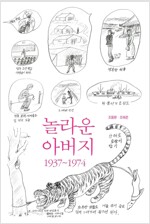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다.
<놀라운 아버지>. 아들이 기획하고 아버지가 그런 그림으로 한 가족의 개인사가 유치찬란한 그림속에 그려진다. 아들은 전업 미술가이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다.^^
만화로 그려진 구술사이고, 미시사이자 우리시대 어떤 아버지의 개인사이다. 나는 이런 소통방식을 통한 작업에 눈길이 간다. 나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지만 또 내가 모르는 그가 있다. 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세대 유전된다 나의 아들 역시 그럴것이다. 이런 소통은 서로를 핥아주는 치유가 될 것이다.그리고 이 치유는 어떤 보편성을 갖게 될 지도 모른다.

올해 다윈은 한 두권쯤 읽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가끔 회사 자료실에서 <과학동아>를 본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내가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달 <과학 동아>에서도 다윈 특집을 다루었다. 다윈의 진화론 뿐 만이 아니라 진화론이 어떤 논쟁들 속에서 진화되어 왔는지를 다루고 있다. 당연히 읽을 만한 진화론 관련 서적들도 추천되었다. 내 기억에 대여섯 권 쯤 되었다. 모두 보관함에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윈의 식탁>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다.
사실 헌책방에서 <진화>라는 두껍고 사진 많은 책-갑자기 누가 저자인지 생각이 안난다-도 좀 봤는데 들고 다니기 남사스러워서...

<교양>이라는 두꺼운 책을 쓴 슈바니츠의 <햄릿>이다.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으면서 함께 읽을까 하다가 여석기까지만 읽기로 했었다. 하지만 슈바니츠의 <햄릿>과 케네스 브레너의 <햄릿>은 잠시 뒤에 읽고 보기로 했다.
여석기의 책에도 인용되는 폴란드의 얀 코트가 있다.그는 '우리시대의 햄릿'이라는 개념을 말하면서 햄릿이 읽고 다녔던 책이 당시에는 아마 몽테뉴쯤이었겠지만 지금이라면 사르트르 였을것이다 라고 말했다.
햄릿이 뭔 책을 읽고 다녔는지 뭐가 중요하냐구? 맞다. 중요한 것은 그게 '햄릿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의 문제라면 좀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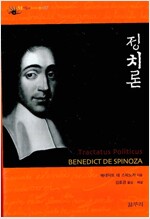
요즘 정치사상사는 스피노자에서 건져올린 것들이 많다. 모두가 스피노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스피노자를 건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뭐든 다 단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 책이 유명하고 중요하다고 덜컥 읽을 수는 없다. 그냥 언젠가 읽겠지 하고 생각만 해 놓는것이다.책도 얇고 포함된 함의는 커도 무지막지한 책은 아니다.
이건 다른이야기다 회사에서 제일 웃겼던게 뭔고 하니...영상미학 대학원에 다닌 친구가 있었다. 내 장담컨데 사회학적 기본 지식은 거의 전무하다. 마르크스의 '마'자도 모른다.프로이드의 '프'자는 들어봤을 정도다. 그런데 언젠가 회사 책상 위에 들뢰즈의 <천개의 고원>이 놓여 있었다. 내가 그래서 장담했다..'니가 그 책 읽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주마' 기분 나빠했지만...1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냥 놓여 있기만 하다. 이제는 놓여있기만 한 것이 그것의 목적인 양. 안됐다. 들뢰즈.(았따..당신 이야기 아니니까..우씨우씨 하지마시길..실제로 있는 인물 바로 그 특정인이야기다. 이제 글 쓸때 이런 내용도 올려줘야한다.어찌나들 오해작렬,지레짐작,의심만발,자책낙심,댓글폭발하시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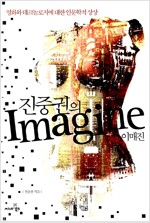
진중권은 MB의 '그린 뉴딜'을 보고 '군복이 녹색이니 군대도 녹색 사업이냐?' 라고 했다. 하여간,,^^ 어찌나 웃었던지.
이 글들 중 일부는 <씨네21>에서 본 것들이 있을게다. 회사에서 <씨네21>을 정기구독하고 있기때문에 나오면 살펴본다. 물론 매번 읽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책을 사도 별로 아깝지는 않을 듯 하다.
영화와 미학은 많은 이들의 관심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