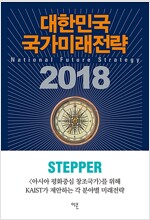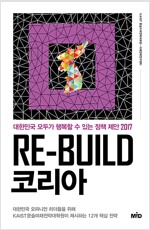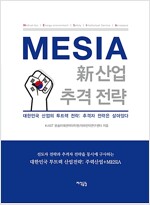제목이 거창하나, 진단과 처방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요는 KAIST 학생들은 술도 먹고 데모도 하고 좀 놀았어야 하는데 공부만 하느라 종합적 사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기르지 못했으니(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가 MIT나 칼텍 같은 이공계 특화 대학이 아니라 종합대학인 '하버드' 중퇴생이라는 것도 강조한다), 농활도 보내고 가난한 나라에 봉사활동을 좀 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외부강사를 적극적으로 섭외해야 한다는 것과,
서울대의 장점이었던 시대정신이 최근 쇠퇴하는 것은(수업도 안 듣고 빡세게 데모하고 그렇게 외도를 한동안 하다가도 마음 잡고 공부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사람들, 특히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 언저리 세대를 조명한다) 무엇보다 서울대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니(여기에 더하여 융합, 통섭이 힘든 캠퍼스 지형;;), 서울대를 세종시로 보내고, 교수평가 엄격하게 하고,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아니, 좀 놀고 데모도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었어??).
문제는 그보다 훨씬 뒤숭숭하다고 생각되지만, 둘 중에 특히 KAIST의 경우 MIT처럼 되고자 한다면, (살면서 이런저런 경로로 접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안팎으로 딴딴하게 채워지지 못한 일부 교수들의 갑질, 꼰대질부터 어떻게 해야 할 성싶다(지은이가 "폭넓은 사고와 성역 없는 토론 문화,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교수들의 능동적 자세"라는 대책으로 슬쩍 건드리긴 하였다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다).
지은이는 물리학 전공으로 KAIST에서 학사, 서울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마치고 조선일보 기자를 하신 분인데 지금도 조선일보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다. 이 책도 앞쪽에 방일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술·출판되었다고 써있다. 최선을 다해 내용에만 집중하려 하지만, '조선일보'가 붙으면 마음 속에서 어떤 인상이 생겨나곤 한다.
(...) 한국은 왜 과학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가라는 물음으로 환원되기도 한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CT)의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 대학원장을 지낸 원동연 교수는 이 질문의 답변에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 이렇게 답했다.
˝내가 하버드대 post-Doc(박사후연구원)으로 있을 때 노벨상 수상자나 노벨상을 받은 거인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인상적인 점은 우리가 그들보다 공부를 적게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들은 노벨상을 받을 분야를 연구했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시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시대를 흔들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뛰어들었다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했다는 점이 노벨상 수상자와 우리를 갈랐다.˝
열심히 하기는 쉽지만, 주제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전에, 공부의 주제가 시대가 필요한 연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갈망하는 연구 주제를 알려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자면 사람 자체를 알아야 한다. 그런 통찰력은 책에서 얻지 못한다. 대전의 KAIST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갈라파고스 군도(群島)의 새처럼 공부에 매진했다. 캠퍼스 자체가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도 외진 곳에 있다는 점과 학생들 스스로 데모하기 싫어서 처음부터 KAIST에 진학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학교 시절부터 일찌감치 수학·과학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과학고에 진학한 학생이 KAIST에 많은 점도 서울대의 운동권 문화를 찾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인 관심사에 소홀하면, 다른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다. 지식의 편중은 관심의 차이와 남다른 가치관 정립으로 이어진다.
다른 가치관에 살다 보면 한 하늘 아래 있어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인식한다. 별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울려야 한다.
‘사람 장사‘를 해 봤어야, 시대의 필요를 감지한다. 그래야 역사에 남을 연구를 하고, 추격자 한국이 선도자 한국으로 변신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책 80~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