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듦의 즐거움 - 인문학자 김경집의 중년수업, 개정판
김경집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4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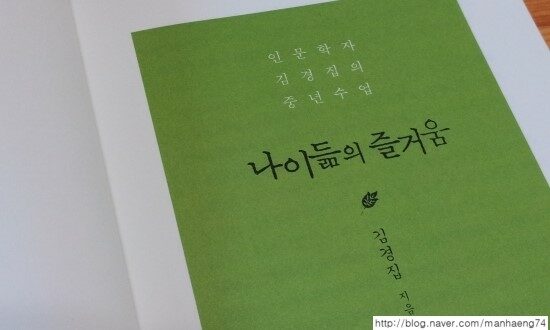
나이듦이 즐겁나요? 반신반의한 견해이다. 사회적 기반, 가정의 안정감,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등 이런게 충족 된다면 모를까.'인문학자 김경집의 중년수업' 이라는 부재를 단 <나이듦의 즐거움>을 읽으며, 지루하기도 하고, 깜박 잠이 들기도 한다. 마흔의 나이를 훌쩍 살아낸 중년의 사내가 조근조근 들려주는 잘 늙어가자는 조언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내 나이 불혹을 맞아, 격조있는 언어에 대한 불편함이 가슴바닥에서 닿아오른다. 다 옳은 말이며, 참으로 우아한 깨달음의 경지. 이런 경험과 깨우침이 있다면 나이듦이 늙음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저자는 마흔의 중반에 <나이듦의 즐거움>을 첫 발행하여, 쉰 중반에 재발행되었다. 마흔 중반에 초판을 내고는 서명이 다소 '건방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다. 그러나 그건 나이듦을 뜻한다기 보다는 '제 나이를 살아내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재발행 서문에 밝힌다. 1장에서 3장으로 구분하여 1장은 나이들어가며 잃거나 얻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기록하고, 2장은 일상속에 접하게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현재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들어낸다. 3장은 여전히 살아가야 할 삶의 지속성을 말하며 새로운 길의 여정을 희망하는 속내를 보여준다. 저자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25년은 배움을, 25년은 가르침을, 25년은 세상과 교감하는 글씀을 실천하고 있다.
젊은이가 <나이듦의 즐거움>을 읽는다면 지루할까? 아니면, 공감이 될까? 늙어가는 누군가 읽는다며 백배 공감 될까?
허튼소리 말라고 나무랄까? 첫장을 들추면서 '교수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라며 편견의 잣대로 곱게도 늙어간다 여기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살이란게 어디서 어떤상황을 살아가든 깨달음의 차이는 각자의 몫인걸 알게 된다면 편견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개별적 인간의 삶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결국 저자가 재발행 서문에서 밝힌 것 처럼, 나이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나이를 먹어가는 모든 독자들에게 '나이듦의 태도'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서야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시력은 잃었으나 심력이 굳어진 깨달음, 아내의 암투병으로 죽움의 문턱을 함께 견뎌낸 동지애, 쉰의 문턱에서 강효 교수를 닮고 싶다는 자아, 스스로 시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쓴다는 설날의 유서 등은 잔잔한 감동으로 닿았다. 인문학자의 경험이 물씬 풍기는 문학적인 표현과 생텍쥐페리, 카프카, 원효, 이효석 작가의 묘사를 담아낸다.
영화와 미술, 쿠바 음악가들인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에 대한 감상은 물질적인 삶에 퇴색된 사고에 자극으로 다가온다. 일상의 모든것들을 마주대하며 뾰족했던 심성이 뭉퉁해지면서 얻어지는 혜안을 간결하고, 담담하게 풀어내는 저자의 글맛이 책장을 덮고야 전해진다.
이십대 시절, 입에 붙이고 살았던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책의 엔딩에서 마주 대하니 감회가 새롭다.
마흔에 읽어보는 프로스트는 또 묻는다. "너는 너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여전하고, 가고있는 길도 어딘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불혹'에 공자는 흔들림이 없다했나. 피식 웃음이 난다. 프로스트의 시와 공자의 성어가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은 길은 계속 가야하고, 흔들림은 유효하기 때문이겠지. 그래. 나이듦이 즐겁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은가?
불혹이란 그저 물리적 가늠일 뿐, 여전히 뜻을 세우는 한 서른 청년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늙은 청년. 그 부조화가 끝까지 삶에 진지할 수 있는 마흔여덟을 버텨줍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또 다른 출발점이기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 시간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246쪽
속도를 얻으면 풍경을 잃고 풍경을 얻으면 속도를 잃기 쉽다는, 삶에서의 경험이 자꾸만 우리를 엉거주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심하게 흘러가기만 한 줄 알았던 시간은, 어쩌지 못하는 그 곤경도 조금은 덜어내며 살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삶이라는 걸, 미련 하게도 참 늦게 깨달았습니다.
11쪽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노란 숲 속 두 갈래 길.
두 길 다 가지 못하는 것 못내 안타까워
한참을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만큼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거기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어간 자취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 걷게 되어, 어차피 그 길도 거의 같아지겠지만.
그날 두 길엔
낙엽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이어진 길 끝 없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훗날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쉬며 말하겠지요.
숲 속에 두 갈래 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 애써 잡았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았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