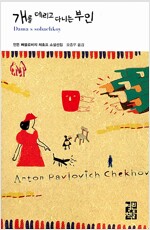˝새벽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얄따가 보이고, 산 정상에는 흰구름이 걸려 있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매미들이 울고 있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단조롭고 공허한 바닷소리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영원한 잠, 평온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 바다와 산과 구름과 넓은 하늘이 펼치는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여명을 받아 더욱 아름답고 편안하고 매혹적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나란히 앉아, 구로프는 이런 생각을 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존재의 고결한 목적과 자신의 인간적 가치도 잊은 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 -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p262)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으로 예민했던 나는 하늘과 바람, 햇빛과 어둠, 날마다 다른 공기 냄새, 정적의 풍요, 소음 속의 적막함 등 평범한 일상의 어떤 순간들을 온 감각으로 느끼며 그 속에 잠시 머물곤 했었다. 지금도 아주 어린 시절 어떤 장소의 후각적 기억이나 공기의 무게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런 성향의 나에게 체호프가 묘사하는 자연의 정경이란 읽는다는 의식 없이 바로 체화되는 느낌이다. 아름답지만 애틋하게 말이다.
더욱이 체호프가 묘사하는 자연의 정경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어서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레 공감하게 만든다. 어떤 풍경이든 자연의 모습은 계속 변화해간다. 사람들의 생각은 구름처럼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버리고, 마음 역시 짙은 안갯속에 갇히기도, 삶을 향해 환하게 걷히기도 한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름다움이나 벅참은 곧 황폐한 슬픔으로 변해버리기 마련이고, 완벽한 환희로 지켜봤던 순간이 완벽한 지옥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봐야 할 곳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잘 살펴보라며 조근조근 속삭여주는 듯한 체호프의 글은 담담한 듯 깊이 파고든다.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진실과 사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약함과 허무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켜켜이 사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아득한 지평을 향해 열리는 느낌이 든다.
˝예전에 그는 슬플 때면, 머리에 떠오르는 온갖 논리로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는 논리를 따지지 않고 깊이 공감한다. 진실하고 솔직하고 싶을 따름이다..... ˝ (p273)
새로운 기쁨 뒤엔 새로운 실망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의 소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은 살아간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 같다. 새삼 글을 읽을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마저 든다. 비록 번역된 글이지만 활자를 통해서라도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살았던 천재적인 작가와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