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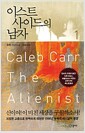
-
이스트 사이드의 남자 1 ㅣ 뫼비우스 서재
칼렙 카 지음, 이은정 옮김 / 노블마인 / 2008년 11월
평점 :

절판

어느 3월의 추운 밤, 뉴욕타임즈의 기자인 존 무어는 친구인 정신과 의사 크라이즐러가 보낸 심부름꾼을 따라 어디론가 향한다. 불려 간 곳은 한 매춘소년이 특이한 방식으로 처참하게 살해된채 발견된 살인현장. 곧바로 이와 같은 수법의 범행이 이전에도 몇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다. 때는 1896년. 뉴욕 경찰총장으로 막 임명된 시어도어 루스벨트(훗날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이 연쇄 살인사건의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특별 수사팀을 결성한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혁신적인 이론을 주창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크라이즐러를 수장으로, 뉴욕타임즈 기자인 존 무어, 뉴욕 최초의 여경 새러, 과학수사팀의 아이잭슨 형사형제등의 멤버가 모였다. 살인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던 당시로서는 이단이라고 불릴만한 획기적인 방법들, 심리학을 범죄에 응용하는 현재의 프로파일링 기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들은 범인의 성향과 내력을 추리해 살인자의 실체에 조금씩 접근해간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체를 알 수없는 어떤 세력이 그들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손을 뻗쳐오기 시작한다.
19세기말의 뉴욕을 무대로 벌어지는 엽기적인 소년 연쇄살인사건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시 뉴욕 맨해튼의 거리와 생활상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글을 쓸수가 없다는 작가의 말처럼, 철저한 고증에 의해 그려진 뉴욕의 모습은 치밀하기 이를데 없다. 그 세밀한 묘사로 말할것 같으면 흡사 정밀한 미니어쳐세트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등장인물들의 주소와 번지수까지 표현한 밀도높은 뉴욕의 모습은 밤거리를 부유하는 썩은 공기의 냄새까지 맡아질 것처럼 선명하다. 도시 자체가 꿈틀대는 하나의 생명체같다고나 할까. 어쩌면 이 책의 주인공은, 화자인 무어도, 크라이즐러도, 루스벨트도 아닌 뉴욕의 거리 그 자체라고 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다.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모노톤의 이미지. 여명기인, 19 세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정신 분석의가 이단자나 괴짜 취급을 받는등, 대게는 섬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인물상에 엽기적인 범죄까지 포함해서, 한없이 음울하고 어두운 세기말의 풍경을 그리고 있을것만 같지만, 진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한 면도 있고, 시대상 만큼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들의 개성이 이런 분위기를 중화시켜 준다. 지금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프로파일링 기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타임슬립 할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있다. 스토리, 인물조형, 배경의 묘사 어느 한 부분에만 힘을 쏟아부은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완벽주의가 느껴진다. 묵직하다. 사소한 부분까지 빼놓지 않고 꽉꽉 눌러담은 소설.
예전에 취미로 프라모델 디오라마에 몰두하던 때가 있었다. 정말 잘만든 외국의 명인들의 작품을 보면 메인이 되는 탱크나 장갑차를 세심하게 도색하는 것은 기본이고, 손수 자작으로 만들어낸 배경구조물(폐허가 된 집이라던가...), 병사들, 흐르는 물, 흙, 나무, 풀한포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정성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 작은 프라모델 병사의 눈동자까지 제대로 표현해낸것을 보면 정말이지 아무리 취미활동의 일환이라고는 해도 장인정신이란 바로 이런것이구나 하는 감탄을 하지 않을수가 없게 한다. 이 책이 바로 그런 부류의 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완성도가 무조건 재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동종의 소설중 그 퀄리티만으로는 최상급의 속하는 작품인것만은 분명하다.
이 책의 빼놓을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이 바로 인물들간의 구도. 홈즈와 와트슨을 연상하게 하는 정신과의와 주인공의 관계. 이런 인물구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말할것 같으면 찾아보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들의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서 나는 일본작가 교고쿠 나츠히코의 작품속의 세키구치 - 교고쿠도 콤비를 떠올렸다. 이를테면 정신과의사인 크라이즐러의 장광설은 듣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즐겁다. 주인공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크라이즐러라는 인물을 지켜보는것도 또한 즐겁고, 이들 못지않게 확실한 개성을 부여받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저마다 생동감이 넘친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간간히 불거져 나오는 유머러스한 장면들은 소위 깬다. 개인적으로는 살인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센 남자들이 유일한 여성인 새러의 앞에서 ㄸㅗㅇ이라는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새러의 입에서 먼저 그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공중에 몇센티 떠버린 장면이 인상에 남는다. 아무튼 읽어보면 작가가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공을 들였다는 것을 잘 알수있다. 본스토리외에도 즐길부분이 많다는 면에서는 매니아로 남게될 사람들에게 어필할만한 부분이 많다. 확실히 이 소설은 시리즈물에 적합하다. 책을 읽고 나서야 나중에 이 책이 시리즈물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 끝내기에는 이 잘 구축된 세계와, 개성이 골고루 배분된 캐릭터들이 너무 아깝다.
이 시대 이렇게 매춘을 하고 있던 소년이 많았다는 것은 놀라움이다. 어려운 시대상을 보게 된 것 같아 씁쓸하다. 처참한 사체의 모습등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절제된 묘사는 비슷한 소재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 때로는 품위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프로 파일링을 통해서 떠오른 인물상을 통해 살인범을 추적해가는 과정은 아슬아슬하지만, 묵직함 만큼이나 어떻게 읽어도 스피드감만은 떨어진다. 그래도 그것을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이끌어 가는 힘이 있는 걸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