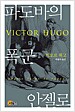원래는 영국문학을 좋아했더랬다. 찰스 디킨스의 시를 연상케 하는 문장들은 원문으로 읽고 싶은 욕구가 샘솟을만큼 어찌나 아름다웠던고.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문학이 내게로 다가왔다. 어떤 것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 경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 개봉 전, 위고의 원작을 이형식 교수의 번역본으로 읽은 게 결정적이었으리라.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웠다. 영미문학과는 다르게 철학적인데다 작가 특유의 장광설이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거기에 직역을 고집한 이형식 교수의 문장은 어려움을 한층 더해 주었다.

그런 만큼 5권을 마쳤을 때 성취감은 비할 데가 없었다. 직역한 번역문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고, '빅또르 위고', '빠리', '떼나르디에' 같은 외래어 표기법을 무시한 원어에 가까운 발음들은 진짜 프랑스어를 읽는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 최근 민음사에서 소장용 리커버가 나왔지만, 나는 이 판본을 여전히 갖고 싶다.
초반, 미리엘 주교가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주면서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서 주님께 드렸소.'라고 말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장발장이 '주교님이 지금 나를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하고 고백하는 장면과 묘하게 대구를 이뤘고, 이는 영화에서도 충실히 다뤄졌다. 원작과 영화 모두 사랑한다. OST마저도.

『파리의 노트르담』은 정기수 교수 역본으로 읽었다. "~올시다" 같은 어투가 상당히 옛스러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파리', '주피터' 등 번역어가 싫었기에, 이 역본은 그다지 사고 싶지 않다. 내용만은 최고였다. 2019년 불에 타버린 노트르담 성당의 운명을 예견했음인지, 그는 성당의 모습을 지루하리만치 세세하게 묘사했다. 콰지모도의 애절한 감정을 암시한 에필로그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를 소재로 한 프랑스 뮤지컬의 OST도 굉장히 좋아한다.


열린책들에서 출간된 이형식 교수의 두 번역서는, 작품 자체는 독창성 면에서 한단계 아래라고 본다. 『웃는 남자』의 마지막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 어느 작품을, 『93년』은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번역의 수준 만큼은 『레 미제라블』에 필적했다고 본다.


『바다의 노동자』는 독특한 작품이었던 것 같지만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판타지적 성격이 강했다.
『사형수 최후의 날』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젊은 날 위고의 격정적인 목소리를 담았다. 설득력이 있는 글인지는 모르겠다.

거의 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근래 읽은 위고의 작품은 희곡 『왕은 즐긴다』이다. 알다시피,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원작이었기에 선택했던 것. 놀라웠던 점은, 많은 부분을 각색했음에도 원작의 설정과 대사가 상당히 그대로 쓰여 있었다는 점이다. 위고의 말로 널리 회자되는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이라는 대사도 여기에서 나왔는데, 오페라에는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희곡임에도 재미있게 읽었다.
읽어야 할 위고의 책들...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