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가 맨 앞.
이문재시집. 문학동네시인선 052
시인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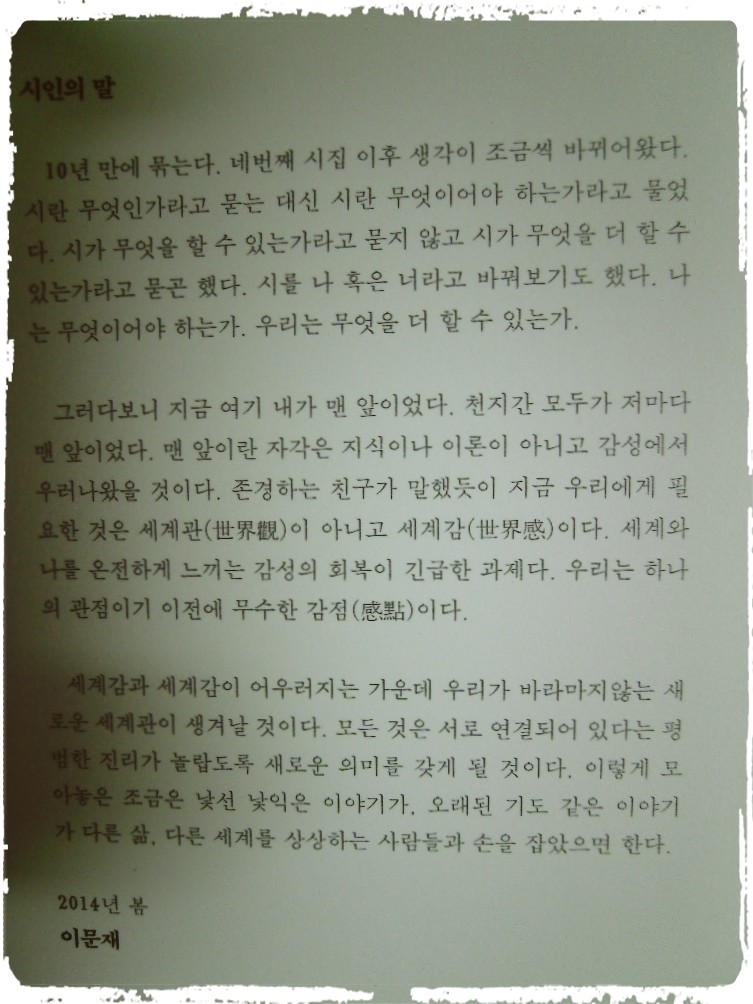
여 름 잠
비탈밭 옥수수가
휘청거린다.
목계 쪽에서 넘어오는 바람이
찰지다.
하지 때 들어와 웅크리고
있다보니
시계가 없어도 지낼
만하다.
한 칸 컨테이너가 그새 옛집
같아졌다.
직육면체 안팎으로 여름이
치열하다.
사흘 동안 골짜기를 빠져나간
것이라곤
찰옥수수 가득 실은 일 톤 트럭 한
대뿐
어쩌자고 같은 말은 하지 않기로
한다.
또 한바탕
들이퍼부으려는지
귀래 쪽 능선이 빠르게
어두워진다.
서울에 두고 온 걱정은 퉁퉁 불어 있을
것이다.
무릎 껴안고 발톱 깎다가 문득
보았다.
두루미 한 마리 솔숲으로
향하는데
하얀 날개짓이 괜찮다 괜찮다 말하는 것
같았다.
며칠째 약 먹을 시간을 놓치고 있다
후둑
후두두둑, 솨아
솨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ㅡ 넓어질 대로 넓어진
활엽들이
세찬 빗줄기를 받아내며 일제히 도리질을
한다.
잎사귀들이 뭔가 울컥울컥 토해내는 것
같다.
컨테이너 소긔 나도
난타당한다.
게릴라성 호우는 매번
가차없다.
치악산 쪽 하안거 (夏安居) 는 흉내낼 수도
없고
겨울잠도 어림없는 소리
그래 이 느닷없는 산거 (山居)
를
하면 (夏眠) ,여름잠이라고
부르자.
난생처음으로 잠에 집중해보는
것이다.
동지 때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더 꺼놓기로
하자.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따위의 말은 쓰지 않기로
하자.
이문재 詩
p.052 /053
잠을 불러야 할 것 같아서. 여름잠,
할 일이 많아서 부담이 가중되는지
일주일 넘게 꼬박 뜬 눈이다.
눈이 뻑뻑하면 번갈아 식염술 넣어서
겨우 눈의 여유를 돌려가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 번에 일이 좀 잘되면 좋겠다만,
내가 가기 싫은지, 집이 보내기 싫은지
아니면 그곳이 나를 반기지 않는건지.
일이 더듬더듬, 그러하다.
이렇게 못자다간 이가 다 빠지고 말겠다.
피곤에 절어서.. 피부는 지금 누구시우?
그런 감각중...이다. 무디고 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