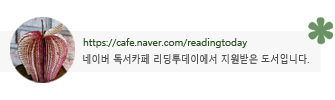-

-
페르소나주
실비 제르맹 지음, 류재화 옮김 / 1984Books / 2022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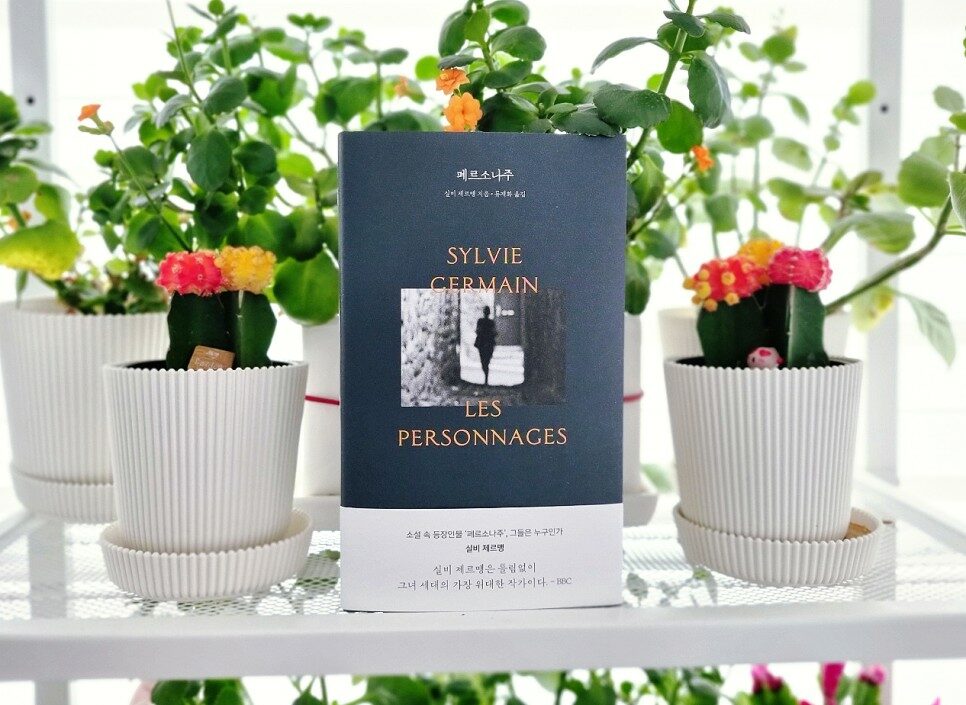
책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에 빠져 어느 순간 나와 그가 하나 되어 몰입되는 순간이 있다.
책을 읽는 묘미이기도 하고 그런 재미에 더욱 책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는데, 등장인물에 빠져 읽던 책을 어느 순간 작가의 삶을 공부하며 읽기 시작했다. 등장인물들에 작가의 삶이 투영되는 게 조금씩 보이기도 했고, 그들의 인생을 알고 책을 읽다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록 소설가와 책 속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뗄레야 뗄 수가 없는데,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순간과 그들에 대해서 실비 제르맹은 이 책 [페르소나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종이 색 피부를 선사받고 잉크에 젖는 생으로 살아가니, 단어들은 살이 되고 동사들은 피가 된다.
더더군다나, 우리도 모르지만, 그 역시도 자세히는 모르는 이야기를 선사받는다.
아, 제발 우리는 그를 상상의 웅덩이 속에 가만히 잠들어 있게 하거나, 몽상의 번데기 속에 싸여 있게 하거나, 꿈의 너울 속에 고요히 흔들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선사받은 이야기를 용케 알아냈는지 그 고마운 빚을 기어이 갚겠다며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 p.16
페르소나주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뜻한다.
그들은 소리 없이 신중하게 다가오고, 얼굴도 온전히 보여주지 않으며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혼자서만 나타난다.
그들의 존재감은 내가 글을 쓰기로 결심한 순간 비로소 스스로 일어나 움직이고, 잠들어 있던 그들의 뒤섞여 있는 목소리들은 내 몽상에 엉키고 젖어든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디서 생겨나는지, 흐릿한 이미지에서 또렷이 그 존재를 드러내며 태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작가는 이야기하는데, 소설가의 언어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들도 조금씩 슬그머니 움직이게 된다고 말한다.
아무도 아니 거의 아무도, 자신이 옳게 읽을 줄 안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중력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이상, 각막에 백반이 낀 듯 편견이 서려 있거나 바다의 표지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눈가리개에 불과한 것으로 눈을 가린 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정확하고 옳게 읽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판단과 판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p.38
등장인물들은 유일무이하고, 존재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읽히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냥 읽는 것과 글의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다르며 깊이도 없고 상상력도 없이 가볍게 낱장만 뒤적거리며 읽는 것은 중력을 무시하는 읽기라고, 중력의 실체를 읽을 줄 알아야 다른 것들도 읽어 낼 수 있다고 실비 제르맹은 이야기한다.
예리하게 읽어내고, 유연하고 섬세한 해석을 할 수 있게 옳게 읽는 것은 너무 어렵다. 등장인물들을 틀에 가두지 않고 유연하게 즐기면서 그들의 인생을 읽어내는 능력이 내게는 얼마나 있을까. 많이 읽고, 잘 읽고, 지속적으로 읽어야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가가 글을 쓰며 자신의 주인공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짜증이 치밀어 오를까?
이런 이상한 자율성을 저자는 환상적인 거지들이라 표현한다.
각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소설가의 상상력과 그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글을 쓰는 행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게 된다.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그려지는 그림들을 언어로 만들어내 종이 위에 써 내려가는 일들이 무척 멋져 보인다.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소설가의 이야기와 덧붙여 이야기하니 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다. 문신의 목표가 몸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화장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 사회정신과 가치관과 금기에 관련된 것들이라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상상력을 동원해 사건을 만들고, 서로를 속이고, 사랑을 하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단어로 퍼즐 맞추듯이 맞춰나가는 소설가의 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작가와 등장인물의 관계는 동등하고 친밀한 것인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자신을 잊어버리고 글을 쓰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글을 쓰기도 하고, 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잊고 헤매다 글을 쓰다 보면 원하던 책이 나오진 못할 터. . . 글을 쓰는 것은 항상 어렵고, 우습고, 고단하고, 행복한 일이다.
쓰고 안 쓰고는 선택이지만 결국 글을 쓰고자 결정했을 때 하얀 종이가 단어들로 채워지는 그 기쁨도 무시할 수 없다.
1984books 출판사의 책을 다 접하진 못했지만 보통 소프트 커버의 매력적인 표지와 가벼운 책으로 보인다. 예쁘장한 컬러와 외모로 쉽게 손에 들고 읽게 만들지만 실상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 역시 이번에도 속았다.
페르소나주,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작가가 얼마나 있을까?
두껍지 않은 책인데 빠르게 읽히지 않으며, 글을 쓰는 소설가와 그들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한다.
한 단어, 한 문장 모두 곱씹어가며 의미를 되새기고 생각하게 만들고, 호로록 읽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처음부터 페이지를 펼치게 만드는 그런 책이다.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닌 생각의 깊이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