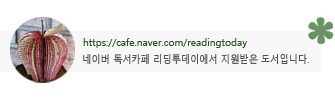-

-
페르소나주
실비 제르맹 지음, 류재화 옮김 / 1984Books / 2022년 3월
평점 :




소설가가 글을 쓰며 자신의 주인공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짜증이 치밀어 오를까?
이런 이상한 자율성을 저자는 환상적인 거지들이라 표현한다.
각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소설가의 상상력과 그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글을 쓰는 행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게 된다.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그려지는 그림들을 언어로 만들어내 종이 위에 써 내려가는 일들이 무척 멋져 보인다.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소설가의 이야기와 덧붙여 이야기하니 또 그런 것 같다.
문신의 목표가 몸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화장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 사회정신과 가치관과 금기에 관련된 것들이라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
소설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청진, 절제, 끊임없이 바꾸는 수선 같은 이런 다소 우스운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희미한 빛으로 감싸 보이지 않게 짜여진 인간의 살가죽 위를 긁어대거나 문신을 새기고 수를 놓으며 이야기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항상 인간의 살가죽 위에 쓴다. 다른 물리적 실현 매체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인간의 살가죽에 대해 쓴다. 소설에서 다른 주제란 없기 때문이다. 실족의 불확실성. 아무리 말해도 다 말해지지 않는 인간의 난해함, 지극히 어려운 사랑, 그럼에도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사랑의 열정. 불가피한 고독. 그토록 다함없는 사랑 끝에 생기는 냉소. 죽음 같은 허무.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84-85
상상력을 동원해 사건을 만들고, 서로를 속이고, 사랑을 하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단어로 퍼즐 맞추듯이 맞춰나가는 소설가의 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작가와 등장인물의 관계는 동등하고 친밀한 것일까?
자신을 잊어버리고 글을 쓰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글을 쓰기도 하고, 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잊고 헤매다 글을 쓰다 보면 원하던 책이 나오진 못할 터. . . 글을 쓰는 것은 항상 어렵고, 우습고, 고단하고, 행복한 일이다.
쓰고 안 쓰고는 선택이지만 결국 글을 쓰고자 결정했을 때 하얀 종이가 단어들로 채워지는 그 기쁨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