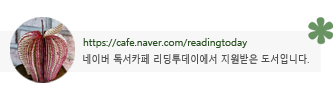-

-
환희의 인간
크리스티앙 보뱅 지음, 이주현 옮김 / 1984Books / 2021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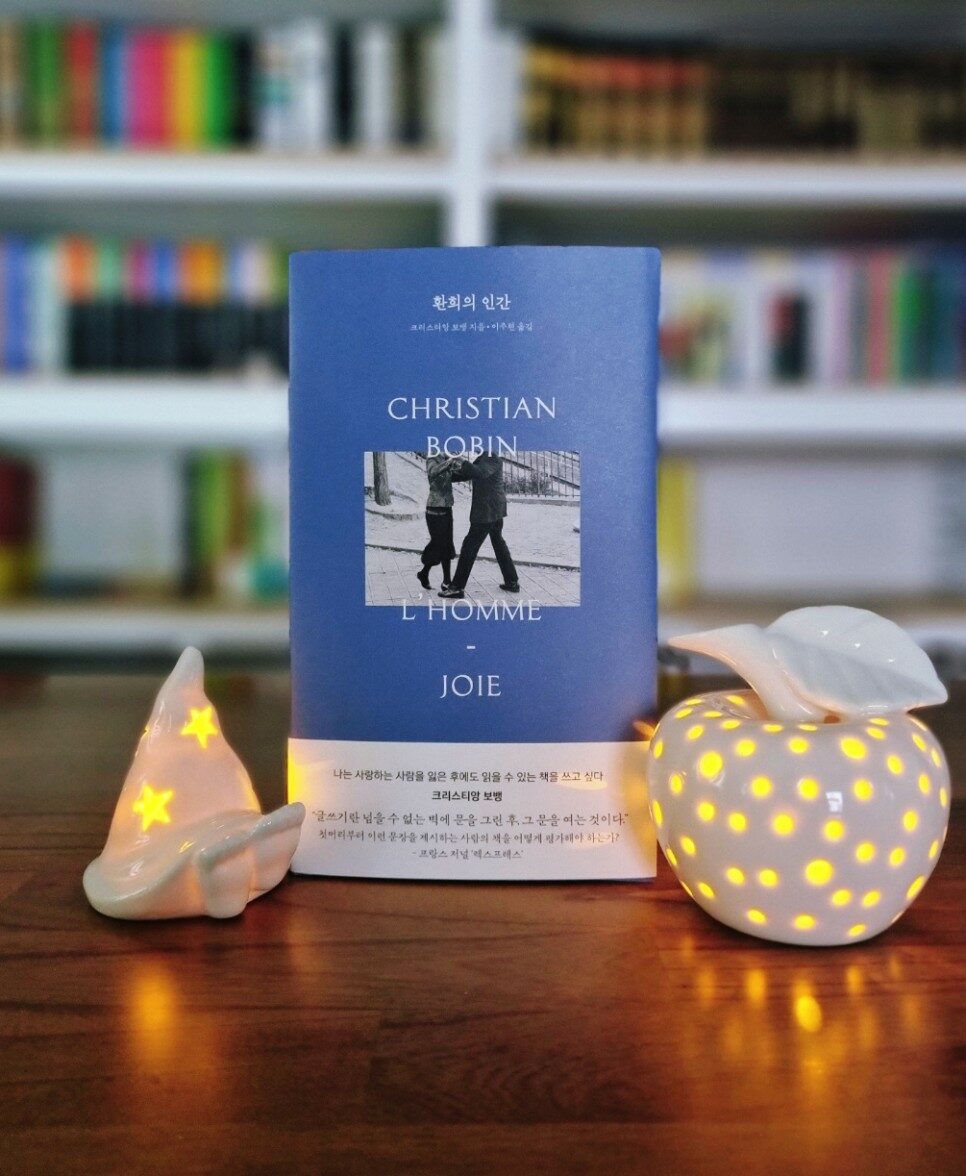
최근에 아들과 함께 [엔칸토]라는 디즈니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가족들이 일군 마을에서 마법을 이어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그들이 사는 집에는 일정 나이가 된 아이들의 문이 생기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신만의 마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다.
"글쓰기란 넘을 수 없는 벽에 문을 그린 후, 그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적혀진 첫 페이지 만으로 크리스티앙 보뱅의 신간이 나왔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세상 이런 작가가 또 있을까? 시작을 이렇게 열어버리면 나는 책을 읽기도 전에 수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 책을 펼치고 이 첫 문장 하나만으로 '아~그래 보뱅의 책이었지'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말이다.
그 문장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무 섬세하고, 상냥하고, 담담한 그의 글들이 나를 반겨준다. 이상하게도 내 이야기를 마구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파란색을 참 좋아하지만 파란색을 우울이나 슬픔으로 연관 지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다. 그냥 청량한 하늘과 같은 색깔이라는 느낌으로 대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보뱅은 다르다. 서문에서 그가 말한 [푸르름만이 가득 담긴 편지]라는 문장 하나로 초록색도 떠오르고 파릇파릇함도 떠오르고 파랑이란 다양한 의미와 감정을 가진 그런 색깔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게 크리스티앙 보뱅이라는 작가가 가진 힘이 아닐까?
서문을 읽었을 뿐인데 뭔가 잘 그려진 그림이나 잘 만든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데다,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사랑이 가득 담긴 글은 역시 감정이 없는 글과는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일상을 마주하는 그의 시선들을 따라가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와 꽃과 식물,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순간들과 그리움이 가득한 편지 등을 16개의 짧은 글들로 엮어놓은 책이 바로 [환희의 인간]이다. 각 이야기마다 그의 생각과 그가 함께 보낸 사람들과 그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글을 읽었을 뿐인데 마치 그 순간에 내가 함께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이야기마다 보뱅만의 섬세하고 담담한 글들이 그가 전하려고 했던 것들을 표현해 내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며 너무 작은 것들이라 쉽게 지나친 것들, 그리고 서투르지만 순수했던 그 시절과, 사랑에 진심이었던 순간과,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모두 쓸모없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내 삶은 왜 타인의 삶처럼 거창하고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하찮게 여겼던 순간이 바보처럼 느껴지게 했다.
하찮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소중하고 모든 삶의 방식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다.
크리스티앙 보뱅은 올해로 일흔 살이 넘었지만 처음 봤던 보뱅의 사진으로 나는 그가 많이 먹어도 40~5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검색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그의 나이에 놀랐던 것 같다. 편견이 있어서인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가게 되면 감정은 메마르고 좀 더 현실적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뱅의 글은 그런 나의 편견을 무참히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뭔가 나도 보뱅 같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 읽을 때마다 들게 만드는 책이었다.
2021년은 크리스티앙 보뱅을 알게 되어 무척 행복한 해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2022년에도 그의 글을 더욱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