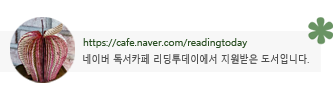-

-
모두 다 예쁜 말들 ㅣ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379
코맥 매카시 지음, 김시현 옮김 / 민음사 / 2021년 6월
평점 :




네 엄마와 나는 맘이 잘 맞지 않았어. 둘 다 말을 좋아하니까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지. 내가 멍청했던 거야.
네 엄마가 아직 어리니 언젠가 생각이 바뀌리라 믿었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했어. 어쩌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도 몰라. p.40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의 고백까지 듣게 된 소년은 자신의 부모가 3주 전에 이혼했다는 것과 엄마가 소중한 목장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들을 줄줄이 알게 된다. 생일선물로 안장을 선물받은 소년은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그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롤린스와 멕시코를 향하던 중 블레빈스를 만나고 국경을 넘어 크고 아름다운 목장에 도착하게 된 존은 정말 그 많은 말들을 모두 길들이려는 것일까?
롤린스와 소몰이 말인 쿼터 호스를 길들이자고 하는 존 그래디는 자신들을 말 조련사라 소개하며 16마리의 말을 나흘 만에 길들이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이 어린 소년들의 무모함을 용기라 할까 무지라 할까?
진지한 게 어른인척하는 소년도 그 소년의 말에 콧방귀 뀌며 농담으로 받아치는 가벼운 소년도 말 조련에 진심이다.
아버지께선 늘 말씀하셨지. 말을 길들이는 건 말을 타기 위해서라고.
따라서 말을 길들일 때는 안장을 얹고 올라탄 다음 꿋꿋하게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고. p.154
블레빈스가 살인자라며 서장은 존 그래디와 롤린스를 공범으로 몰고 간다. 내 말을 내 것이라 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책을 읽다 보면 존 그래디가 무척 어른스럽다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투덜거리지만 롤린스도 존의 의견을 잘 따라주는 걸지 모르겠다.
서장의 답정너 질문들에 답답함이 밀려왔고 존 그래디와 롤린스에게 해주는 충고 같은 조언들을 보며 아니라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불통 이미지와 경험 많은 어른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었다.
풀 그리고 피, 피 그리고 돌. 돌 그리고 단조로이 내리던 비의 첫 번째 빗방울이 만들어 낸 검은 웅덩이.
그는 알레한드라의 완만한 어깨선에서 처음 보았던 슬픔을 생각했다. p.408
존 그래디는 고모할머니로부터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포함한 아주 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뜨거운 사랑 후 알레한드라는 그를 떠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찾게 된 말들과 서장과의 여정, 다양한 어른들과의 만남 그리고 롤린스에게 말을 찾아주기까지 너무 힘든 여행이었다.
과연 그의 여행은 끝이 난 것일까, 아니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일까?
너무나 험난했던 여정인데 존은 고작 열여섯이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읽는 내내 나에게 존은 어리고 안쓰러운 삶을 살아가며 고독한 소년이었다.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
서장도, 감옥 안 거물 페레스도, 목사도, 나이 든 70대 할머니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어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늘어놓는 건지 요즘 말로 딱 꼰데의 모습이었고, 그런 어른들 앞에서도 전혀 당황한 내색 하나 없이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존이 오히려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이 책은 소년의 외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존이 롤린스의 말을 되찾아 준 장면인데 읽다가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이 날 뻔했다.
이제 겨우 열여섯 살인데, 소년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존 그래디에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결국 그렇게 치열한 시간을 보낸 그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한 편의 누아르였고, 가슴 절절한 로맨스가 있었고, 그러한 모든 상황 중에서도 이성을 꼭 붙들고 냉정함을 잃지 않은 것은 존 그래디뿐이었다
단순히 한 소년의 성장소설이라고만 알고 시작한 책인데, 이미 성장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행을 떠날 때부터 성숙했고 여러 종류의 어른들에게도 전혀 기죽지 않았으며 나이만 어렸지 어른보다 나을 때도 있었다.
국경 3부작 중 첫 번째인 [모두 다 예쁜 말들]은 독특하고 가슴이 찌릿하고 다 읽은 후 어떤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꾸욱 누르는 그런 책이다. 옮긴이의 말부터 힐끗거리는 독자들을 김새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번역가의 말대로 나 또한 내 글을 보고 미리 짐작하지 않도록 더 많은 내용과 느낌들은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