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천편일률적인 한국의 주택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제목으로 이보다 더 적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었다. 20평대 방 2개 30평대 방 3개 40평대 방 4개. 여기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고작 20, 30평대에 억지로 방을 하나 더 만들거나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드는 정도. 3베이건 4베이건 그 구조가 숨막혔다. 외국처럼 스튜디오, 원룸, 투룸의 개념이 아니었다.
특히나 다이닝룸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주택 구조에 대한 지적은 정말 공감이 되었다. 40평이상 아니 60평 이상의 집에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주방에서 대강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다이닝 룸없이. 미국에서는 집을 볼 때 다이닝 룸을 가장 중시하고 다이닝 룸이 집의 가장 중앙에 있다. 아무리 평수가 작더라도 말이다. 좀 오래된 집은 주방과 다이닝 룸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오픈 키친이 유행이라 주방과 다이닝 룸이 오픈되어 있고 거기에 넓은 공간을 배정한다. 우리도 최근에 6,8인용 식탁이 유행하면서 주방에 아일랜드를 없애고 긴 식탁을 놓는 것이 유행이라는 데 왜 아일랜드를 유지하면서 다이닝 룸에 공간을 더 배정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1인 가구가 절반을 넘긴 상태이고 2,3인 가구까지 합치면 4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택 구조는 사회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4인가구 기준의 주택 구조에서 변화를 꾀하지 못 하고 있다. 부부가 안방을 공유하고 나머지 두 개의 방에 두 명의 자녀가 각각의 방을 차지하는 구조. 3인 가구도 부부가 침실을 쓰고 한 명의 자녀가 나머지 두 개의 방을 차지하는 구조. 숨막히는 이 쓰임새에 반기를 드는 것이 바로 '침대는 거실에 두는 것'이다. 침대를 거실에 둠으로써 우리는 방 두 개나 세 개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부부라고 하지만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분의 방을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침대를 거실에 두면서 새로 생긴 방 하나를 더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의 갯수를 더 줄이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주택은 방을 너무 많이 만든다. 리빙룸 또는 패밀리 룸의 면적도 줄이고(아. 한국의 거실 사용은 또 얼마나 천편일률인가. 통창을 중심으로 한 쪽 벽에는 티비와 에어컨을 놓고 맞은편에는 소파를 놓는 그 숨막히는 구조. 티비를 없애고 책장을 놓거나 다른 변화를 시도해도 소파를 놓는 위치는 바꾸지 않는 듯하다.) 방의 갯수도 줄이고 방의 면적은 늘리는 것이다. 한국의 주택은 제한된 면적에 방을 많이 만들어야 하므로 방 하나 크기가 너무 적다. 같은 평수에 방을 하나나 두 개만 만들면 공간을 더 의미있게 쓸 수 있다. 다이닝 룸에도 면적을 많이 배정할 수 있다. 방의 사용이 덜 제한적이다. 4베이 구조의 좁은 방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벽을 부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한다. 어차피 자녀 한 명이 쓴다면 방을 터서 공간을 넓게 쓰게 할 수는 없을까.
또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층고를 225cm 정도로만 하고 그 위 바로 20cm 위에 윗집을 놓는다는 대목에서 숨이 막혔다. 사람은 250cm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300cm는 되어야 개방감을 느낀다는데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책에서 보니 창의력도 향상된다고 한다.) 우리는 225cm 층고와 그 20cm 위에 윗집을 이고 앉아서 생활하고 있다. 숨 막힌다. 이런 지적들이 매우 공감이 되었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을 사 놓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하고 아이는 자동으로 학원셔틀을 돌린다는 식의 다소 거친 의견도 나온다. 물론 저자의 주장은 우리가 비싼 집을 사놓고 그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지만 이는 너무 단편적인 시선이다. 돈만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이 언급은 이 책의 주된 논의는 아니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옥의 티 정도이다. 다른 부분들은 하나하나 도움이 되는 각종 팁들까지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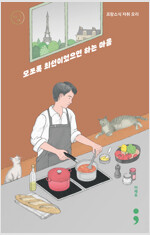
또 하나 재미있게 읽은 실용서 중 하나는 바로 이 책. 프랑스 요리학교를 수석 졸업한 의대 출신 요리사(?), 요리도 전공한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의 프랑스식 자취요리에 대한 이야기. 프랑스 요리도 자취 요리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이 좋다. 요리를 하는 사람은 쉽게 쉽게 한다. 아무리 복잡한 요리라도 공정을 간단히 해서 가볍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물론 이 책에도 '네가 먹은 것을 알려줘라. 그럼 내가 네가 왜 살 쪘는지 말해 줄 수 있다'는 식의,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도 있는 식의 언급도 있지만 이 책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적어도 치즈와 버터는 한국 것을 먹지 말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치즈는 우유맛이 많이 나고 버터는 거의 전부 가공버터로 진짜 버터가 아니다. 유럽산 아니면 적어도 미국산을 먹어야 한다. 스트링 치즈의 경우 눈을 감고 먹어도 한 두번만 씹어도 그것이 한국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 그 맛이 확연히 다르다.
서구의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책은 서구의 문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책이었다. 아주 재미있었다. 책의 크기는 작고 가벼운 종이를 썼지만 정말 유용하고 재미도 놓치지 않는 책들인 것 같다. 발상도 좋고 책표지까지 좋다. 요즘 이런 책이 많이 만들어져 매우 기쁘다. 비록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런 책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동네 서점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