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독자로서 픽션과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도저히 몰입이 되지 않고 작가가 조밀하게 짜 놓은 그 픽션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일단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허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싫어질 텐데. 그러던 차에 우연히 만나게 된 책..

'인터내셔널의 밤'이나 '도시의 시간'으로 접해 봤던 박솔뫼의 작품은..매우 특이하지만 재미는 없고(ㅠ 죄송) 때로는 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다소 지나치게 나아간, 지나치게 전위적인 느낌이었는데 왜 주저없이 이 책을 읽게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뭔가 탁 트인 책 표지 때문이었나. 하지만 결론은 근래 들어 소설을 읽고 느낀 최대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
이 작품은 '내'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 '나'를 시종일관 독자가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지내는 이야기이다. 주로 걷고 글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부산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에 대해 쓰기 위해서 이 글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잘 섞여 나온다.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군데군데 묻어나오는 느낌의 설정이 좋다. 이 사건과 얽힌 집안 이야기, 사촌 언니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등등이 나온다.
코로나로 왕래 자체가 어려워진 지금의 시점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아주 멋져 보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는 과정들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다가왔다. '내'가 서울을 떠나와 낯선 도시로 가서 계획에 없었던 집을 구하고 거기에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직장생활을 하는 설정이 매우 부럽기도 하면서 그래도 완전히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신선한 설정으로 느껴졌다.
'현재란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누군가가 줄기차게 계속 하고 있는 연습의 시간인지 모른다'(사이토 마리코). '원하는 미래를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기 위해 ,그것을 우선 어딘가에 써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박솔뫼). '지금이라는 시간이 미래에도 과거에도 통한다는 것이 참으로 멋지다'(사이토 마리코) '결국, 서로의 마음으로 산책길이 이어진다' 등등의 언급이 마음을 울렸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새로운 유형인 것인가.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며 작가와 함께 서울을, 부산을 산책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뭔가 의식의 흐름의 새로운 버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정지돈이 말하는 '플라뇌르'의 소설 버전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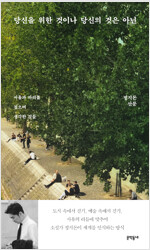
박솔뫼와 함께 기묘한 산책을 떠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