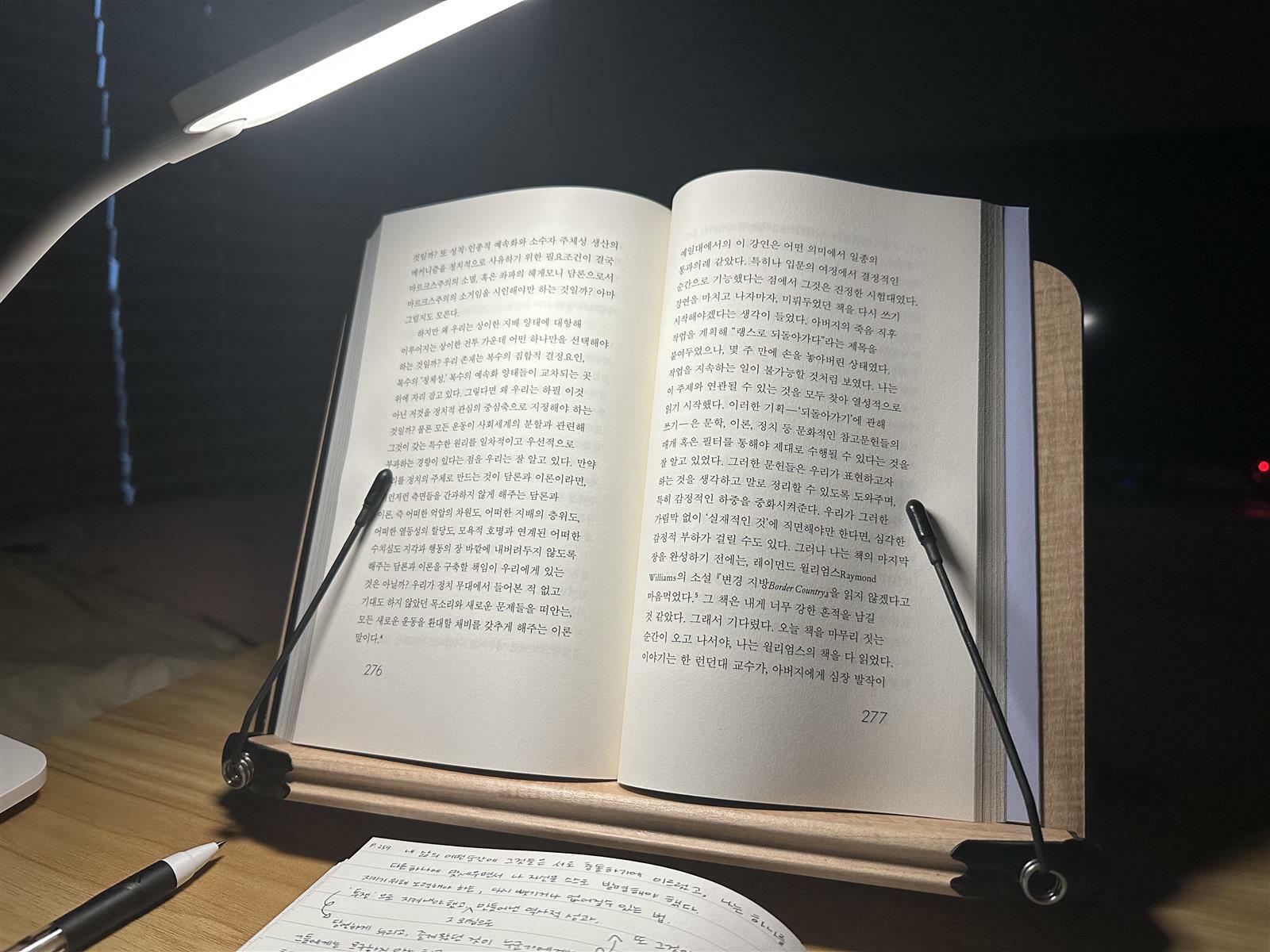-

-
랭스로 되돌아가다
디디에 에리봉 지음, 이상길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21년 1월
평점 : 


계급, 인종차별, 성소수자, 성별 등의 따라 나눠지는 당연하게 누리고 즐겨 온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투쟁’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그리고 결국 그 ‘외침’으로 역사적 성과를 만드는 사회문제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다. 나는 스스로의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분투하며 사는지,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나의 본질을 얼마나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지의 대해서도 궁금해졌다.(나를 구축한 배경속에서 수치스러움에 묻어두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글쎄, 솔직함으로 털어놓는 과정속에서 혹시라도 누군가는 상처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조금 머뭇거릴 것 같다.
(P. 188) 나 자신을 교육 체계로부터 축줄하지 않으려면 - 혹은 축출당하지 않으려면 - 내 가족과 내 세계로부터 나 자신을 축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두 영역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 충돌없이 이 두 세계에 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자신의 운명을 벗어났다는 기쁨에 후회의 자리를 거의 남기지 않았던 디디에 에리봉. 스스로를 이기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글쎄, 나는 그렇게까지 이기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분리’된 삶 속에서 저자의 가족들이 느꼈을 감정은 또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가슴 깊숙한 곳 어딘가에는 자신의 가족들을 품은 채 살지 않았을까? 그는 요구하지 않는 침묵이 당연했던 배경의 삶 속, ’낙인‘ 찍혀버린 자신에게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의 대한 두려움에도 그에 맞서 실천의 원동력으로 삼아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분투한 노력하는 한 사람이었을 뿐. 고백하자면 나란 인간은 나의 ‘재발명’ 자체를 인식하며 살지 못 한 주어진 일상에 굴복하여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러있는 사람이다(물론, 체념에 가까운 받아들임은 아니다).
가족들이 있는 랭스를 떠났지만 자신은 탈출이라 표현했던 그들의 삶을 측은하게 바라보고(계급이 주는 결말은 늘 재생산되는 현실의 씁쓸함이 담긴), 결국 나의 근간이 되어 준 ‘랭스’로 되돌아가 뒤늦게 깨달은 것들을 통해 자기성찰을 하며 수치심을 자긍심으로 바꾼 디디에 에리봉이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운명의 삶 속에서 자식들의 미래를 상상하는 일에 당연한 한계가 있었던 거니까.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생각해보지 못 했던 것을 책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 물론 ‘깨달음’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게 만드는 그 힘은 오롯이 내 자신이 동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 디디에 에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 는 나의 기준으로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기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준, 책이 만들어내는 효용적 가치를 다시금 실감하게 만드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