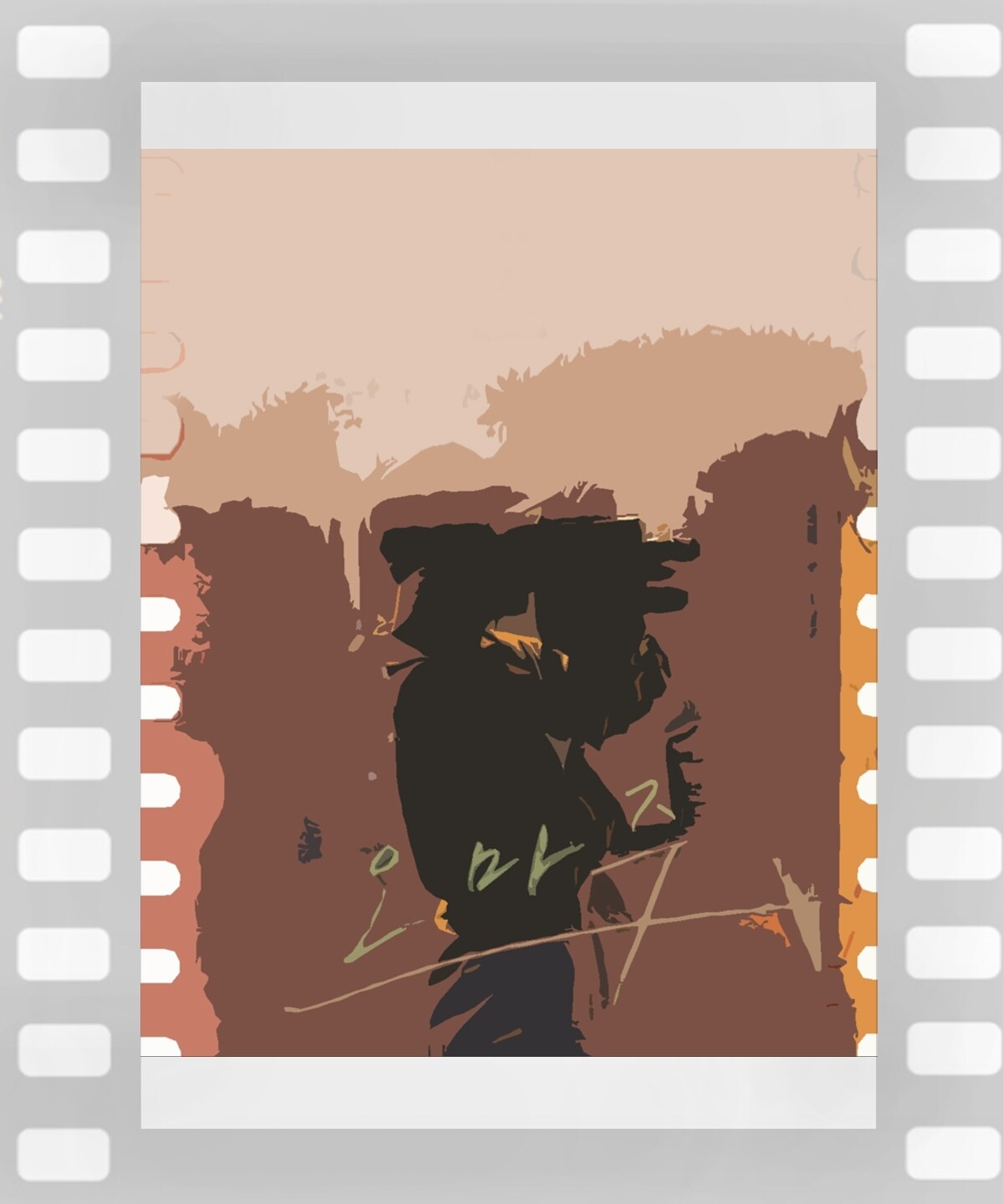
옥희야,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생각나서 편지를 띄운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아니 영화가 뭔지 점점 모르겠어.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나는 환갑이 지나도 영화를 찍을 거라고. 그런데 환갑은커녕 50도 못돼서 나에게는 한 뼘의 공간도 없어진 현장이 되었어.
홍일점 여 감독. 빛 좋은 개살구. 내가 그곳에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가까웠다 사라져간 친구들의 추억 그리고 커피, 담배 같은 중독성 기호.
밤에는 말똥말똥 잠을 잊고 새벽이 되어서는 잠이 드는 습관.
쥐뿔도 없는 주제에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자는 배짱.
참, 또 있지. 세상일이 꿈이나 열정이나 인내심만 가지고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깨달음.
이 편지는 최초의 여성 판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최초의 여성 감독 홍재원(실재 감독의 이름은 홍은원)이 같이 영화를 만들었던 여성 필름 편집담당자인 옥희에게 쓴 편지다.
60년대에 최초로 여성이 영화 판에 뛰어들어 감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수많은 냉대와 편견 속에서도 오직 영화에 미쳐있던 자신의 내부에서 발발하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겁이 났다. 감독은 62년에 ‘여판사’라는 영화를 남기고 떠났다.
시간이 흘러 영화 속 또 다른 여성 감독인 이정은은 독립영화를 만들지만 관객은 열 명도 안 되고, 가정일에도 소홀하게 되고 시나리오 적는 것 또한 힘겹기만 하다. 매일 집 앞 공용주차장에는 승용차가 내내 주차되어 있고 이정은은 사무실까지 비워줘야 하는 상황. 코로나가 겹치면서 독립영화의 관심은 더욱 멀어지고.
그러던 중 오래전 최초의 여성 판사의 이야기를 담은 ‘여판사’라는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중간부터 녹음이 되어 있지 않고 편집이 이상하니까 좀 맡아서 영화를 완성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이정은은 ‘여판사’라는 필름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 당시의 영화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니지만 대부분 죽거나 병들어 있고.
그러던 중 공용주차장에서 매일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된다. 여자의 시체는 그 안에서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모두가 알지 못했다. 이정은은 그 여자의 죽음이 마치 그림자 같았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 여판사를 만든 홍재원 여성 감독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그녀의 삶이, 마치 자신의 삶과 너무나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겹치는 삶이 마치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발견된 그림자 같은 여자와 흡사하다는 것도 느낀다.
이 영화 속에는 ‘현실’과 ‘실재’와 ‘실제’ 그리고 ‘메타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몹시 신기한 영화이면서 잔잔한데 잔잔하지 않은 영화였다.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일은 현실을 말하고, 영화 ‘여판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화이며, 실제 여감독 홍은원의 영화 속 홍재원의 그림자는 메타포어다.
영화 ‘여판사’는 당시에 판사인 인텔리 아내를 둔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자격지심 때문에 독살을 한 실제의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쯤 되면 62년 영화 ‘여판사’도 궁금하다. 그래서 찾아보면 유튜브에 그 영화가 풀 러닝타임으로 있다.
이 영화의 좋은 점은 한 인간은 여러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만만찮은 것이라는 걸, 한 인간이 예술을 접하고 그 세계에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견뎌가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이정은의 덤덤한 연기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영화사의 기록 같은 것들도 덩달아 달려 나오기 때문에 아아하며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홍재원의 편지로 시작하여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내가 잠든 사이에’의 시로 끝맺음을 한다.
뭔가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었다,
어딘가에 숨겨 놓았거나 잃어버린 뭔가를,
침대 밑에서, 계단 아래서,
오래된 주소에서.
무의미한 것들, 터무니없는 것들로 가득 찬 장롱 속을,
상자 속을, 서랍 속을 샅샅이 뒤졌다.
여행 가방 속에서 끄집어냈다,
내가 선택했던 시간들과 여행들을.
주머니를 털어 비워냈다,
시들어 말라버린 편지들과 내게 발송된 것이 아닌 나뭇잎들을.
숨을 헐떡이며 뛰어다녔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들,
불안과 안도 사이를.
눈(雪)의 터널 속에서
망각 속에서 가라 앉아버렸다.
가시덤불 속에서,
추측 속에서 갇혀버렸다.
공기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잔디밭에서 허우적거렸다.
어떻게든 끝장을 내보려고 몸부림쳤다,
구시대의 땅거미가 내려앉기 전에,
막이 내리기 전에, 정적(靜寂)이 찾아오기 전에.
결국 알아내길 포기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는 과연 무얼 찾고 있었는지.
깨어났다,
시계를 본다.
꿈을 꾼 시간은 불과 두 시간 삼십 분 남짓.
이것은 시간에게 강요된 일종의 속임수다,
졸음에 짓눌린 머리들이
시간 앞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부터.